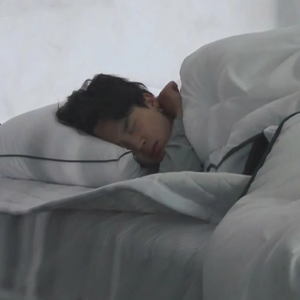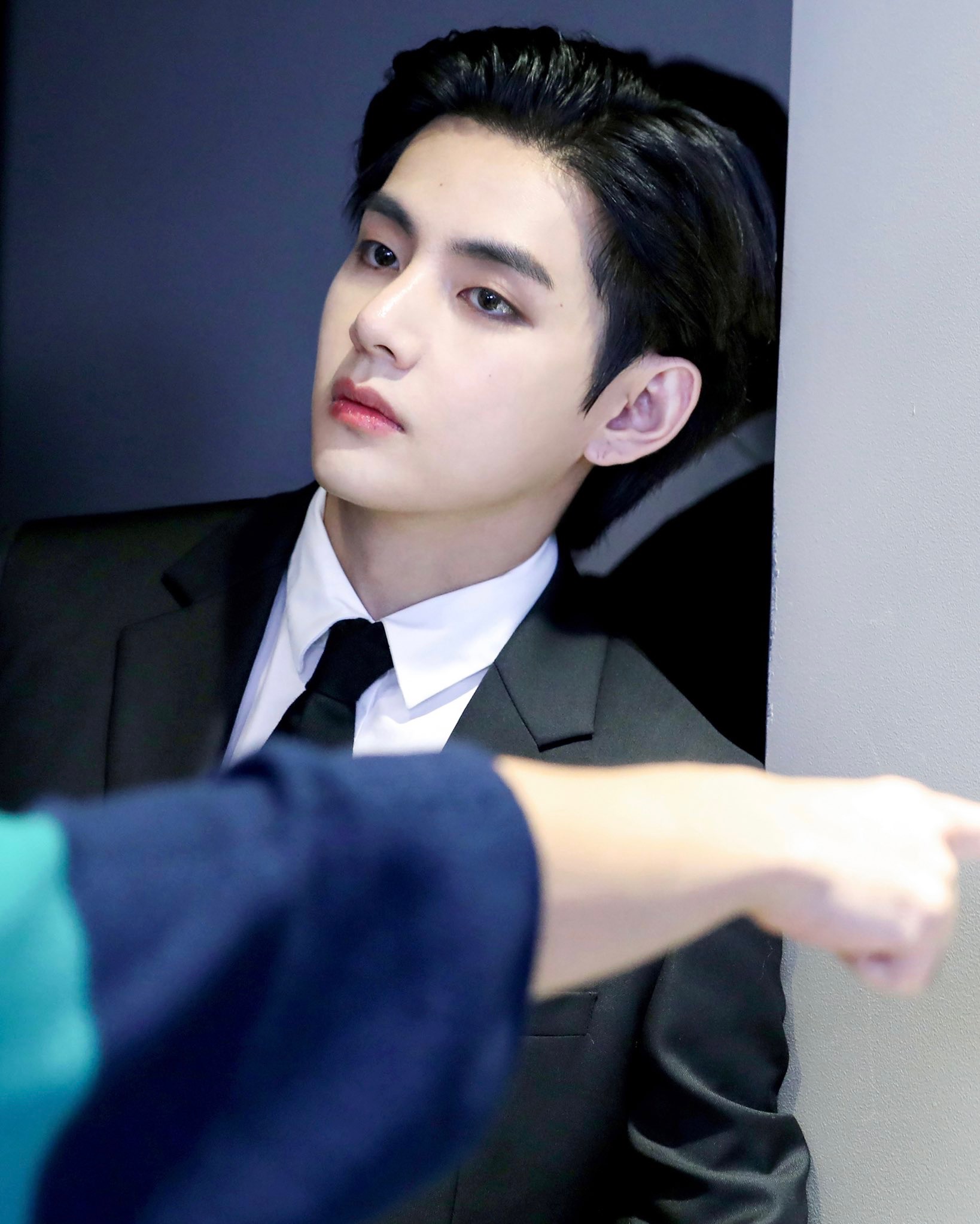
몽글몽글 심리

“너 아까부터 나만 보고 있어. 알아?”
김태형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고, 직장 근처에 있는 한식 정식 집으로 들어왔다. 걸어오는 내내, 은근하게 화가 가시지 않은 듯한 그의 오묘한 표정이 신경에 거슬렸단 말이지.
그래서 티 안 나게 쳐다 봤는데, 그걸 들킨 모양이다. 하긴, 티 안 났다기엔 너무 적나라하게 보긴 했다.
“…큼. 뭐 먹을래?”
“나는 이거. 제일 비싸네.”
“…하여튼. 아주 김태형답다.”
어쩌라는 듯한 표정의 김태형. 이내 직원을 불러 우리가 고른 메뉴를 똑같이 읊었다. 재차 메뉴를 확인한 직원은 알겠다며, 주문서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둔 후 주방으로 향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앞에 수저부터 놓아주는 김태형. 왼손을 다쳐서 못 쓰니까, 친히 자기가 내 오른손까지 물티슈로 닦아준다. 할 거 다 해주고 은근 아닌 척 생색내는 말투가 왜 이리 웃긴지. 너 아프니까 해준다. 내가.
“…있잖아.”
“응.”
“…혹시, 아직까지 화난 건 아니지?”
제 손을 티슈로 닦던 태형은 행동을 멈추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아무 말 없이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물티슈를 가장자리에 내버려두고 입을 여는 거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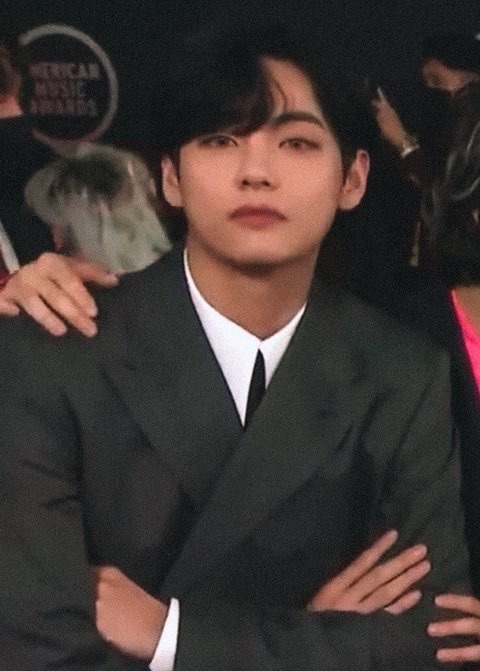
“…난 아직 분해 죽겠는데.”
그 자식이 너한테 하던 짓이 눈앞에 생생해. 경찰이 붙잡아가기 전에 아예 숨을 끊기 직전까지 짓눌렀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얘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섬뜩하기 짝이 없었다. 아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사람 하나 죽이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진짜 나 죽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
“…네가 말했잖아. 죽을 줄 알았다고.”
“그건 내가 한 말이고. 너는 어땠는지.”
“….”
무서웠구나? 무서웠지? 갑자기 말이 없어지길래, 일부러 말에 장난기 섞어서 재차 물었다. 나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태형이? 아니나 다를까 내 장난 받아치려고 시동 거는 그. 은근슬쩍 고개를 앞으로 내밀더니 이내 턱을 괴고서 날 바라봤다.

“설여주 걱정했지.”
분명 농담 섞어서 꺼낸 말일 텐데. 이런 말에 이상하게… 가슴 한 켠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친구니까 걱정되는 감정이라면 당연한 거지. 안 그래?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뭔가 이상해. 이별한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은… 안되는 거잖아. 더군다나 그 상대가 얘라면… 이건 미친 거야.
그 말 한 마디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얘는 이런 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알긴 할까. 뭐해, 안 먹고. 그때 마침 나온 음식에, 내가 뒤늦게 수저를 들었다. 아, 먹어야지. 너도 먹어.
“움 여기 반찬 괜찮탕~”
“맛있어?”
“와 진짜… 반찬 먹으러 와야겠다.”
“ㅋㅋㅋ 많이 먹어.”
“… ㅡㅡ 네가 밥 사는 사람 같다?”
-🤍-

“수고했어.”
점심 식사 후에, 나와 태형은 다시금 직장으로 향했다. 일하는 부서가 달라서 한동안 얼굴 못 본 채 떨어져 있다가, 어느덧 해 지는 퇴근 시간 다 됐지 뭐야. 서둘러 가방 챙겨 1층으로 내려가보니까 차 몰고 건물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형이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설여주 씨?
“그냥, 집 앞에 가까운 거기 가자.”
“오케이. 바로 출발할게.”
“넹.”
저녁으로 뭐 먹을지는 정했어? 물으니까 생각해둔 게 있다는 김태형. 뭐냐고 물으니까 그건 또 비밀이래. 나한테 또 무슨 대단한 식사를 대접해주려고 이렇게까지 감춰, 궁금하게. 그때 마침 차 안을 울리는 벨소리. 핸드폰을 블루투스 연결시켜둔 모양인지, 네비게이션 화면에 뜨는 발신자 이름은 ‘김강훈 형사’. 일 전화인 것 같길래 그냥 받으라고 손짓했다. 네, 김태형입니다.
“네. 김강훈입니다. 잠깐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면담 취소된 사람 말입니다.”
가만 들어 보니, 상담 예정이었던 전과자 둘 중 취소된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인 듯 했다. 태형은 형사님의 말이 떨어지자 내게로 잠깐 시선을 옮기더니, 이내 블루투스를 끊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마침 신호는 빨간 불. 어깨와 턱 사이에 끼웠던 핸드폰을 다시 손에 쥐고 귀에 가져다 대는 그였다.
어째 갈수록 목소리도 가라앉고, 표정도 꽤나 심각해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겠거니 지레짐작은 가능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하긴 한데 우선은 김태형이 통화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니 그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내다봤다. 그렇게 몇 분이 더 흘렀을까. 종료된 통화.
“왜, 무슨 일이야?”
“별 일 아니야. 그냥 일 관련해서.”
“별 일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싶어 이쯤에서 관심을 거두기로 했다. 괜히 축 쳐진 것만 같은 분위기에, 안 되겠다 싶어 화제를 돌렸다. 너는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내가 말하고도 정말 뜬금없긴 했다.

“꼭 있기를 바라는 눈치네.”
“에이,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여자랑 동거하는 남자를 어느 여자가 데려가겠어. 일침을 날리는 태형이었다. 하긴, 나 같아도 그런 남자는 못 만나지. 그럼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지금 얘 앞길을 막고 있는 건가 혹시…? 이참에 그냥 각자 따로 살아야 하나.
“…그럼 우리 따로 살까?”
“…갑자기?”
“아니 그냥 뭐, 괜히 너 신경 쓰이게 하잖아 내가.”
묘하게 태형의 표정이 얼었다. 짜식, 쫄기는. 장난삼아 해본 말인데. 우리가 같이 보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한순간에 내가 집을 나가겠어. (물론 나도 이제 너 없는 집은 상상하기도 힘드니까.)
“농담, 농담.”
“….”
“그냥 이참에,”
동거하는 여자가 너 확 데려가?
얼마나 편해. 다른 여자한테 오해 살 일 전혀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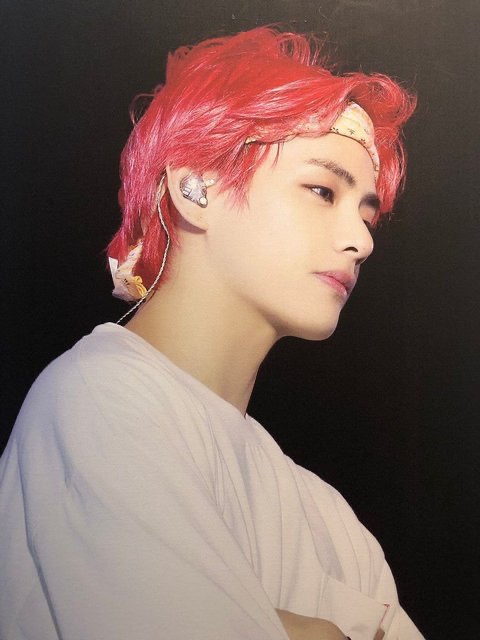
“…얘 또 사람 착각하게 하네.”
직진녀 설여주.
거기에 또 반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