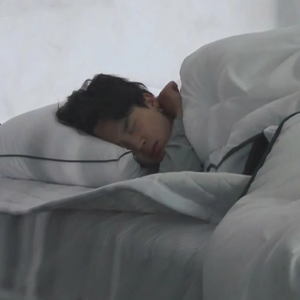몽글몽글 심리
집 앞에 자주 들르던 대형마트에 도착한 김태형과 나. 차에서 내려 카트를 끌고 식품 매장인 지하 1층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탔다. 물론 카트를 끄는 건 그의 몫. 자연스레 손잡이에 제 팔을 기대어 몸의 무게를 실은 그가 날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세상 근엄한 표정으로 세상 아무 것도 아닌 말을 하길래, 순간 흠칫했다. 나 혼나는 줄.
“김치찌개 해줄까?”
“응.”
“너 매운 거 못 먹으면서.”
“그냥. 갑자기 먹고 싶네.”
일단 오케이. 김치는 집에 있으니까 고기부터 사자. 죽이 척척 잘도 맞는 우리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말 안 해도 다 통해:)
“국물용으로는 이게 더 낫겠다.”
그 후로도 자기가 알아서 꼼꼼하게 선별하고 카트에 넣는 김태형에, 내 할 일이 반으로 줄어들었지 뭐야. 카트 끄는 것도, 식재료 고르는 것도, 알뜰하게 가격 계산하는 것도… 이정도면 내가 뭣 모르고 끌려온 수준.
전반적인 김치찌개 재료들을 다 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먹고 싶은 간식거리들까지. 원래 이곳에 온 목적이었던 술도 카트 안으로 직행.
“너무 많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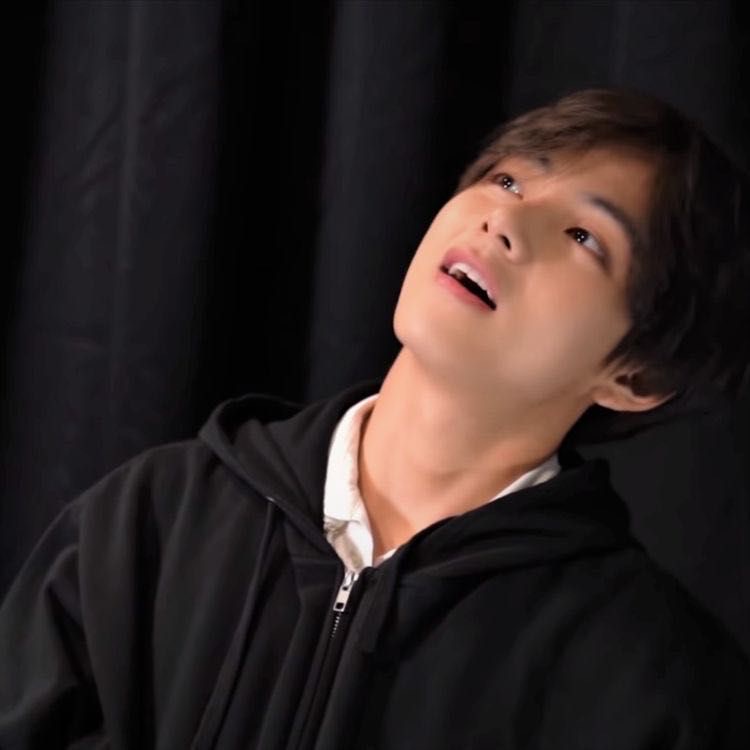
“뭐래. 이 정도는 일주일 컷.”
으유 이 술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금 카트 안을 살피고 있었을까. 이내 잊고 있던 게 떠올라 아! 하고 소리쳤다. 내 사랑 팽이버섯. 김치찌개 할 때 꼭 넣어먹는 버섯인데, 어쩐지 허전하더라.
“여기 있어. 내가 가지고 올게.”
“같이 가도 되는데.”
“아냐아냐. 계산대 가 있어, 빨리 갔다 올게.”
당부의 말을 끝으로 재빨리 채소 코너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깨 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방 끈에, 그냥 가방을 품에 안고 종종걸음으로 서둘렀다. 마침내 채소가 보이면, 길게 늘어진 진열대에서 팽이버섯 찾기에 돌입.
눈대중으로 신선해 보이는 녀석 하나 들어서 가방과 같이 품에 안았다. 살 거 더 없나~ 생각하며 눈길을 돌리려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먹고 싶어, 오빠가 다 해줄게.
설마. 라고 생각했다. 그 잠깐의 순간동안 ‘설마’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여러 번 울렸다. 그리고 그 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천천히 뒤를 돌았다. 아니길 바라면서도,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화 풀어요- 여진아 내가 미ㅇ…”
저 멀리 건너편 진열대에서 다른 여자의 옆에서 그녀를 향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네가 보였다. 그리곤 머지 않아 나와 눈이 마주치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너의 모습. 애써 무덤덤한 척하려 하는 듯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무척이나 당황했다는 게. 그래, 그런 반응이어야지. 너는 나를 신경 써야지.
아무 말 않고 멀찍이 서서 네가 뭐라도 할 때까지 바라만 봤다.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네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아서 이별했지만, 그 사실을 직면하니까 또… 서럽기는 서럽더라.
더 기가 차는 건, 그런 네가 내게 걸어온다는 것. 옆의 여자에게는 뭐라 말하고 어디론가 그녀를 보내더니, 이내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네겐 내가 우스운 존재이라는 게 안 봐도 뻔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당당한 모습으로, 당당한 표정으로,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순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뭐라 말도 못하고 그저 그가 내게 다가오는 것만 경멸에 가득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마침내 그토록 원망스럽던 사람의 모습이 내 시야 안에 들어찼을 때, 다시금 까만 무언가에 의해 가려지는 그였음을.
뒤이어 바들바들 떨리던 내 손이 온기에 감싸졌다. 뒤늦게 그 온기의 주인이 누군가의 손이었음을 알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면, 나의 시야에 가득찬 건 익숙한 이의 등. 낯익은 재질의 자켓…… 김태형이었다. 왜인지 모를 안도감에 그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좀,”

“니가 얘랑 뭔 말을 더 해.”
전정국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김태형 뒤에서 손만 꼭 맞붙잡고서 바닥만 응시하고 있을 뿐.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아서, 도무지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다. 단지 이곳에 1분이라도 더 머문다는 자체가 싫어, 태형의 옷깃을 잡고 살짝 흔들기를 반복했다. 이만 가자고.
아니나 다를까, 내 뜻을 알아주기라도 했는지 이내 뒤돌더니 날 응시하는 김태형. 보지 말라며 자연스레 내 양어깨를 붙잡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였다.
-🤍-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집. 무거운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에 내려놓은 우리는 우선 씻고 오기로 했다. 차에서 돌아오는 내내 마트에서의 일은 없던 일처럼 여기려 분위기 살벌한 김태형한테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늘어놓아서 그런지 목이 살짝 아파오는 것 같기도.
“…빨리 씻고, 나와!”
어감이 묘하긴 한데 의미는 말 그대로다. 빨리 밥 차려 먹어야 하니까. 벌써 밥 때를 지나는 시간이라.
내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인 그는 잠옷을 챙겨 방 안에 있는 욕실로 들어갔다.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괜히 머쓱해서 멀뚱멀뚱 서있는 중. 아까 마트에서 그 애를 만났을 때… 얘가 갑자기 나타났었지. 그러고 보면 홍길동이 따로 없는 김태형. 은연 중에 내가 널 찾으면, 어느 순간 넌 내 앞에 있곤 했다.
동시에 드는 여러 생각에, 난 씻으러 가기 전에 재료부터 먼저 꺼내두기로 했다. 생각도 정리할 겸, 날도 추우니까 씻기 귀찮아지기도 하고(ㅎ). 냉장고에 있던 저번에 쓰고 남은 두부도 꺼내고… 하다가 오늘 사온 술도 차곡차곡 넣어뒀다. 그러다, 그 유혹에 못 이겨 그만… 캔 하나 땄다.
치익- 소리 최대한 안 나게 따서 한 모금 삼켰다. 어우, 아까 일을 맨정신으로 회상하기에는 무리였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유난히 맥주가 당기는 하루였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생각만 하다가…

“뭐야. 치사하게 혼자 마시냐.”
속절 없이 얘한테 빼앗긴 내 캔맥주. 그대로 그의 아랫입술에 닿는 걸 지켜보고만 있다, 정신 차리고서 이제 씻으러 가야겠다 싶었다. 옆에서 나 보고 있던 김태형은 여태 안 씻고 혼술이나 했냐면서 잔소리 남발.
그 와중에 눈에 띈, 머리도 안 말리고 나왔는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물. 나 역시 이때다 싶어 트집 하나 잡아 뭐라 했다. 넌 말이야, 머리 물도 안 털고 나오냐 응? 근데 얜 내 말 하나도 안 들음. 그저 내 등 떠미느라 바쁠 뿐.
“빨리 가라-“
“으응~ 그러면 너 저 두부랑-“
“알았어. 내가 알아서 다 해.”
“그니까, 버섯이랑 그 냉장고에 김치도 썰어서…”
“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