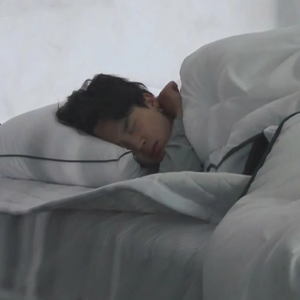몽글몽글 심리
”잘 먹겠습니다~“
이제 그냥 요리사 다 됐어 김태형~ 사실 내가 해주기로 했는데 씻고 와보니까 뚝딱뚝딱 얘가 다 해둔 상태. 고마우니까 칭찬 한 번 해주고 찌개 한 숟갈 떴다. 입 안에 넣자마자… 와 이건 술안주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냉장고행. 냅다 캔맥 두 개 품에 소중히 안고 자리에 앉으니까 김태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어. 그리곤 한 마디 거든다. 언제는 나보고 술꾼이라면서요~?
“김태형이라는 술꾼이랑 같이 살잖아요 저는~”
“아 그러세요~”
은근슬쩍 요녀석이 맥주 하나 가져가려고 하길래 냅다 디펜스. 네가 가져와 둘 다 내 거당~. 헛웃음 지은 김태형은 알겠다고 치사해서 안 마신다고 구시렁거리며 냉장고로 향했다. 뒤통수부터 삐졌네 삐졌어. 국물 한 숟갈, 맥주 한 모금. 전정국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게 해주는 마법의 식사다.
“우리 내일은 뭐 먹어?“
”뭐 먹고 싶은데.“
”오뎅탕?”
“술안주네 그것도.”
웅. 아 그냥 며칠동안 몰아서 확 마시고 다 잊을래. 역시 사람은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 해. 왜인지 모르게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중이더라.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술의 알싸한 목넘김이 좋아서?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잡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어느정도 흘렀을까. 찌개 냄비는 바닥을 보이고, 내 배 역시 불러올 때즈음 정신 차리고 보니 찌그러진 맥주캔이 대여섯 개 정도. 하 이걸 지금 치우려니 정신이 알딸딸하고… 안 치우자니 찝찝해서 잠을 못 잘 것 같고.
“그냥 내일 치울까?”
“내가 치울게. 먼저 들어가서 자.”
“그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하는 수 없이 김태형 옆에서 같이 치우기로 했다. 설거지는 김태형이, 그릇 옮기고 캔 버리는 건 내가. 우리집이 이렇게 깨끗한 채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김태형 덕분이다. 나 혼자 자취했으면, 진작에 발 디딜 틈 없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야.
각자 2캔 정도 마셔서 약간은 헤롱하지만 사리분별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다. 내일 출근하니까 나름 양조절을 한 거지. 생각보다 설거지가 오래 걸리길래 싱크대 옆에 걸터앉아 끝나기를 기다렸다. 가서 자라고 재촉해대는 김태형을 뒤로 하고 부엌 쪽에 난 창문을 열었다. 밤의 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시원했다.
“감기 걸려.”
“나 면역력 강해서 괜찮아~”
찬 공기가 좋았다. 스읍~ 후우~ 계속해서 깊은 호흡을 반복하던 참에, 드디어 끝난 설거지. 고무장갑을 벗은 김태형이 손을 씻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자러 가자.
“나 데려다줘.”
“바로 코 앞이 방인데.”
“업어줘.”
솔직히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던 참이었다. 알딸딸한 정신 상태.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다. 종종 업어주곤 했으니까.
그리고 내 방 침대에 안착했을 때, 그는 손수 이불도 덮어주고 베개도 머리맡에 놓아주고 전등까지 꺼주었다. 전정국이 잠깐 스쳤다. 손길 하나하나가 닮아있었다. 왜 그렇지. 전정국의 행동이랑 네 행동이 똑같아. 그래도 돼? 눈이 천천히 감길 때즈음,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 김태형의 실루엣이 보였다. 궁금해졌다. 네 마음이 뭔지. 잠결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태형.
“나 좋아해?”
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흐릿했다. 날 향해 돌아보는 것 같기는 했다. 이제 거의 눈이 잠겼다. 잠에 들기 직전, 나는 대답을 들었다.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리고 이 방의 공기를 통해 내 귓가에 닿았다.
“응.”
-🤍-
다음날 아침. 시리얼만 쫍쫍.. 먹고 있다. 우유에 오래 잠겨있던 시리얼은 눅눅해졌고. 비 오는 날씨라 공기도 눅눅하다. 맞은 편에 앉아서 전화하며 시리얼 먹고 있는 김태형이 신경쓰였다. 어제 한 말은 그냥 농담이겠지? 하긴 말도 안 되지. 암암 그렇고 말고.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를 반복했다. 그러다보니 시리얼을 다 건져먹은 상태. 시리얼의 설탕이 녹아든 달짝지근한 우유를 그릇째 드링킹하려던 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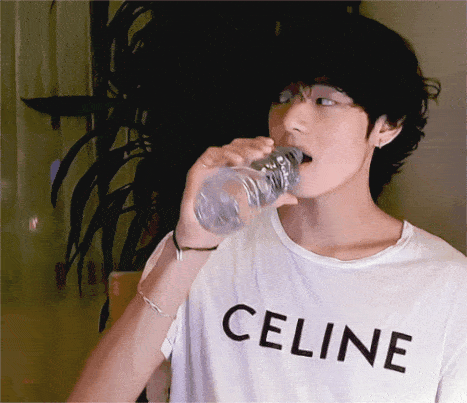
“좋아한다니까.”
푸학. 그대로 마시던 우유 전방에 발사. 좋… 이라는 단어만 들었는데 혼자서 난리다. 전화하고 있던 김태형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태연하게 휴지 몇 장을 뽑아 식탁을 닦기 시작한다. 입모양으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잔기침을 하고 있었을까, 자기 쪽으로 오라는 듯한 김태형의 손짓에 상체를 맞은 편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자기 옷소매로 내 입가를 닦아준다.
“나 아무거나 잘 먹어서 괜찮아.”
“…”
“날 것도 좋고 뭐.”
친구랑 식사 메뉴를 고르는 모양이었다. 통화는 하면서 시선은 나에게 향한 상태로. 하… 설여주 뭐하냐 진짜. 혼자 의미부여하고 난리도 아니다. 어제 그 말만 안 들었더라면 김태형의 다정한 이 행동에 아무런 생각 안 들었을텐데. 너는 왜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전 애인과 헤어진지 겨우 3일.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