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혹시 조금 그래요? 나는 다른 내 집에 갈건데.”
‘다른 내 집? 집이 또 있는건가? 뭐야, 이 사람.. 돈이 많은가···. 그래 집도 따로인데, 그럼 그냥 잠깐은 지내도 되겠지!’
“그럼, 좋아요···!”
그 남자는 터널 밖으로 나가자는 손짓을 하고서는 터벅터벅 터널 밖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밝아지자 눈이 부신 나는 눈을 살짝 가리고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 남자는 보조개가 있었고, 웃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게 매력이다. 아, 맞다. 집도 빌려주시는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
“그.. 혹시 이름이 뭐에요?”
그 남자는 후드티 모자를 쑥 내린 후 머리를 몇 번 정리 하더니, 터널 안에서 처럼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춘 후에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

“임세준이고 스물 다섯 살이에요-. 그럼 그쪽은?”
“앗···, 저는 김여주이고! 스물 두 살이에요.”
“그렇구나-, 오빠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쵸?”
“하하···. 그런가요?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
그 남자 아니, 세준 씨는 당황했는지 오른쪽 손으로 뒷머리를 정리하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르켰다. 나는 그 손가락을 눈으로 따라가 보았다. 세준 씨가 가르킨 것은 동그랗고 밝게 뜬 달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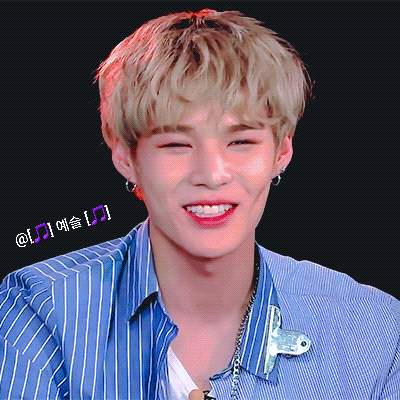
“달 예쁘죠, 저도 나중엔 달이나 사려고요-.”
“달을 사요···?”
“아하-, 몰랐구나! 그쵸. 달도 살 수 있다니, 신기하죠?”
“뭐, 그저 그런데요?”
“은근 차가우시네요-. 하하..”
“아, 죄송해요.. 원래 처음 만난 사람 잘 안 믿어요. 오래 본 사람들도 안 믿는데요, 뭐.. ㅎ”
이 남자는 뭐랄까 나를 조금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하긴, 나였어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저런 눈빛을 싫어하고 동정하는 사람을 안 좋아 하기에 한 마디를 해야 겠다고 결심했다.
“미안한데, 동정심이면 잘 해주지 마요. 돈도 많은 사람이···.”
“동정심이요? 동정심 아닌데.”
“그럼 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날 집으로 데려다 줘요?”
•
•
•

“음···. 그냥 첫눈에 반했달까요? 그럼 가능하잖아요. 그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