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의 나락이
곧 나의 낙원
일 것이니
01| 중전 이여주
눈이 소복이 마당을 덮고 뒷마당에 있는 연못도 얼어갈 때쯤의 그런 겨울에 사단은 일어났다. 온종일 집이 시끄러웠고 마을에는 소문을 전하는 입들이 바쁘게 돌아갔으며 희게만 깔려있던 뒷마당의 눈들은 사람들이 오가며 남긴 발자국으로 더럽혀졌다. 그리고 정작 그 당사자는 무표정을 일관하며 단 한 마디의 밀도 내뱉지 않은 채 홀로 슬픔에 잠겨있었다.
"그럼요, 과연 여주가 아님 누가 그 자리에 오르겠냔 말입니다! 허허, 아니지 이젠 중전마마라 불러야 하나요?"
"중전은 무슨, 아직 혼인도 치르지 않았소."
"부끄러워하시기는, 곧 있음 입꼬리가 하늘을 찌르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주의 귀에 꽂힐 때마다 그녀는 두 귀를 틀어막으며 웅크린 다리에 머리를 박았다. 어쩌다 이 처지가 된 건지 그녀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었다. 그리도 영특하던 머리는 항상 이럴 때만 돌아가지 않는듯했다.
"선왕께서 그리되시고 넋이 나가 있는 줄만 알았는데, 연심에 대한 머리는 계속 굴러가고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이! 남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신기해서 그럽니다, 신기해서.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바로 한 일이 중전 공표라니. 내명부가 가만히 있을 정도면 당최 얼마나 사랑 앓이를 하신 건지."
같지도 않은 소리가 계속 그녀의 신경을 거슬렸다. 웅크리고 있는 몸도 시간이 지나니 마디가 쑤시고 걸렸다. 결국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의자에 앉아 계획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아갈 길이 없다면 벽을 뚫어서라도 도망칠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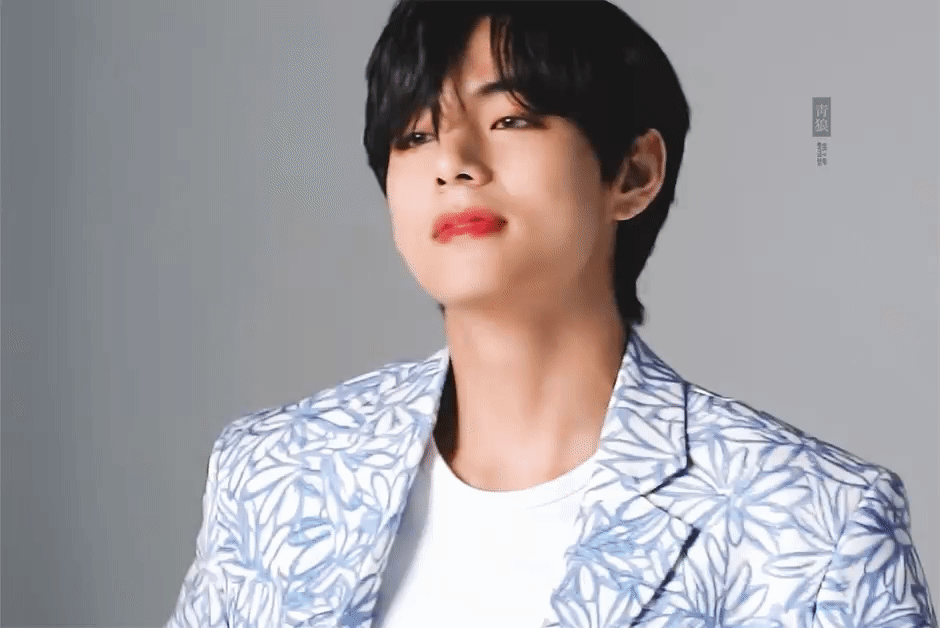
"설마 했는데, 역시 제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으십니다."
빠르게 움직이던 손이 태형의 큰 손으로 덮어져 꼼짝없이 멈춰지고 말았다. 태형은 여주의 손을 쥔 채로 그녀를 도발하듯 상채를 그녀에게로 기울였다. 태형의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여주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리 골을 써서 탈출 계획을 짜실 만큼 저와의 혼인을 경멸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꽤나 서운한데요."
"
"참, 제가 이리 밤중에 찾아온 연유를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저는 그저 제 반려가 될 분이 궁금해서 담을 넘은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그 응어리가 풀리는 것입니까."

"응어리라니요. 설마 제가 이리 어여쁜 색시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그날따라 태형이 자신에게 쓰는 그 반어적인 표현이 거슬렸던 여주는 자신을 감싸는 그의 손들을 내팽개친 채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지닌 듯했다.
"비겁한 수를 써서라도 저를 이겨먹고 싶으신 거겠지요."
"답지 않게 말이 빠르게 나오는 걸 보니 제 수가 꽤나 충격적이긴 했나 봅니다."
"그럼 저도 수 하나 써보겠습니다."
"글쎄요."
"폐하께서 왕좌에 오르신 후 원나라에서 요구하는 공녀의 수가 늘어났다 들었습니다."
"설마 저와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 공녀까지 되시겠단 말씀입니까. 과연 그대답네요."
"양반집의 규수라면 그쪽에서 마다할 리도 없겠지요. 또한 공녀 수출은 내명부가 담당한다 하였으니 폐하의 권한도 아닐 테고요."
"과연 내명부에선 그대를 보내줄까요. 왕의 여인으로 낙인찍힌 그대를, 감히 왕의 얼굴에 먹칠하려는 이가 아니면 누가 그대의 뜻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리 그녀가 머리를 굴려봤자 그의 권력 앞에서는 손쉽게 무너져 내렸다. 발버둥 치듯이 아무리 머리를 돌려보아도 마땅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 인생에 있어 맛본 최대의 패배였다.
"이리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온전히 그 패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그녀에겐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니 제 앞에서 승자의 미소를 띠며 자신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내려다보는 태형이 한없이 걸리적거렸겠지. 그의 손을 잡고 그녀가 그를 내보내려 할 때쯤, 가까이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요. 누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다급해졌지만 태형은 오히려 미소를 띤 채 제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세게 쥐었다. 대충 그가 무엇을 할 건지 눈치챈 여주는 기겁을 하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이미 발걸음이 멈추고 방 문 앞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가씨, 접니다. 세욕 준비를 끝 맞혀서요. 들어가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나의 중전."
"읍-"
문이 열리기 직전 귓가에 속삭이는 태형의 말을 끝으로 그는 여주에게 바로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까지도 여주는 빠져나오려고 손을 틀었지만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단단하게 쥐고 있는 태형 때문에 그저 몸만 부들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몸종은 갑작스럽게 봐버린 왕과 아가씨의 애정행각에 놀라며 급하게 문을 닫았고 소문이 어찌 퍼져나갈지는 안 봐도 훤했다. 늦은 밤, 여주는 무너지는 자신의 성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