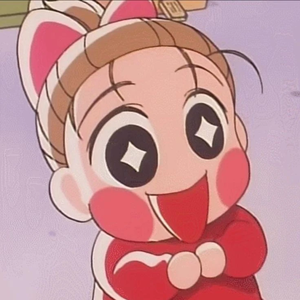W. 르셸
폐가 잔뜩 부풀어 올라 갈비뼈를 진득하게 누를 만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몸은 11월의 찬 공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입 안에 맴도는 비릿한 쇠맛이 그 증거였다.
폐가 잔뜩 부풀어 올라 갈비뼈를 진득하게 누를 만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몸은 11월의 찬 공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입 안에 맴도는 비릿한 쇠맛이 그 증거였다.
덜컹, 덜컹
내가 자세를 한 번 고쳐잡을 때마다 손목을 옥죄고 있는 닳고 낡은 수갑이 소름끼치는 소음을 내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누군가 내게 물어봐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다‘라고 대답해 줄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아, 그래.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죽음은 내게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고 나는, ‘죽음 그 자체’였다.
눈을 느리게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여전히 앞이 흐렸다. 그가 내 시야를 차단하는 의식을 치뤘기 때문이었다. 다만 며칠전의 밤과 달라진 것은 존재했다. 눈이 아주 쓰라렸고, 암흑 같던 나의 세상에도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저 들리는 소리에만 의지할 뿐이었는데, 이 방에 안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나와 얽힌 쇠사슬, 수갑 그리고 시계 뿐이었다. 숨소리 같은 건 잊은 지 오래였다.
12시임을 알리는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언제일까.
지금?
아니, 아직 아니다.
내가 잊어버린 숨소리 대신 목을 긁는 웃음이 불쑥 튀어나왔다.
지금. 지금이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삼켜내며 당장이라도 문을 도려낼 듯 노려보았다. 곧 문에 기척이 느껴지며 세게 젖혀졌다. 새어나오는 빛에 눈이 아렸지만 더욱 더 눈에 힘을 주었다.
“···의미 없는 짓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깨닫자 마자 이를 아득 물었다. 쯧, 감이 다 죽었네. 기다리던 그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아도 저게 나의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갑에 쓸린 손목의 상처일 게 분명했다. 밤새 내가 창살을 쳐댄 탓이었다.
“왜 너야.”
“오전 식사를 거부하셨으니깐요.”
쾅-,
“이게 정말 의미없는 짓처럼 보여?”
깔깔 웃으며 수갑으로 창살을 세게 내리쳤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궁금하면 직접 오라고 해. 듣고 있지?”
음. 눈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건 하나였다. 저거 표정을 못보니 말이야.
“···. 식사 먼저 하시면 생각해보시겠답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작게 입꼬리를 당겼다. 나를 자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런 소리를 넣어두는 게 좋았을 걸.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는 그의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혀 깨물고 뒤지는 꼴이 보고싶다면.”
숨 막히는 정적을 유지하던 그때, 한숨을 푹 내쉬고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를 봐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였다.
우선 그가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의 사실이 있었다. 나는 무한한 존재이며 사실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지, 정 반대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겠다. 또 하나는 내가 평생을 연기해 온 사람이라는 것과, 아침마다 내 상태를 체크하던 의사들 그리고 방금 전의 그 녀석, 당신까지 속이는 것 쯤은···. 정말 우스웠다.
난 너의 상상을 뒤집어 줄 수도 있었는데. 이곳에 발이 묶인지 약 1년쯤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날 두려워했어야지. 이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너의 첫번째 실수야.
이 말을 하는 지금도, 당신이 내게로 오고 있는 와중에도 시야는 점점 뚜렷해졌다.
그래. 내가 그를 봐야했던 이유는 작별 인사였다.
문이 열리기 직전 처음으로 바라본 이 곳은 참 별 볼 일 없었다.
아아, 태형아. 네 이름을 부르는 건 아마 지금이 마지막이겠지.

“······.”
그래도 역시 넌 너무 아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