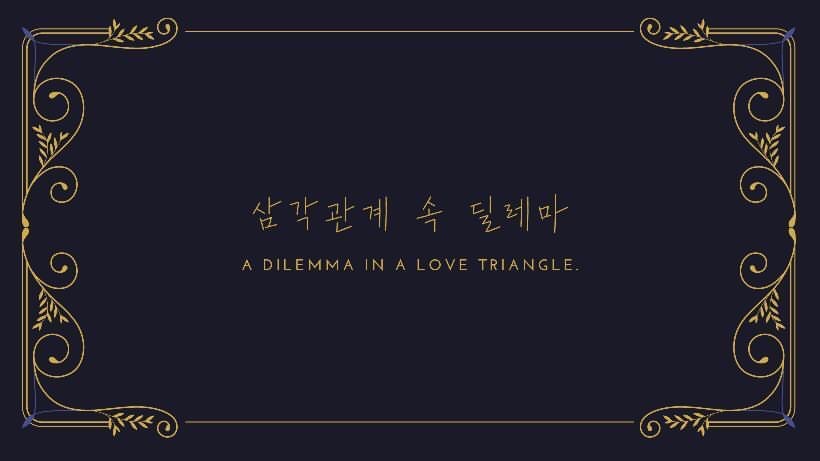
18. 뒤틀림 (4)
말랑공 씀.
*본 글은 피에 대한 묘사를 살짝 포함하고 있으니 보시는 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 박지민도 너처럼 사랑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애로 보여서 동정심이라도 느꼈냐?”
정수연의 깊은 침묵 속 건조한 공기가 무겁게 상공했다. 아무래도 그녀의 정곡을 태형이가 찌른 듯 보였다. ‘사랑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애.’ 정수연은 그 말에 뇌 속에 모든 회로가 정지되었다. 항상 여유롭기만 했던, 언제나 타인을 저의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갖고 놀기를 즐기며 미소 지었던 그녀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태형은 그 모습이 꽤 볼 만 했다. 그렇게나 역겨워하던 애가 처음으로 여유롭지 못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 순간이었다. 창고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호석이가 나오며 태형이가 정수연의 멱살을 거칠게 쥐고 있는 것을 봤다. 앞뒤 상황을 몰랐던 호석은 너무나도 놀라며 태형에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손 놓지 못 하겠냐고, 역정을 내며 그들에게 대번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든지 화를 내지 않고 다정하게 웃어 주었던 호석이가 역정을 내니 태형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태형이가 알던 정호석이란 언제나 다정한, 형같은 사람이었으니깐. 태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게 정수연의 탓인 것만 같았다. 괜히 정수연이 제 속을 긁어 놔서, 그 탓에 본인이 정수연의 멱살을 틀어쥐게 되었고, 그것을 본 호석이 성을 내고 있으니… 정수연은 태형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자신을 탓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정수연에게 향하는 태형의 눈빛에는 대놓고 원망이 서려 있었기에. 정수연은 호석이가 듣지 못 할 정도로의 목소리로 태형의 귓가에 속삭였다.
“왜, 지금 이 상황도 나 때문인 것 같니?”
아까 여유롭지 못 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태형이가 보이고 만 틈을 비집고 들어와 여유롭게 휘젓고 있다.
정수연과 태형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태형이가 정수연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말려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 호석은 아까보다 언성을 더 높이며 말했다.
“김태형, 그 손 놔!!”
태형은 호석이의 그런 언성 높인 목소리는 처음 들어 봤다. 항상 다정하게 웃어 주던 사람이 언성을 잔뜩 높이며 자신의 원수의 편을 들어 주고 있다니. 태형은 이 상황이 정말 못마땅하고 역겨워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정수연의 멱살을 놓지 않으면 호석이와의 관계가 더 틀어질 것만 같아 내팽개치듯 거칠게 놓았다. 그 탓에 정수연은 중심을 잡지 못 하고 옆에 있던 테이블을 치며 바닥 쪽으로 넘어지듯 몸이 기울어졌다. 그 무렵이었다. 정수연이 테이블을 침과 동시에 그 파동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방금 전 태형이가 지민에게 준, 그러나 지민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생딸기 주스로 전달되었다. 그 생딸기 주스는 바닥을 흥건하게 만들었고 그 내용물을 담고 있던 유리잔이 바닥과 함께 충돌하여 깨졌다.
그 일은 정수연이 바닥에 넘어지기 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수연은 유리잔의 파편 위를 손으로 짚으며 넘어졌다. 그 탓에 정수연의 손바닥에는 파편이 잔뜩 박혔고 그녀의 무릎 또한 파편에 쓸려 상처가 나 있었다. 그 카페 안은 아주 잠시동안 침묵이 돌았다. 정수연의 손바닥과 무릎에는 자잘한 상처들과 꽤 큰 상처들 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형은 그 피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고 말았다. 그렇게 분노라는 감정에 엄습 당하지만 않았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자책을 했다. 아무리 정수연이 싫어도 역겨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원치 않았다. 아무리 그녀가 원수라고 해도 피를 보고 싶을 만큼의 원수는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태형은 굳었던 몸을 애써 움직이며 정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호석이가 먼저 정수연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은 다음 정수연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태형에게 이만 가라고 말했다.
“저, 그래도……”

“그만 가라고 했어, 김태형.”
한껏 차가워진 호석의 표정과 말투. 태형은 마치 주변 공기도 차가워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 온몸에 냉기가 돌았다. 태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을 한 뒤 제 짐을 챙기고는 카페를 나갔다. 태형은 카페를 나가기 전 정수연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를 거의 중얼거리듯 남겼다. 그의 바로 옆에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이다. 그래서 정수연은 그의 사과를 당연히 듣지 못 했고, 결국 태형의 죄책감과 미안함은 정수연에게 닿지 못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