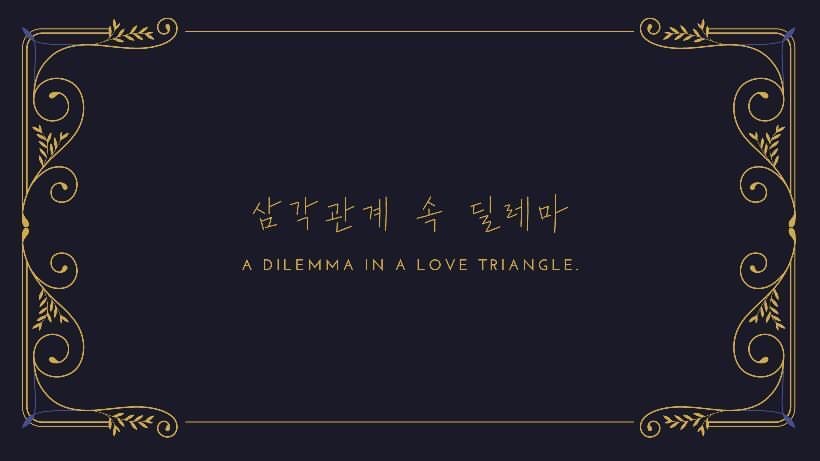
19. 역겨운 추억 속 향기
말랑공 씀.
“수연아, 괜찮아? 진짜로 병원 안 가도 되겠어?”
“네, 괜찮아요. 그보다 괜히 저 때문에 잔 하나 버려서 어떡해요…”
“왜 너 때문이야. 김태형이 갑자기 네 멱살을 잡고 그렇게 내팽개친 게 잘못한 거지. 넌 잘못 없어. 그러니까 네 탓하지 마.”
병원은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정수연의 말에 호석은 급한 대로 구급상자를 가져와 지혈해 주고 약도 발라 주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진 척하는 정수연을 위로해 주며 태형의 잘못이라고,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했다. 정수연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위로해 주는 호석이 참 우습기도 했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정신이 팔려 이성적인 판단도 못 내리다니. 정수연은 그가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호석은 여전히 장미 향을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정수연의 유혈과 낭자한 생딸기 주스가 뒤섞이며 풍기는 피비린내를 뒤덮을 정도로 말이다. 정수연은 차라리 피비린내가 장미 향을 뒤덮었으면 좋겠다고, 피비린내의 역함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다. 장미 향이 코를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 때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자꾸만 상기되고 구역질이 나올 만큼 역겨워서, 그래서 정수연은 장미 향을 싫어했다.
모든 치료를 마친 호석은 구급상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다. 그러곤 정수연에게 다가가 무릎은 괜찮냐고, 일어설 수 있겠냐고 걱정스런 눈빛을 담은 채 물었다. 정수연은 당연히 걸을 수 있다고 말하며 부축해 주려는 호석의 손길을 거부했다. 호석은 거부 당한 손을 허공에 잠시 머무르게 하다 괜히 머쓱해져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 무렵 정수연은 다리를 조금씩 절뚝거리긴 해도 혼자 알아서 잘 걸으며 밖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더 진한 장미 향이 카페 안에 진동해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호석은 그런 정수연을 뒤따라 나갔다. 아무래도 절뚝거리는 그녀가 걱정된 것 같았다.
***
정수연은 바깥 공기를 쭉 들이쉬었다. 탁한 공기였지만 역한 장미 향보다는 나아서 상쾌하다고 착각하여 입밖으로 내뱉었다. 상쾌하다고. 그러나 호석은 의문스런 표정을 지으며 공기가 오늘따라 많이 탁한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구태여 입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호석은 굳이 정수연의 말을 부정하며 그녀에게 무안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야옹~”
갑자기 어디선가에서 고양이의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연과 호석은 무의식적으로 고양이의 울음 소리를 쫓아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허름한 상자 속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에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정말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춥다고, 버림 받아서 외롭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쩐지 정수연은 고양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정수연은 덜덜 떨고 있는 고양이를 제 품으로 안았다. 처음에 정수연의 손에 들릴 때 고양이는 발버둥을 치는 듯 보였지만 정수연의 품속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해 그녀의 품에 더 포옥 안겼다. 고양이는 정수연의 품이 따뜻하고 편안한 듯 보였다. 정수연은 그런 고양이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려지다니.”
“…그러게.”
호석이가 맞장구를 치자 그제서야 정수연은 호석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가족일수록 이러면 더 안 되는데. 가족일수록 더 버리면 안 되는데. 그쵸, 사장님?”
호석은 그 말에 움찔거리며 더 이상 맞장구를 쳐줄 수가 없었다.
“그나저나 이 아이는 어떡하죠.”
“내가 당분간 맡아 둘게. 넌 지금 많이 다치기도 했고… 어서 집에 가 봐. 가서 푹 쉬어.”
“알겠어요. 감사해요, 사장님. 아 참, 고양이한테 향수는 해롭다는 거 아시죠?”
“그래? 그건 몰랐네. 앞으로 향수는 자제해야겠어.”
“내일 봬요.”
정수연은 안고 있던 고양이를 상자에 조심스레 놨다. 그러곤 고양이를 한 번 미련하게 쳐다본 뒤 집으로 향했다. 호석은 장미 향을 타고서 부는 시린 겨울 바람을 맞으며 정수연의 뒷모습을 그저 지켜만 봤다.
***
집에 도착한 정수연은 온몸에 힘이 풀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은 정수연의 예상에 빗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서 지친 모양이었다. 그렇게 침대에 앉아 유리의 파편들 탓에 상처가 나 붕대를 감은 제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이건 흉터로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정수연은 푹푹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러곤 눈을 감았다. 오늘은 푹 잘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러나 하늘은 정수연에게 호의적이지도 관대하지도 않았다. 그날 정수연은 자기가 가장 잊고 싶어하던 역겨웠던 기억을 꿈에서 만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