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엇갈려 오가는 사이
엇갈려 오가다 마주친 종말이 좋진 않아서, 사랑은 무리나 0에 가까운 둘에게 그 이상이 가능킨 했을런지.
차라리 그 틈 사이로 도망쳐버려.
태형이 죽은지 일주일은 됐을까, 통보에 가까운 보고를 위해 당일 용건을 끝마치고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보스실로 올라갔다. 문고리 뭍에 찬 기운이 손에 더러 소름이 오르더니 열고 들어서자마자 유은의 목근처로 날카로운 쇠붙이가 덤벼들었다. 유은이 헛웃음을 치곤 정색을 하자 석진은 미동도 없이 칼을 목 가까이 더 들이밀었다. 그는 표정도 없이 간담이 서늘하도록 꺼린 분위기를 풍겼다.
“ 이게 뭐하는 짓이지. 맨 손으로 칼 쥔 미친놈 하나 제압 못 할 정도로 내가 나약하진 않다는거, 너도 알지 않아? 왜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고 그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꼭두각시 보스님 주제에. ”
“ 시발.. 모른척 하면 아닌줄 알게? 만만하게 보진 말지. 우두머리 그깟 것 때문에 거지같은 근성 하나로 네 손에 날 쥐어줬던게 멍청하게 보일 순 있어도, 우리 계약은 그날 끝난 걸로 아는데. 멋없게 언제까지 우려먹을 생각이야. ”
“ 무려 주종 관계를 네맘대로 휘두르면 어째. 겨우 너같은 것도 날 방해할 자격을 주려고 거기 올려둔게 아닌데. 말했잖아, 네 목줄 내가 쥐었다고.
그전에 이 날 좀 떨구지? 상당히 위협적이긴 한데, 겁은 안 나거든. ”
“ 내가 왜 칼을 네목에 들이미는지는 니가 더 잘 알지 않나? 됐고, 다 필요없어. 네 애인이나 내놔. 그 야비한 경찰새끼 감춰두고 넘겨주지 않을 생각이야 말고. ”
“ 머리도 나쁜가봐? 분명 죽은 새끼를 왜 나한테서 찾으실까. 궁금하면 신당이라도 찾아가봐. 꽁무니도 못 쫓던 새끼 넋을 거기서라도 찾을지, 혹시 알아. ”
유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질끈 묶어올린 머리칼을 쥐어 당겼다. 고개가 뒤로 젖혀진 유은이 눈썹을 드리내리며 눈을 깜빡이곤 입 안으로 혀를 굴렸다. 여전히 칼을 대며 태형의 위치를 순순히 불라는 석진의 손에서 칼을 빼내 그가 쥔 머리칼을 그위로 사정없이 잘라버렸다. 헛웃음 가득한 비소를 내비친 유은이 개지못하고 언짢은 심기를 한껏 드러냈다.
야, 깝치지 말랬지. 시발.
“ 깝치긴 누가 깝쳐.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넌 내 아래라고. 지금 너 하나 죽이는게 설마 어려운 일 일까봐. 별 개같은 게. 그러게, 그 경찰 새끼 위치만 불면 안 건드린다니깐? 사랑 그깟 게 뭐라고 버텨. 니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소중하게 굴지 말았어야지. 미련하..., 으윽 ”
듣다못한 유은이 싸늘한 눈빛으로 오른 입술을 이로 물고 두 손으로 석진의 목을 옭아맸다. 긴 숨을 뱉고는 더세게 쥐자 그가 반 쯤 얼이 나갔을까 손을 갑자기 놓자 순식간에 주저앉는 그를 보고 시선을 옮겼다간 비웃었다. 힘없이 늘어진 석진의 손을 즈려밟았다. 그가 고함을 지르자 실컷 웃더니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 이봐, 정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단순하게 생각하지마. 죽이고 싶을정도로 증오하게 됐는데 그제 와서 사랑은 무슨 사랑. 아무때나 낭만적이지 말란 말이야. 근데. 그 정도 흥미도 없는 너같은 새끼는 그냥 죽여버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
텅빈 눈으로 공허하게 뒤를 바라보던 석진의 눈에 급히 초점이 돌아오자, 그정도 깡으로 보스라니 너무 무른거 아니냐며 턱을 괴기 일수였다. 입술을 흩으며 고개를 기울여 석진에게 눈을 맞추고 씨익 입꼬리를 끌어 웃었다.
죽여줄까?
미쳤구나.
알면서, 뭘
“ 정말 하나도 안 미안한데, 난 김태형이 살았든 죽었던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깐 되도 않는 억지 부리고 좀 비켜. 니가 앉아있는 그자리 니 방 문앞이잖아? 난 이 더러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
유은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손을 털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석진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다.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 알아챘을땐 이미 늦은 후였다. 총알 두어개가 등 뒤로 박혔고 유은이 그대로 쓰러지자 석진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알아, 김태형을 숨긴 게 네가 아니었단 것 쯤은. .. 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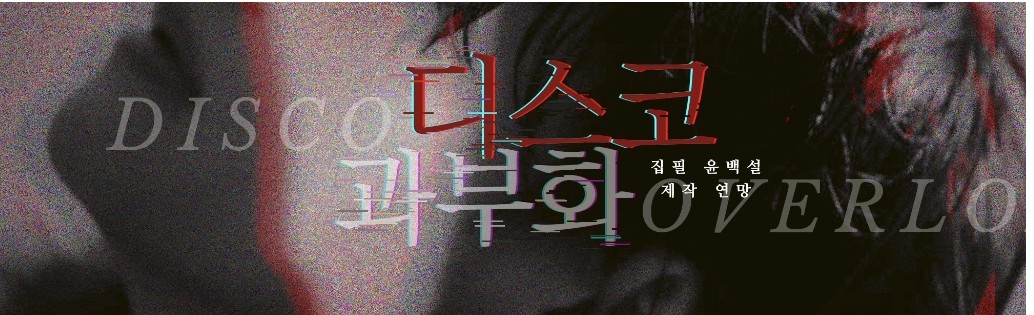
의식을 되찾았지만 차갑게 식은 바닥과 아무것도 보이지않은 채로 손발이 모두 묶였으니, 더군다나 총을 맞은 탓에 무기력하게 있는 수밖이었다. 어딘가 어긋나 철이 긁히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리자 빛이 조금 새들어왔다. 발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들어오자 유은은 묶인 줄을 풀려 안간힘을 다했다. 마침내 전등에 불이 들어오자 그 건너편에 같은 자세로 묶인채 의식을 잃은 태형이 보였다. 죽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하필 끌려온게 이쪽동네 보스 놈이었을 줄은.
한편 잠깐 정신 팔렸을 사이 머리로 기분 나쁜 강도의 세기가 둔탁하게 밀렸다.
“ 부보스, 그러게 왜 나댔어. 우리 보스가 화가나서 너 좀 족쳐놓으래잖아. 예쁜 얼굴 망가지면 안돼는데, 으응? ”
“ 미쳤ㅇ, 아악. ”
그는 유은이 말할 틈도 없이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그래, 민윤기. 그 미친놈. 그렇게 멍이 여럿 생겼을 쯤 열린 문으로 누군가 들어와 민윤기를 기절시켰다. 그러곤 태형을 부축해 나가려는데 유은이 말을 건넸다.
“ 이봐요, 경찰 아저씨. 저도 좀 데려가죠. 보다시피 맞는 중이라 아마 두면 난 죽을 것 같은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