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래드윔프스 - 과호흡♪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마주한 너는.
다시 마주한 나를.
모순적인 다정함으로 심장을 찌르려 했다.

처음엔 부정. 다음은 분노. 마지막은 허탈.
사람이 미치는 데에 방법은 수없이 많았고, 나에게 있어 그중 하나는 너라는 이유였다. 쪽지 하나 남겨두고 행적을 감춘 널. 그런 너에게 드는 한순간의 감정을 그 어떠한 단어로도 정의하지 못했을 만큼 속이 울렁였다.
"...."
그래. 내가 미워서 떠났겠지. 미우니, 원망하니 떠났겠지. 근데, 윤기야. 그럼 마지막까지 날 미워했어야지. 원망했어야지.
[ 사랑해. ]
이기적인 감정으로 날 붙잡으면 어떡해.
잔인한 감정으로 날 과거에 묶어 두려 하면 어떡해.
윤기야. 민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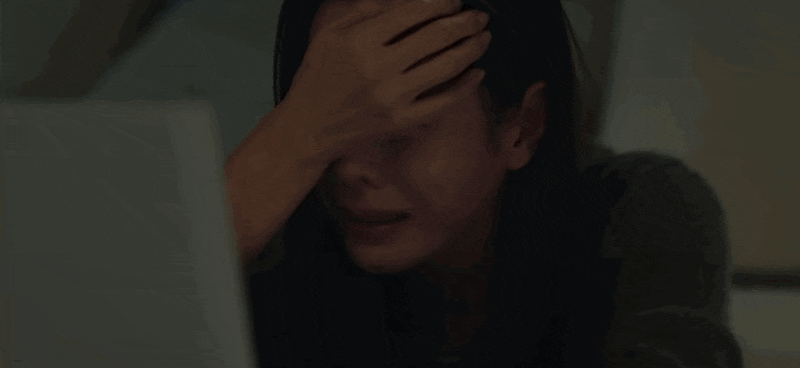
이 이기적인 놈아.

선배! 오늘 과 회식 올 거죠? 아니. 아 선배~
김태형의 앙탈에도 필기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곧 시험이야. 저 말을 들은 김태형은 잠시 움찔했다. 잠시였다. 정말 잠시.

"거짓말. 아직이잖아요."
"들켰다."
"아 진짜!!!"
필기하는 반대 손을 잡고 징징거리기 시작한 그의 머리 깊은 곳에서부터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이걸 골이 울린다고 하던가. 그래도 절대 안 된다. 과 회식 장소. 거기엔 또 다른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진득이 남아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가면 정말 제어기능을 상실할 거 같아서.
"에라잇... 그럼 됐어요."
"응."
"아 맞다. 선배 지금 졸업반이죠?"
"... 나 놀려?"
"아니요. 진짜 궁금한 거."
"뭔데."
민윤기라고 알아요? 3년 전에 그만둔 선배. 끽. 몸이 굳었다. 아니, 몸을 넘어 뇌까지 얼어버렸다. 이것 봐. 난 니 이름 하나로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을 어떻게 마주해.
침묵으로 물었다. 눈빛으로 물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온갖 생각들이 날 지배해갔다. 설마 너의 지인이야? 친한 형이야? 윤기 근처엔 너 같은 친한 동생이 있다곤 듣지 못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아니야. 알고 있으면 윤기 어디 있는지 알아?
"그 선배 돌아왔대요."
"... 뭐?"
"이번 과 회식 때 온다고 해서, 그냥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
그리움은 익숙함을 상기 기키고. 익숙함은 그리움을 불러온다.
"... 오늘 나도 갈게."
"네?"
"과 회식 나도 간다고."
그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감정들의 근원지를 찾아야 했고. 그곳이.
너여서.
너.
너라고 윤기야.
김태형 얼굴이 활짝 폈다. 선배 저 오고 첫 과 회식이나 거 알아요? 알아. 알지. 너무 잘 알고 있지. 내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와 함께한 곳이라면 계속, 매번 맴도는 내가 유일하게 회피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부딪쳐야겠다.
"무리하지 마. 너 힘들잖아."
그곳에 새로운 과거를 묻히면.
그 과거가 잊힐까 해서.

달그락. 한 손에 쥘 수 있는 소주잔을 채우고 비우길만 20분이 지나갔다. 초조함에 두 송곳니로 입안 여린 살을 씹어 알코올과 동시에 피 맛이 입안을 맴돌았다. 오지 않는 걸까. 그저 소문에 불과했을까.
"천천히 마셔. 너 술 약하잖아."
"까분다."
"머리 아프지. 일어나. 나 술 안 마셨어."
익숙한 대화들이 상기되며 가슴 깊은 곳. 일렁이며 올라온 감정의 파도가 찬찬히 날 잠겨누르기 시작했다. 곧이어 눈이 핑 돌며 아릿한 고통을 안겨온다.
"맞다! 여주 선배 오늘 오랜만에 과 회식.. 선배?"
"...."
"선배 울어요?"
"!!!!"
아. 그제야 자각했다. 내 볼을 타고 흐르는 게 절망에서부터 흘러내린 눈물이란걸. 소매로 벅벅 닦아내도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제발. 수많은 눈동자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힌다. 보지 마. 제발.
"나, 나 바람 좀."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재촉했다. 투명한 유리문을 통해 몇 초라도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너 나 없으면 어쩔래 이제."
지독하리 따라오는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 기억들 때문에 더부룩해진 속을 게워내고 싶었다. 손잡이를 향해 뻗은 손. 그리고 닿기도 전 한 박자 빨리 열린 문. 그곳엔.

"안녕"
"...."
"오랜만이야. 여주야."
네가 서있었다.

"...."
"얼굴 보니까... 음."
그저 반가워. 오랜만이잖아. 우리. 더더욱 진득하게 꽂힌 시선들. 우리라는 명칭 덕에 그들이 나를 보는 건지, 너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뭣들의 시선보다, 지금 내 눈앞에 서있는 네가 더 중요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보고 싶었어. 원망스러웠어
왜 그 한마디로 떠났어?
왜?
왜 나에게 그랬어?
"... 다 설명해야 할 거야. 아니면,"
"아 설마 너 아직도 나 못 잊었어?"
"야."
"미안. 아직도 네가 과거에 묶여사는지 몰랐지."
...야 민윤기.
... 풉.
아하하하... 미안.
거짓말 티 났어?
"...."
"난 보고 싶었는데. 넌 나 보고 싶었어?"
응? 여주야.
우리 그래도 좋았잖아.
서로,
사랑이라는 걸 해봤잖아.
배웠잖아.
그리고,

버렸잖아.
"보고 싶었어."
"...."
"널 버리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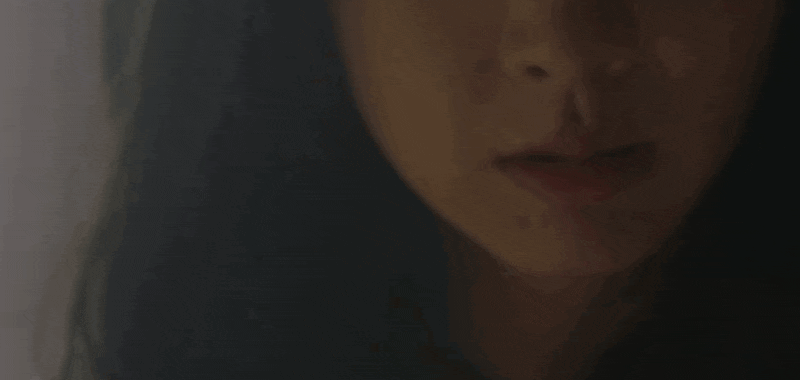
"...."

"내가 직접 찾아왔어."
"왜 울 표정이야...."
널 무너뜨릴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 같잖아.
아아. 미안 여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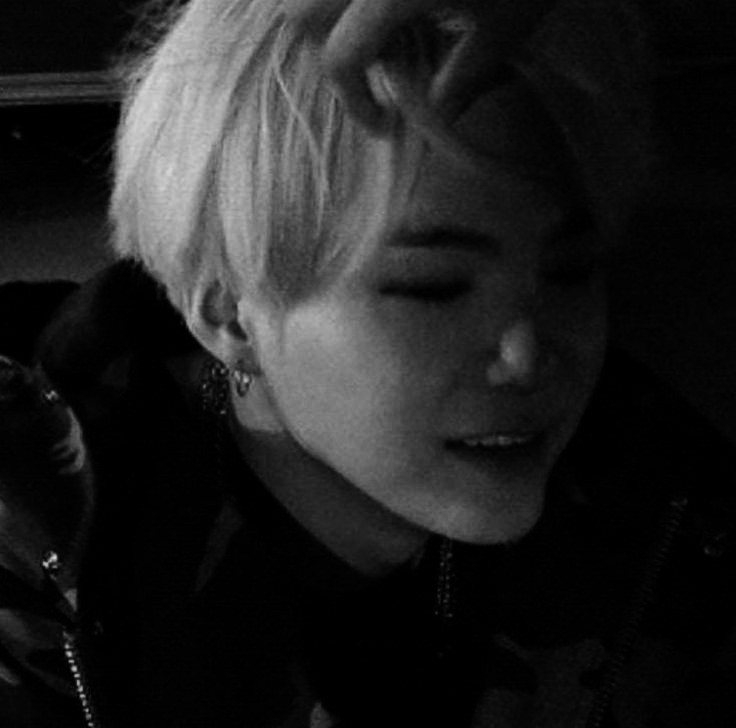
그만 웃어야 하는데. 미안.
헛구역질이 입 끝까지 차올라 끝내 견디지 못하고 그를 밀쳐 미친 듯이 달렸다. 방금 전 말들이 윙윙거리며 울린다. 날 괴롭힌다. 눈물도 어딘가 망가진 듯 얼굴에 범벅이 되어갔다. 쿵. 어두운 골목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벽을 짚고 모든 것을 게워냈다.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오랜만이라고 하던 너의 모습이 이기적이면서도 그리워서. 모진 말을 내뱉은 너 자체가 갈증 나서. 그래서 내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불쌍해서. 멈출 줄 모르는 액체가 계속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것이, 볼품없어서.
"괜찮아?"
"...."
"울지 마 여주야."
"... 으흑."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직은 울지 마.
나를 위해서.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마주한 너는.
다시 마주한 나를.
모순적인 다정함으로 심장을 찌르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