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Jules Brave - Nothing To Talk About♪
모순적인 다정함을 느꼈다.
그 다정함에 의해 고통을 느낀 나는, 그 감각을 안고.
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어깨 위에 무겁게 올려져 있던 그의 손을 느릿하게 쳐냈다. 결국엔 나, 나 때문에 떠났던 거였네. 힘겹게 물었고 돌아온 건 잠깐의 침묵. 그 와중에, 그 짧은 침묵에도 윤기의 입에서 긍정의 답이 나올까 봐 기대했다. 바보같이.
"응."
"... 그럼 왜 다시 왔어. 그냥 계속 떠나버리지."
"말했잖아. 너 때문에 왔다니까."
"...."
"내가 널 얼마나 잘 아는데 여주야."
윤기야.
이젠 입에 담기도 버거운 이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줄까.
난 그 이름의 주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물었다.
한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 내가 추락할 수 있는 길을 물었다. 떨어질 준비도 전에 절벽의 위치를 물었다.
너에게 버려질 바엔 내가 혼자 무너질게. 너 힘 안 들어도 돼. 나 혼자 다 할게. 응?
"넌 여주야, 참. 뭐랄까."
"...."

"이기적이야."
"... 뭐?"
"너 혼자 무너지면 내가 그때껏 쌓아온 계획은?"
"... 그럼 넌."
"...."
그렇게 떠나고 이기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어?
조여주.
눈물이 무섭게 멈췄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목소리 톤이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렇다고 평소의 톤도 아닌. 정말 이기적이야. 내가 이 짓을 하는 이유도.
너여서.
너.
너라고 조여주.
그의 목소리고 귀에 울렸다. 윙윙거리며 괴롭혔다. 그 대답 한 번에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라며 괴롭힌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목을 벅벅 긁었다.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던 습관. 그리고 넌 무의식적으로 쳐냈던 두 손을 다시 내 어깨를 감쌌다. 훅 끼치는 익숙한 향, 말투.
"상처 나 여주야."
"... 그만해."
"연고 사다 줄까?"
"제발, 윤기야."
"이거 봐. 너 아직 과거에 묶여있다니까."
"제발!!!"
가!!! 제발, 가라고!!! 윤기를 밀쳤다. 힘없이 밀려나가는 그의 눈을 마주하지도 못 한 채 울부짖었다. 그래 나 과거에 묶여있어. 그 사랑해 한 단어 때문에. 그 이기적인 한 단어 때문에. 평소에 너와 나눴던 그 단어 때문에. 너와 함께 해서 가볍게 느껴졌던 그 단어 때문에.
몇 년이고 죽이려고 했다.
[ 사랑해. ]
무겁고 무서운 단어로 변질된 건지, 아니면 원래 그 뜻이었을지 모를 단어가 족쇄가 되어 날 과거라는 감옥에, 추억이라는 독방에 묶어두었다.
근데,
이젠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 생각이 날 지배해서 어쩌면 네가 날 버려도 지금처럼 버텨오면 될 거 같다는 힘없는 자신감이 생겨서.
나 버린다고 했지.
버릴 테면 버려.
난 처음으로 너에게 칼을 내밀었다.
"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널 잊어 볼 테니까."
"...."
"과거 잊어 볼 테니까."
우리 서로 열심히 하자 윤기야.
누가 버리는지, 누가 버려지는지.
끝끝내 마주한 윤기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읽기도 전에, 내 말이 끝나자마자 마 틀어졌다. 그의 인영이 사라지고 나니, 누군가 내 무릎 뒤를 친 듯 힘없이 털썩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쓰다듬었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조여주.
장하다.
장하다....

... 장하다.
눈이 떠졌다. 동시에 속이 매스꺼웠다. 어제 너무 게워내서 그랬던 건지, 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지난밤의 일. 윤기는 소리 없이 돌아왔고 동시에 선전포고했다. 날 버리겠다고. 그 말에 나도, 그를 버리겠다고 했을 때.
아.
널 버리겠다고 했지.
술기운에 찌든 몸을 일으켜 거실로 걸어 나오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민윤기를 지우는 일이었다. 매번 날 반겨주던 벽에 걸려있는 액자들을 뜯어내고. 죽을 듯이 그리울 때마다 들여다봤던 앨범은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치우는 와중에도, 너의 목소리가 날 괴롭혔지만, 끊임없이 내 심장을 긁어냈지만.
"여주야."
서로의 이니셜이 새겨진 팔찌를 끊고.
"사랑해."
드라이브에 저장해둔 사진들과 동영상을 지우고.
"보고 싶었어."
"... 어."
순간 머릿속을 거칠게 지나친 말 한마디에 그제야 거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느릿하게, 천천히, 하나하나 둘러봤다. 그리고 좌절하며 울부짖었다.
민윤기를 지운 내 공간은.
"...."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민윤기가.
내 전부였다는 걸 자각시켜주는 거 같아서.
나는 민윤기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해주는 거 같아서.
오후 강의 때문에 급하게 마음을 추스르고 강의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강의실에는, 예상대로 민윤기가 있었다. 내 쪽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며. 그 덕에 후배, 동기, 선배 상관없이 나에게 시선이 꽂혔다.
"왔어?"
"... 어."

"어제는 잘 들어갔고? 많이 취한 거 같던데."
순간 넓은 공간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 소음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나에게 눈을 고정하여 집요하게 답을 재촉하는 민윤기. 자신 있게 대답하리라, 믿었지만 막상 그의 얼굴을 마주하니 내 노력이 쓸데없던 자존심으로 변질되는 느낌이었다. 입 뻐끔하기도 버거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직도 속 안 좋아?"
"...."
"하긴,"
너 술 먹기 전엔 꼭 꿀물 마셨잖아.
나 없다고 안 마셨지?
결정타가 날아왔다. 강의실의 소음은 이제 소음이 아니었다. 모두 대놓고 나와 민윤기를 두고 떠들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져오며 머릿속이 혼잡해졌다. 눈앞이 핑 도는 그 순간, 훅 코를 찌르는 익숙하면서 차가운 향. 그 향의 주인은 내 어깨를 잡아 몸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내 신경들을 그의 향으로 돌렸다.
"선배 어제 나랑 들어갔는데."
"...."
"꿀물도 내가 챙겨줬고."
"...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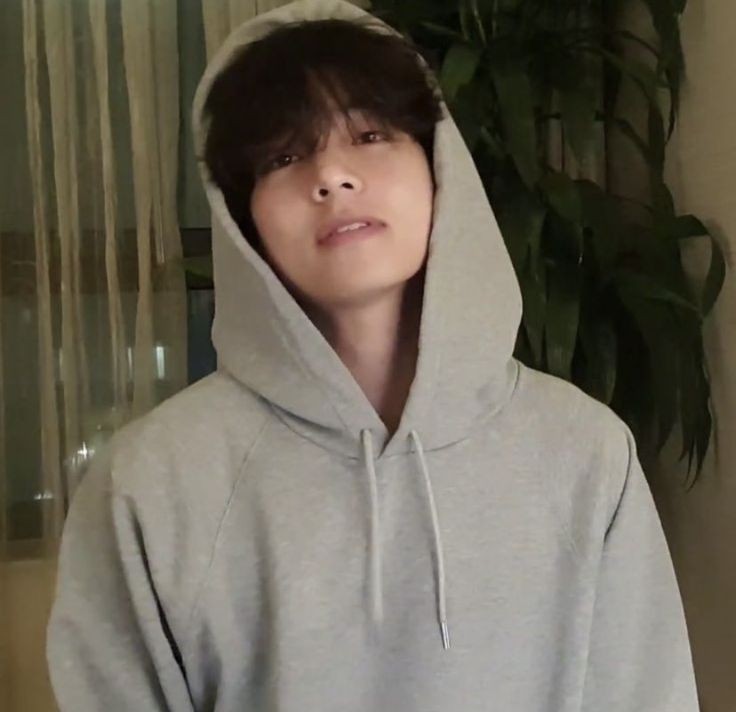
"그렇죠 선배?"
목소리의 주인이, 그 익숙하면서 차가운 향의 주인이 태형이란 걸 몸이 느끼자 심장 박동이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선배, 나랑 잠깐 나가자. 아무도 들리지 않게 작게 읊으린 그의 말에 난 옅게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렸다.
그 잠깐 사이에 마주했던 민윤기의 얼굴은, 기억 못 했지만 입이 벙긋인 건 또렷이 기억했다.
뭐라 했더라.

"... 시발."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겠지.
모순적인 다정함을 말했다.
그 다정함에 의해 고통을 느낀 너는, 그 감각을 안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