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를 거 없던 지극히 평범했던 날.
"센터장님. 호출하셨다고,"
"어, 그래."
"무슨 일인지."
"너도 이제 성인이지 않느냐."
"...."
"팀을 이뤄야 하지 않겠어?"
"... 팀."
몇 마디가 평범하지 못한 날로 바꾸었다.
팀. 그 단어에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다. 너희.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심장박동이 잔잔하게 손목으로 타고 흘러 생생하게 느껴진다. 난, 팀을 이루고 싶다. 너희들과.
"이룰 사람이 없다면 내가 지정해 줄 생각이었다만,"

이미 넌 있는 거 같구나.
고개를 옅게 주억였다. 팀이 이뤄진다면, 떨어질 일도 없을 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나였기에. 이십 대의 새로운 시작을 너희와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랜 시간 굳어 있던 입꼬리가, 활짝 올라갔다. 아아.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날아갈 것만 같아.
손에 쥐여있는 서류가 신기루같이 느껴졌다. 놓아버리면 가루처럼 흩어날아갈 거 같이, 그만큼 꿈만 같아서. 방에 도착해, 8개의 눈동자 시선이 쏠림과 동시에 손에 꼭 쥐여있던 서류를 보여들었다.
"그거...."
"... 응. 맞아. 팀 신청 서류."

"우리 팀 만들어? 진짜?"
"그럼 가짜겠어?"
행복 가득한 목소리가 좁은 방을 메꾼다. 막내인 정국이는 기어코 눈물을 보였고 내 첫 친구였던 윤기는 적당히. 이 분위기에 맞춰 기분 좋은 가이딩을 내보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행복한 미소를 띤다.
"빨리 펜 가져와!"
"아 네가 가져가!"
"ㄴ, 너?
그래.
이렇게 행복했으면
"...."
이렇게 평생 행복했으면, 아무도 다시 아프지 않았을까.
"우리 팀명은 어떡하지."
"... O팀."
"O 팀?"

"우리 이름에 다 알파벳 O 들어가잖아."
잠시 모두가 자신들의 이름을 영어로 되새기다 손뼉을 쳤다. 정호석 너 천재구나. 망설임 없이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각진 곳 없이 둥근 것이, 퍽 우리의 관계 같았다.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딱 알맞은 팀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팀명도 정했다, 이제 각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써 내려갔다. 만장일치로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린 내가 맡게 되었고 만일을 대비해 부 리더를 나 다음으로 오랜 시간 센터에 있던 윤기로 선정했다. 모두의 글씨체를 모아보니 정국과 남준 빼고 이상하리 만큼 글씨체가 비슷했다.
"나랑 정국이 빼고 글씨체 다 비슷하네."
"센터 생기고 1년 동안은 글씨체도 똑같아야 한다고 훈련시켰거든."
"근데, 정호석 너는 제일 나중에 들어왔잖아."
"우리 형이 센터에 있었거든. 형이 언어 공부 가르쳐줘서 글씨체도 닮았나 봐."
"... 아."
방 공기가 한층 가라앉았다. 호석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 이유는, 반정부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형 때문이었다. 어둠으로 가득한 골목길에 제 눈을 가리고 울고 있던 그의 모습에 손을 내민 나였고, 그렇게 센터로 데리고 왔다. 어떻게 보면 상처로 가득한 너희를 내가 보듬고 싶었나 보다.
"여주는 엄마를 쏙 빼닮았네. 특히 마음씨가 참 고와."
... 보듬어주고 싶다.

난 너희를 꼭 절벽에서 끌어올리고 싶었다.
"팀명은 O입니다. 팀원들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하여주 잘 자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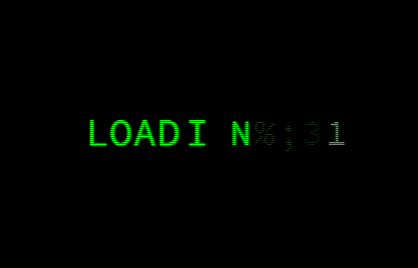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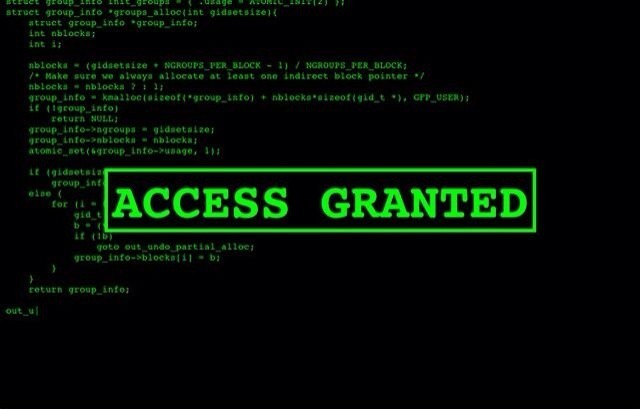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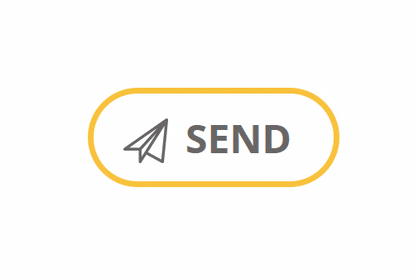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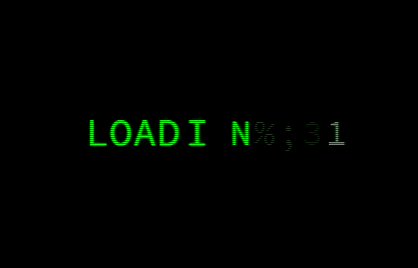
"... 무슨 꿈을 꾸길래."

"그렇게 웃고 있어. 여주야."
내가 널 언제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언제쯤 꿈에서도 고통에 허우적거리게 만들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