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돌고 돌아 너를 만나게 되었어.
내 십칠 년, 모두 너를 만나기 위해 걸어온 것만 같다는 착각이 자꾸만 들어. 난 네가 정말 좋아. 내 모든 걸 네가 다 가져간다해도 좋아. 너에게 내 모든걸 바칠 수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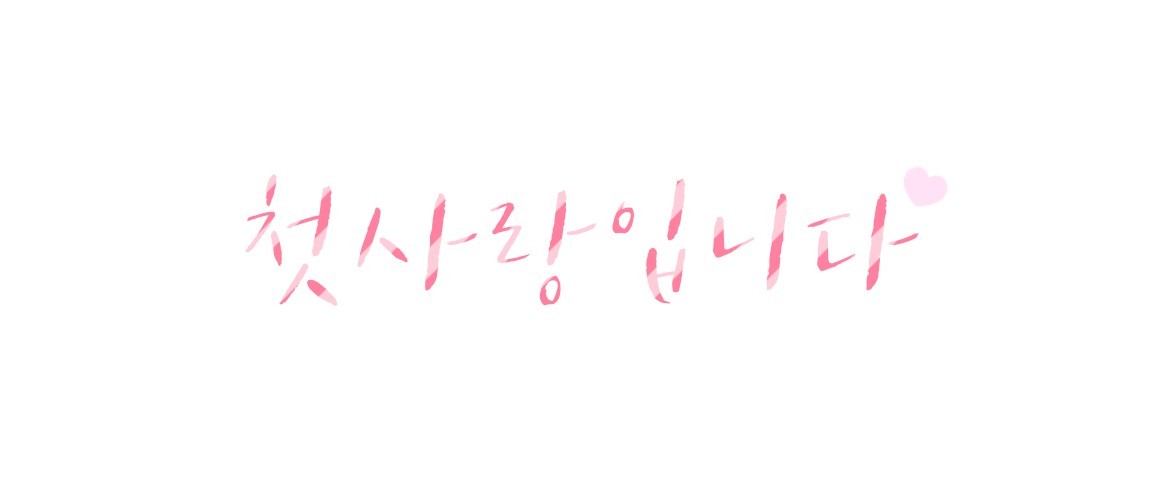
One. 첫째 날
한국의 집은 생각 보다 조용했다. 곧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필요한 내 편입 절차도 꽤나 무난하게 해결됐고, 이곳의 가족들은 내가 하는 일들엔 관심이 없었다. 그게 나에 대한 무관심인지, 나에 대한 배려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차라리 잘 된 일이었다. 딱히 친해질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그건 상대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으니까.
***
한국에 온 지 삼 일.
주변을 살펴 보기 위해 잠시 외출을 하기로 했다. 무더운 여름이니 그에 걸맞게 크롭티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나는 기다란 검은 생머리도 위로 질끈 올려 묶었다.
창 밖을 보니 오늘도 역시나 뜨거운 태양이 창을 통해 내리쬐고 있었다. 창틀에 손을 올려두니 강렬한 햇빛을 머금은 창틀이 따뜻했다. 너는 좋겠다.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을 테니까. 늘 반겨주는 햇빛도, 달빛도 벗삼을 수 있을 테니까. 네가 모두 닳고 부서질 때까지 너를 비춰줄 테니까.
어딘가 조금 울적해지는 기분이었다.
말갛게 갠 하늘과 새빨간 태양이 있는 여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
한국의 시내는 꽤 활기찼다. 대충 입고 나온 내 옷차림이 무색해질 정도로 예쁘게 꾸민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지만.) 다들 자신의 길을 가지만 그 발걸음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그런지 어딘가 생기 있는 느낌이었다. 바빠 보이는 그들 사이에서 꼭 나만 목적지가 없는 듯 했다.
"아, 씨발."
그러다 갑작스레 맞닿은 어깨에, 거친말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당황스러운 나는 당연히 더 익숙한 영어가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 영어면 당황할 텐데. 바보 같게도 그런 걱정이 내 머리를 가장 먼저 스쳤다.
"아이씨, 뭔, ...외국인?"
"Hey. Why you.Um. 뭐냐, 때리다가."
"때리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남자 아이 옆의 또 다른 남자 아이가 옆에서 조그맣게 말을 전했다. 키가, 꽤 크네. 어깨도 넓고, 입술도 꽤 이쁜...
"아 모르겠고, 왜 쳤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낮게 으르렁 거리는 남자를, 옆에 있던 남자 아이가 그를 막아섰다.
진정해, 왜 애꿎은 사람한테 그래. 라는 말과 함께.
"...저, 죄송합..."
"아 뭐야 이 새끼 한국말 할 줄 알잖아!"
"그만해, 그만."
실례가 많았다는 그의 말을 끝으로, 그 둘은 수많은 인파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저 멍하니 곧게 뻗은 길을 따라 걸었다.
이상한 사람들...
***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나였다. 와, 완전 바보 같아. 핸드폰도 없이 처음 오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걷다니.
"어휴... 난 정말 바보야."
(와... 나 정말 바보 같다.)
눈 앞이 캄캄했다. 같이 지내는 그들은, 날 찾으러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딱히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사라지면 좋아할지도 모른다. 돈은 받고, 그 돈을 쓸 나는 사라져서 없으면 자신들이 쓸 수 있을 테니까.
"하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아... 어떡하지?)
설상가상으로 조용히 몰려온 먹구름이 내가 길을 잃기를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비를 흩뿌려댔다. 춥다. 결국엔 또 이런식이다. 암흑속으로 떨어져도 내밀어주는 손 하나 없는. 늘 차갑고 건조한 현실들. 그 속에서 죽어나는 쪽은 언제나 나다.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확실히 영어쪽이 편하긴 한가 봐요, 혼자말도 영어로 하고."
따뜻한 말이었다. 물이 끓을 수 있을 정도로.
속지: pasture (님)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