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
(×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기껏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 봤자 김석진 정도. 하지만 김석진 마저도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이런 문제를 말하려면... 아, 박지민 보고 싶다. 유일한 내 그늘. 비록 옆에 있어 주는 게 다이긴 하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로 받는 그런 친구.
하긴, 내가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리는 없다. 난 어디서든,
"펠? 뭐해?"
"지금 이동수업 시간이야. 과학실로..."
석진이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잘게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급히 숨겼다. 아, 진짜 싫다. 약통을 거머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늦으면 선생님께 화장실 갔다고 말씀 드릴게."
다행이 석진은 아무런 의심 없이 나가는 듯 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손에 들려 있던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빈 통이 바닥에 나뒹굴며 나는 소음이 고막을 날카롭게 긁는 듯 했다. 펠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소름끼쳐.
그날, 펠은 4교시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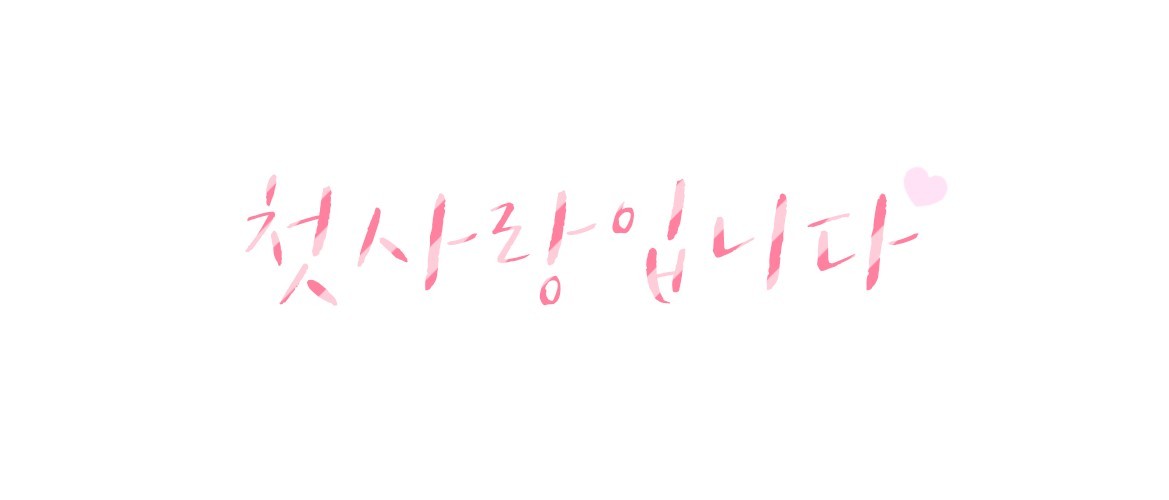
Six. 내가 모르는 너
다음 날, 펠이 퀭한 얼굴을 한 채로 나타났다.
눈 밑에 내려앉은 다크서클을 보고 가장 먼저 놀린 건 다름 아닌 태형이었다.
"어제 조퇴하더니 하루 사이에 좀비가 돼서 왔네~"
"좀비?"
"뭐야, 미국에서 왔다면서 좀비도 몰라? 죽었는데도 움직이는 그거 있잖아."
"Zombie, 말하는 거야?"
"와... 원어민 발음 지렸다. 근데 좀비 알면서 왜 내가 말하니까 모른 척 하냐."
태형이 펠의 머리카락을 마구 흐트러뜨리며 짖궃게 물어왔다. 펠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잔뜩 헤집는 태형의 손을 잡아채곤 방긋 웃으며 말했다.
"발음이 너무 구려서 못 알아 들었어."
"뭐? 내 발음이 구려?"
펠의 말에 태형이 다시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흐트러뜨렸다. 아 좀, 머리 다 엉켜!라는 펠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펠의 옆에 딱 붙어서 펠을 괴롭히는 태형은 전혀 그만 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다 이판사판으로, 펠이 똑같이 태형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나서야 태형은 항복을 외쳤다.
"쬐깐한 게 힘만 졸라 세선."
태형이 168cm인 펠에게 쏘아 붙였다.
"뭐? 니 눈엔 168이 작아 보이냐?"
물론 펠은 키가 큰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기준이었고, 펠은 한국에선 자신이 꽤 큰 축에 속한다는 것 쯤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봤자~ 나 보다 10cm나 작은 주제에~~"
키득키득 웃으며 펠의 머리를 한 번 콩, 쥐어박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 태형을 잡기 위해 펠은 팔까지 걷어붙이며 복도를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이게 무슨... 농담하는 거야?!"
(무슨... 나랑 장난하냐?!)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한국어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도 까먹은채로 말이다.
***
"젠장, 그게 너희 모두에게 원인이잖아."
(젠장,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라고?"
"날 때리지 않으면..."
(너가 날 때리지만 않았어도...)
"아 조옴! 한국말로 해!"
"왜?"
(왜?)
"왜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해. 난 지금 좀 쉬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닥쳐. 지금은 그냥 쉬어야겠으니까.)
"아 진짜 너 짜증나!"
태형이 애꿎은 바닥을 쿵쿵 짓밟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펠은 여전히 옆에서 운동장 벤치에 앉은 채로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야, 근데 매점 안 가도 되겠냐? 너 지금 존× 힘들어 보여."
어느새 쿵쿵대는 것을 그만두고 몸을 뒤쪽으로 기댄 태형이 아직까지도 헉헉대고 있는 펠을 바라보며 물었다. 태형의 걱정에 펠이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답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서 음료수 사준다니까?"
"됐어."
"아 진짜 고집불통이네."
태형은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벤치에 벌러덩 누운 뒤 하늘을 바라봤다. 뜨거운 햇살이 온몸을 내리쬐고 있었다. 이야, 하늘 맑다. 라는 감탄을 혼자 중얼거리는 태형을 바라보며 펠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여름 좋지 않아?"
"오지게 좋지. 근데 김석진은 싫어하더라."
"김석진?"
"어, 걔랑 나랑 이래 봬도 18년지기 친구 아니겠냐."
"그렇게 오래됐어?"
"응. 왜, 날라리랑 범생이랑 친구라니까 이상하냐?"
태형이 한쪽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대답했다. 시선은 여전히 하늘에 꽂혀 있었다. 자기도 자기가 날라리 같아 보이는 건 아나 보네. 펠은 태형의 말에 살짝 웃어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태형의 머리색은 새빨간 체리 색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태형이 날라리가 되는 건 아니다. 미국에선 어떤 머리색이던, 어느 나이에 화장을 하던 신경쓰는 법이 없으니까. 그저 개인의 자유일 뿐이다.
정작 펠이 김태형이 날라리 같다고 느꼈던 건, 잔뜩 뿌려댄 향수에 섞인 담배 냄새 때문이었다. 한국 나이로 열여덟이면... 미국 나이론 열일곱 밖에 안 된 건데.
"둘 다 잘생겼단 공통점은 있잖아."
"잘생긴 두 남자~"
펠이 희미하게 굳은 태형의 표정을 눈치채곤, 능글맞게 농담도 쳐줬다.
"푸핫, 그게 뭐야. 너 존나 웃긴다."
펠의 눈에 즐겁게 웃는 태형의 모습이 가득 담겼다.
"그렇게 웃으니까 보기 좋네."
***
하늘 꼭대기에 있던 해도 몸을 낮춰 하늘속으로 사라지려 하는 시간, 늦은 방과후였다.
탕탕-
석진이 화려하게 드리블을 하며 제 앞을 막아서는 태형을 뒤로 하고 골대 앞으로 향했다. 골대를 스치듯 지나치며 빠르게 던진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골대 부근에서 회전하다 밖으로 삐져나왔다.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 펠은 땅바닥으로 떨어진 공이 꼭 제 처지 같다고 생각했다.
"뭐야, 김석진이 슛 실수도 해?"
"어쩐지, 한동안 공부만 하더라니. 김석진 많이 죽었다?"
태형이 장난스레 석진의 어깨 부근을 두드리며 말했다. 김태형과 김석진. 이 둘의 조합을 학교 아이들은 눈호강 조합이라 불렀다. 둘 다 미남이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둘은 정반대의 미남이라 할 수 있었다. 태형이 친근한 아기 고양이 느낌이라면, 석진은 범접할 수 없는 숲속의 사슴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어쨋건 늘 붙어다니지만 늘 짜릿한 조합에 늦은 방과후까지도 운동장에 남아 둘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았다. 물론 그 중에는 펠도 포함되어 있다.
후우. 거친 숨을 내몰아쉬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농구를 해댄 탓에 온 몸이 축축했다. 머리카락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분명 펠은 나랑 가장 친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김태형과 하루종일 붙어다닌 걸 보니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짜증나. 내가 처음 봤을 때도,
그 후에도.
도와줬는데.
콰앙!
삼 점 슛을 날렸지만, 역시나. 백보드를 맞고 튕겨나가버렸다.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오랜시간 알고 지낸 김태형이 나 말고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난 걸까. 아니다, 김태형은 본래 곁에 늘 사람들이 가득했다. 아니면, 오늘따라 농구가 잘 안 돼서? 한동안 게임을 못해서? 곧 중간고사라서? 정답은 알 수 없었다. 괜히 생각들만 더 복잡해졌을 뿐.
나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농구공을 집어들었다. 텅 비어있던 벤치에는 어느새 학생들로 꽤 채워져 있었다.
"김태형, 우리 집 가자."
모든 문제가 객관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답지 않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머리속을 잠깐 스쳐지나갔다. 풀리는 게 없는 날이었다.
---
댓글, 구독, 응원 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늘 보고 힘이 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