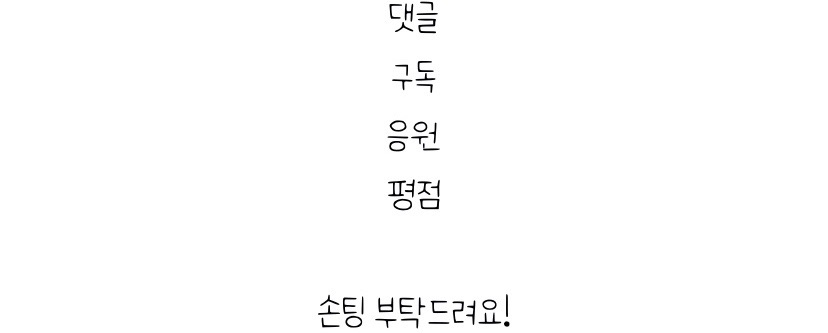날 망치러 온 양아치 전정국
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새빨갛게 번진 얼굴을 전정국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냥 피해버렸다. 다급하게 코인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였고, 나는 그 인파들 속에 뭍혀 가기로 결심했다.
“아, 내 가방…“
사람들과 섞여 빠르게 걷기 시작했을 때쯤, 나는 노래방에 두고 온 내 가방이 생각났다. 음료수를 뽑으러 간다는 핑계로 지갑과 폰은 내 손에 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지.
나는 가방은 내일 찾으러 가자는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내가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정국에게 잡히지 않아 다행이었고, 집 근처로 가는 버스를 빠르게 찾아 교통카드를 찍었다.
“… 이제 어떡하지.”
일단은 전정국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계속 피했다지만 같은 학교, 같은 반, 심지어 짝인 전정국을 언제까지나 피할 수는 없다. 내일 아니, 어느 한쪽이라도 마음 먹으면 당장이라도 마주칠 수도 있는 게 우리였으니. 머릿속이 제대로 복잡해 두 눈을 꼭 감고서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기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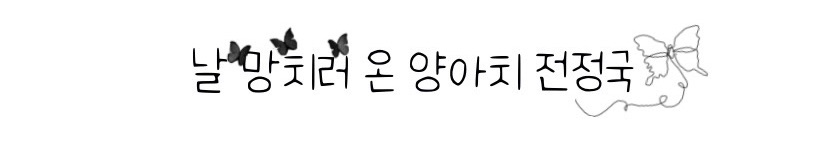
“학생, 학생!”
잠깐 눈만 감는다는 게 어느새 깊게 잠들었나 보다. 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뜨자 보인 건 내 어깨를 흔드는 버스 기사 아저씨였다.
“으음… 아저씨, 여기가 어디에요…?”
“어디긴, 종점이지!”
“네?!”
종점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창밖은 진작 캄캄해진 듯 했고, 버스에는 나와 버스 기사 아저씨 뿐이었다.
막막해졌다. 전정국을 피하려던 게 문제였을까,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핸드폰과 지갑 뿐이었다. 여기서 카드를 썼다간 엄마한테 들킬 게 뻔했고, 현금은 만원 조금 넘게 있었다.
“망했네.”
“학생, 여기 앉아서 좀 기다려요. 누가 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망했다며 머리를 쓸어넘긴 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버스 기사 아저씨였다. 종점역에 있는 나를 대체 누가 데리러 온다는 말인지… 설마 부모는 아닐 텐데. 나는 버스 기사 아저씨를 붙잡고 물었다.
“누가요?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내가 학생 깨우려는데 학생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 받았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이리 오겠다고 했어.“
“혹시 이름 같은 건요?“
”아,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여기서 좀 기다려 봐요-.“
그렇게 버스 기사 아저씨도 기다리라는 말을 끝으로 내 곁을 떠나고, 나는 근처 벤치에 앉아 누구든 오기를 기다렸다. 가만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세어보고 있었을 때, 우렁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더니 보이는 건,

“그러게 왜 도망가?”
바이크 헬멧으로 인해 망가진 머리를 손으로 털며 내게 다가오는 전정국이었다. 또 전정국이다. 어떻게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이는 건 전정국인지. 짜증났다. 이러면 내가 전정국을 피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 바이크도 탈 줄 알아?”
“어. 전부터 탄 건데, 처음 봐?“
“네가 안 보여줬으니까.”
“지금 보여주면 됐지, 뭘.”
고등학생과 바이크의 조합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고등학생이 타기엔 좀 어려워 보인달까. 길가에 쌩쌩 지나다니는 배달 오토바이 같은 느낌일까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전정국이 타고 온 올 블랙의 바이크는 배달 오토바이와 차원이 다른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근데 그런 아우라를 가진 바이크보다 내 눈을 먼저 사로잡았던 건, 전정국이었다. 와이셔츠 단추를 다 풀어헤친 채, 한 손에는 헬멧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칼을 털며 성큼성큼 걸어오던 전정국.
“멋있다.“
“드디어 네 마음에 좀 든 건가.”
“너 말고, 바이크.”
눈치 챘을지 모르겠지만 멋있다는 말은 전정국을 향한 거였다. 어두워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주변이 어두워서 전정국이 더 빛나 보였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멋있다고 했다. 언젠가 한 번은 해주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고. 하지만 나는 전정국이 아닌 그의 바이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직접적인 말은 왠지 좀 부끄러우니 말이다.
“도망간 김여주 잡으려고 타고 온 건데, 그냥 택시나 탈 걸 그랬네. 하다하다 바이크에 질투할 줄이야.“
전정국이 내 앞에 섰다. 나는 전정국을 올려다 봤고, 전정국은 바이크에 질투하는 자신이 웃긴 건지 손으로 눈가를 가리고 피식 웃고 있었다.
이제는 전정국을 보면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좋다. 어제보다 더, 아까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정국이 좋아지는 걸 보면 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거다.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정국에 대한 내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나는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 두 손으로 전정국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입술을 맞댔다.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전정국의 입술과 한 3초쯤 닿자 그대로 입술을 뗐고, 전정국은 그런 나를 내려다보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려나-.“
“… 너도 마음대로 했잖아. 나도 똑같이 돌려준 것 뿐이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전정국의 그 웃음이 싫었다. 단지 그 이유였다. 내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으면서, 금세 바뀐 건. 순순히 좋아한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전정국의 확실한 답이 듣고 싶었다. 본인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확실한 답.
“하여간 우리 여주는 솔직하지 못해.”
여전히 전정국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다시 한 번 두 눈을 꼭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끝으로 내 입술을 무는 전정국이었으니. 나는 전정국의 허리춤을 쥐었고, 전정국은 내 뒷목을 감쌌다.
우리는 깊고 늦은 밤에서야 같은 답을 말했다. 그것도 아주 진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