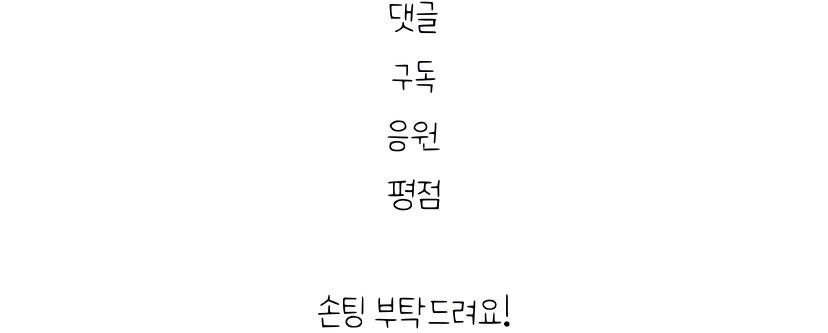날 망치러 온 양아치 전정국
전정국과 만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내리는 비였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비가 주륵주륵 내렸고, 해가 중천일 시간에도 어두컴컴할 정도로 날씨가 엉망이었다. 나는 비가 내리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날씨가 엉망인 날은 어떤 일이든 꼭 터지기 마련이었기에.
“… 그만 좀 쳐다보지?”
일단은 내 옆에 앉아 턱을 괘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전정국이 문제다. 등교한 순간부터 수업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까지 전부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자꾸만 의식하게 됐다.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에 풀던 문제집을 덮으며 전정국을 째려봤다. 대체 볼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좀 적당히 예쁘던가.“
나를 쳐다보는 건 멈추지 않은 채, 입꼬리만 살며시 올린 전정국에게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 튀어나왔다. 어울리진 않지만 나는 저런 말들을 꽤나 좋아하나 보다. 순간적으로 두 뺨이 뜨거워지며 새빨간 홍조가 번졌다.
“우리 여주는 딸기 공주님인가 봐.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이 새빨개져?“
“뭐, 뭐래! 이 능글맞은 놈이…”
“좋아하면서 왜 그래-.”
반박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전정국은 참 능글맞고, 정말 이상한 놈이었다. 뭐, 그런 전정국을 좋아하는 나 역시 이상했지만 말이다.
“전정국, 넌 내가 왜 마음에 들었어?“
“행복하지 않아서.“
갑작스레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질문이었다. 분명 전정국은 내게 본인의 마지막 타깃이 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나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
행복하지 않았기에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그 말 자체가 좀 아리송 했다. 사실 내가 아닌 어느 누가 들었어도 인상을 찌푸렸을 거다.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전정국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렇게 지내다간 한 순간에 꺾여버릴 것 같았거든, 너.“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살다간 내가 확 죽어버려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나 역시 생각했으니까. 나는 아마도 예전의 나를 누구든 알아주기를 바랐던 게 아닐까 싶다. 전정국 같은 사람을 바라고, 또 바랐을 지도.
“이 정도면 답이 됐나?“
“… 엄청.”
“다행이네.”
“아무래도 내가 널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한 손으로 내 헤어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전정국에 기분 좋은 듯 두 눈을 감았다.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진심과 함께 내 입술에 따뜻하고 말캉한 촉감이 닿았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게 전정국의 입술이라는 걸 알았다.

“쭉 그렇게 좋아해 줘. 도망갈 생각은 추호도 말고. 내가 누구보다 예뻐해 줄 테니까.“
스쳐간 입술에 아쉬웠던 것도 잠시, 감았던 눈을 떴을 때, 가까이 보이는 전정국의 얼굴과 들려오는 달콤한 말에 활짝 웃었다. 하지만 여전히 창문 밖으로는 비가 후두둑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불안하게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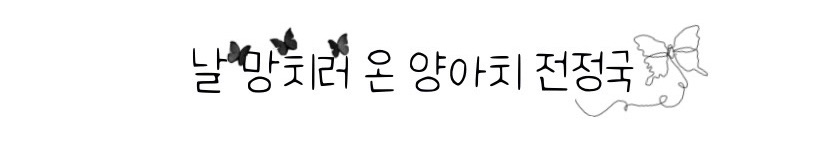
내 예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다. 더군다나 비가 잔뜩 내리는 날에는 더. 여느 때와 같이 전정국과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고 밤 늦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띡, 띡, 띠리링-.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턱 막혔다. 빠르게 신발을 벗고 캄캄하고 넓은 거실을 넘어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하… 진짜 싫다……”
나에게만 들릴 법한 볼륨으로 중얼거렸다. 어떤 곳보다 편하고 좋아야 하는 이 공간이 싫은 걸 넘어서 역겹고, 갑갑했다. 내가 가방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자 기다렸다는 듯 울리기 시작하는 전화벨이었고, 그 주인공은 전정국이었다.
화면에 떠있는 전정국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던 내가 전화를 받으려던 때, 방문이 철컥 하고 열렸다. 깜짝 놀라 폰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고, 내 앞에는 무시무시한 엄마라는 존재가 서있었다.
“아, 안 주무셨어요…?”
힘껏 쥔 두 주먹에 부들부들 떨렸고, 내 목소리 역시 덜덜 떨렸다. 곧 있으면 몸 전체가 떨려올 것 같은 느낌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곧 시험인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이런 때일 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잖아.”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일부터는 더 늦게까지 할 거예요.”
“믿어도 되는 거지?“
”… 물론이죠.“
내게 툭툭 던지는 엄마의 말에 가시가 돋쳐있는 느낌이다. 뭔가 알고 있으면서 나를 시험하려는 듯한 그런 소름끼치는 느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있던 엄마는 그 손을 풀고, 바닥에 나뒹구는 내 폰을 주워 내게 건넸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다.“
직접 건넨 폰을 잡았을 때, 엄마는 손에 힘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힘을 더 꽉 주며 나와 눈을 마주쳤고, 약간의 미소와 함께 내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악마와 겹쳐 보였다.
“오늘 읽은 책에 쓰여있던 문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 글쎄요. 잘 모르겠어ㅇ,“
”사람이건, 물건이건, 네게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너한테서 멀리 떨어뜨려놔야 한다는 걸 알아둬.“
“……”
“그렇지 않으면 언제 부서질지 모르니까.“
일종의 경고였다. 엄마는 지금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알고 있다. 엄마가 전정국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건… 전정국이 위험해 졌다는 것. 엄마는 지금 내 선에서 전정국을 정리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입 안에서 피 맛이 맴돈다. 입술과 입 안을 너무 꽉 깨물었던 건지 보이진 않지만 새빨간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정적과 함께 엄마와 눈이 다시 한 번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나를 빨아들일 것만 같이 매혹적이었다.
내가 발악을 해도 완벽한 자유를 찾지 못한다면, 죽어도 이 곳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전정국이라도 내보내야 했다. 내 인생에 발을 들인 전정국을 저 멀리 떨어뜨려놔야 한다. 그래야 전정국이 안전할 테니.

“하루면 돼, 딱 내일 하루만.“
나는 내 인생에서 전정국을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미치게 아파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걸 애써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