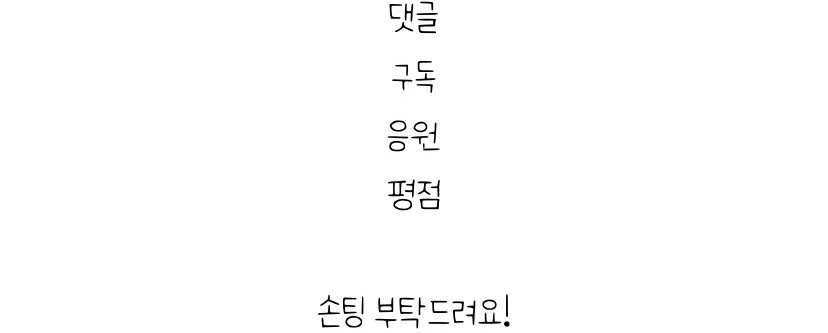날 망치러 온 양아치 전정국
아예 잠을 자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잘 수가 없었다. 침대 구석에 몸을 쪼그리고 어두웠던 하늘이 밝아지는 걸 지켜봤다. 그 모습을 지켜보니 괜히 울적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이런 내 모습을 흔히 말하는 새벽 감성이라 정의하려고 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전정국을 애써 지우며 말이다.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전정국을 어떻게 밀어낼지 고민했다. 무작정 밀기만 해서는 밀려날 것 같지 않은 그라 더 힘들었고 괴로웠다.
“해야 돼… 아니, 그냥 해.”
시끄러운 드라이기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다. 머리카락이 말라가는 동안 입술을 몇 번씩이나 꽉 깨물며 다짐했다. 지금 내게 선택지라고는 하나 뿐이었기에.
교복을 갖춰입고, 가방을 매고, 팅팅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다. 전정국이 습관처럼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지만 않는다면 울었다는 건 들키지 않을 듯 싶었다. 깊은 숨을 내뱉고서 현관을 나섰고, 웬일인지 평소에는 등교를 하던 말던 거들떠 보지도 않던 엄마가 팔짱을 낀 채 나를 배웅했다. 배웅이라기엔 무언의 협박 비슷한 것이었지만.
오랜만에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매일 걷던 길을 걸었다. 매일 아침, 밤마다 걷던 이 길이 오늘따라 왜 이리 애석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오늘의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 이럴 거면 만나지 말 걸.“
진심 반, 거짓 반이었다. 이런 식으로 헤어질 거였다면 차라리 안 만났을 거라는 나의 후회와, 전정국과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나의 욕심이 섞였다. 너는 분명 나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애초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서야 깨달은 내가 참 어리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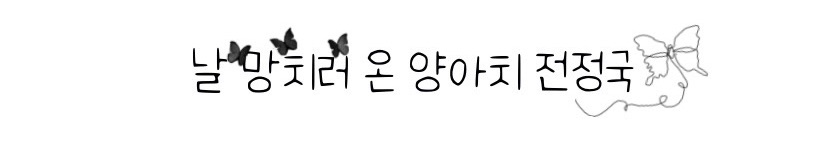
혼자 남는 건 언제나 외로운 법이다. 오늘도 텅빈 교실을 보니 나는 또 외로워졌다. 전정국이 있어 그나마 사람의 온기를 느꼈고, 전정국이 있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나는 오늘 스스로 내 목을 조르는 거나 다름없다.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펼쳐 가장 어렵다는 미적분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게 되니까. 이어폰을 꼽고, 수학 문제집을 계속 풀어대자, 어느새 반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었다. 물론 그 사이에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전정국도 있었다.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
“……”
“내가 와도 눈길 한 번 안 줄 정도로?”
전정국의 말들에 답하지 않은 건 고의가 맞다. 겉으로는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듣지 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어폰에서 흐르던 음악이 멈춘 건 한참 전부터 였다.

“나 왔어, 여주야.“
전정국은 그제서야 내 귀에 꽂힌 이어폰이 보인 건지 자리에 앉으며 한 쪽 이어폰을 잡아 당겼다. 이건 분명하게 본인을 보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몸을 한 번 흠칫 할 뿐, 시선은 여전히 문제집에 두고 있었다.
“흐음-, 이번에는 뭐에 심통이 났을까…“
그때, 전정국이 내가 보고 있던 문제집을 덮어버리곤 내 의자를 본인 쪽으로 돌렸다. 나는 결국 전정국을 마주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전정국을 바라보는 척, 전정국의 어깨에 눈을 맞췄다.
“여주야, 나 봐.“
“……”
“나 보라고, 김여주.“
내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였다.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나는 전정국에게 하기 싫었던 말도, 차마 할 수 없었던 말도 다 해야 했기에.
전정국이 내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내게도 보였다. 너무 잘 보여서 더 슬퍼질 정도로. 나는 전정국의 손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정국과 눈이 맞았다. 3초. 그렇게 아무런 말과 행동 없이 딱 3초가 흘렀다. 전정국의 눈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건지 하마터면 얼굴을 붉힐 뻔했던 걸 겨우 버텨낸 뒤, 내 턱을 잡고 있는 전정국의 손을 쳐냈다.
“내가 뭐 잘못했어?”
“……”
“답답하게 굴지 말고 얘기 좀 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빌고, 그렇지 않아도 져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자꾸만 건들여지는 눈물샘에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전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쓸데없이 너무 다정했고, 나는 그런 다정함이 지금은 원망스러울 뿐이다. 차라리 내게 화를 낸다면 홧김에라도 헤어지자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이라도 할 텐데… 왜 다정하기만 한 걸까.
“…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
“김여주, 나 이러다 너한테 화낼 것 같다. 말하기 싫으면 좀이따 얘기해.”
전정국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내게 화를 낼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머리를 쓸어넘겼다. 나는 그새 전정국의 행동을 읽었다. 전정국은 화를 겨우 참고 있다는 게 보였고, 그 순간이 내겐 기회였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전정국의 화에 밀려 헤어지게 된 것처럼 꾸밀 수 있는.
“아니, 지금 얘기해. 옥상에서 기다릴게.“
가만히 서있는 전정국에게 등을 보이며 먼저 반을 나왔다. 학생들이 떠들고 있는 복도 사이를 빠르게 지나쳐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의 문이 열리자 쌀쌀한 바람이 몸을 스쳤다. 나는 스스로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어떻게든 전정국을 이용해 이별을 하려는 내가 참 쓰레기 같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 어떻게 내가, 어떻게… 걔를 밀어내……“
나는 전정국을 밀어내기 위해 어떤 나쁜 말이든, 쓰디 쓴 말이든 해야만 했다. 내 입에서 전정국을 향해 그딴 말들이 튀어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헤어지고 돌아서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다. 진심이 아닌 말들로 상처주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 더럽게 성질 부리고 헤어지는 게 나았다. 그래야 다시 얼굴을 봤을 때, 미운 감정이라도 들 테니.
두 눈을 꼭 감고, 마지막으로 큰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속으로는 부디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랐고, 동시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옥상 문이 열렸다. 전정국은 불어오는 찬 바람에 눈살을 찌푸리더니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어 본인 팔에 걸쳤다.
“안 추워?“
”… 별로.“

”이렇게 떨면서 안 춥긴, 뭘. 덜덜 떨지나 말던가.“
전정국은 터벅터벅 내게 가까이 오더니 본인 팔에 들려있던 후드티를 내게 입하려고 했지만, 전정국이야 말로 반팔티에 와이셔츠 한 장 걸치고 있어 나보다 추워 보였다. 나는 후드티를 입혀주려는 전정국의 손길을 거부했다.
“됐으니까 너 입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항적이야?”
“……”
“그냥 입어라, 좀.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전정국의 후드티를 거부하던 손은 전정국의 걱정과 함께 멈췄다. 내 손이 멈추자, 곧바로 내게 본인의 후드티를 입힌 전정국이었고, 그렇게 우리 사이에 어색함이 잔뜩 흘렀다.

신작임니다! 한 번 오셔서 간질거림을 잔뜩 느껴보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