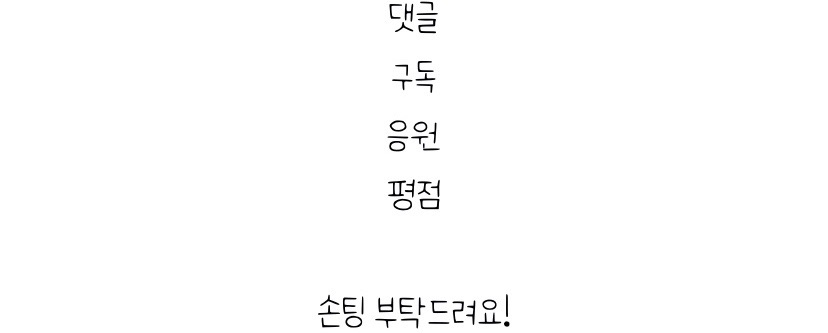날 망치러 온 양아치 전정국
한참의 적막 사이, 옥상 난간에 몸을 걸치며 한숨을 푹 내쉬는 전정국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전히 차가운 공기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차다 못해 얼음장 같은 우리와 달리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너를 안 볼 수 있을지. 하나도 모르겠다. 차라리 전정국 네가 수학 문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풀긴 어려워도 답은 정해져 있을 테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야?“
“어?”
“나한테 말하기 힘든 거냐고.”
전정국이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애틋함, 분노, 걱정. 여러가지가 뒤섞여 복잡했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감정 소비인 듯 싶었다. 서로 예뻐하고, 마음껏 좋아할 시간도 부족한데. 아니, 오늘이 지나면 그 시간조차 없어질 텐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벅차오른 나는 전정국에게 달려가 안겼다.
“김여주, 너 진짜 무슨 일 있ㅇ,“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꽉 안아주라.“
나의 몸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떨려온다. 전정국은 내 몸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진작 알아챈 모양이었다. 내가 품에 안긴 순간부터 그의 허리춤을 잡은 나의 손에 힘이 들어간 순간까지 전정국은 가만히 나를 안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응?“
”……“
”대체 뭐길래 우리 여주가 나한테 먼저 안길까-.“
분명 능글맞은 말투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다정했고, 행동 역시 달달했다. 전정국의 품에 안겨 두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어느새 내 등을 토닥이는 전정국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 손길은 차가운 바람에도 미치게 따뜻해서 꼭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전정국의 손길을 충분히 느꼈다. 어차피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느낄 수 없는 온기일 테니 말이다. 내가 본인의 품으로 더 파고들자 전정국은 잠깐 멈칫 하면서도 나를 계속 다독였다.
그렇게 한참을 서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던 상관이 없었다. 그렇게 1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나는 그 종과 함께 전정국의 품에서 나왔다.
“… 전정국.“
”응.“
”… 정국아.“
”응.“
전정국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힘겨웠다. 나를 재촉하지 않는 전정국이, 쓸데없이 따뜻한 전정국이, 미치게 다정한 전정국이 너무 미웠다. 한 발자국 뒷걸음질 쳤다. 전정국이 내게 다가오지 않게 적정 거리를 두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방어였고, 전정국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함이었다. 나는 이제 전정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를 만나기 전의 나로 돌아가야만 했다.
“… 우리 그만하자.“
전정국과 나의 눈은 여전히 서로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반응일까 싶다. 곧바로 그러자고 할지, 나를 잡고 놓지 않을지, 아님 저번과 같이 내게 선택권을 넘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내게 선택권이 넘어온다면 나는 전정국을 버릴 거라는 거.

“내가 그만할 것 같나, 우리 여주는?“
“뭐…?“
“널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전정국의 눈이 매섭게 변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표정이었다. 나는 전정국을 버려야 했고, 전정국은 나를 본인의 옆에 계속 두려고 했다.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전정국의 말에 나는 잔뜩 긴장했다. 그의 눈이 정말로 그럴 거라 말하고 있었기에.
점점 나를 향해 다가오는 전정국에 반대로 나는 점점 뒤로 물러섰다. 극에 달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에게 잡힐 거라 생각한 건지,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등이 난간에 닿자 씨익 입꼬리를 올리는 전정국이다.
“김여주, 위험해. 이쪽으로 와.“
“… 싫어.“
“애새끼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제발.”
“싫어, 싫다고!”
이렇게 된 이상 전정국이 날 놓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설령 전정국을 떼어놓기 위해 쓴 방법이 전정국에게 큰 상처가 되더라도, 나는 해야만 했다. 전정국과 나의 거리는 약 다섯 걸음 정도. 내 몸은 옥상 난간에 닿아 있다. 나는 나를 걸고 전정국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더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야말로 좀 꺼져.“
“……“
”타깃? 자유? 그딴 게 대체 뭐라고… 전정국, 넌 그냥 나 같은 애들 데리고 노는 거야. 나 다 알아, 도와준다고, 같이 가자고 손 내밀어 놓고 결국 망가뜨리는! 악마 같은 새끼잖아, 너.“
“… 여태 날 그렇게 생각했냐?“
“어, 생각해 보니까 넌 처음부터 날 망치려 했더라? 양아치들 전형적인 수법인 줄도 모르고… 믿은 내가 바보지.“
심장 부근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박는 것도 모자라 상처만 잔뜩 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아팠던 건, 상처 받은 듯 옅은 웃음을 띠는 전정국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전정국의 입에서 그만하자는 답과 함께 내 주변에 닿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받아내야 했다. 전정국은 나를 멀리 할 수록 안전할 테니…
“후회 돼. 난 왜 하필 전정국 널 만났고…“
“김여주.”
“넌 왜 굳이 나를 타깃으로 삼았어…? 대체 왜!“
“여주야.”
”차라리 내가 널 좋아하지 않게 하지… 이 나쁜 새끼야……“
울음이 섞인 나의 마지막 말로 전정국은 아마 다 알았을 거다.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 진작 알았을 지도 모르겠다.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아프긴 더럽게 아프네.“
“……”
“잠깐 투정 부린 거라고 생각할게. 지금 내가 한 말들, 다 잊을게. 그렇게 해줄 테니까 내 옆에 있어, 여주야. 부탁이야.”
내게서 저런 말을 듣고도 나를 옆에 두겠다는 전정국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나는 전정국의 옆에 있으면서 얻은 게 많았지만 전정국은 그렇지 않아 보였다. 내가 네게 해준 것도 없는데 대체 왜…!
“… 전정국,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게, 나 원래 이런 놈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냐.”
전정국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자리잡았다. 허공을 맴돌던 전정국의 시선이 나에게 꽂힌다.

“아무래도 너 때문인가 봐. 자존심 다 버리고 네 앞에 서있을 정도로 네가 좋아졌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언젠가부터 잔뜩 고여있던 눈물이 수도꼭지를 돌린 것 마냥 멈추지 않고 새어 나온다. 끝까지 전정국은 내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던 내가 더 미워졌고, 나를 더 원망했다.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차갑고 텁텁한 옥상 바닥에 털썩 주저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만 나다. 전정국은 그런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나를 꼭 안은 뒤, 머리칼과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