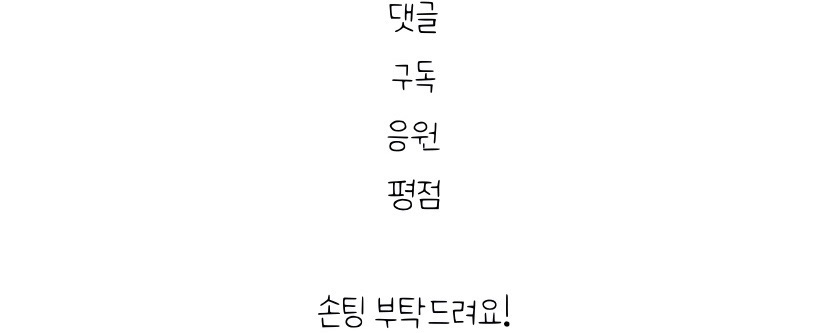날 망치러 온 양아치 전정국
나를 달래는 전정국의 손길이, 숨쉬기 힘들 정도로 우는 나를 안고 있는 그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지는 아무도 모를 거다. 전정국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무서웠던 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가 어떤 인간인지 가장 잘 아는 나였으니.

“우리 오랜만에 땡땡이나 칠래?“
울음을 그친 나를 품에서 떼어낸 전정국은 눈가와 코 끝이 시뻘개진 나를 보며 피식 웃었다. 손으로 나의 뺨을 가볍게 쓸고 난 뒤, 땡땡이를 치자며 건넨 전정국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은 나였다.
옥상에서 내려와 전정국의 손을 꼭 잡은 채, 운동장 중앙을 가로질러 달렸다. 뒤늦게 우리를 발견한 선생들은 호통을 치면서 뒤를 쫓으려 했지만, 전정국과 나는 이미 교문을 넘은 뒤였다.
전정국의 손을 잡고, 학교를 뛰쳐나온 나는 숨이 차게 달리는 동안에도 전정국을 쳐다봤다. 바람이 찼음에도 온몸이 뜨거운 걸 보니 아마도 나는 전정국을 멀리 하지 못할 것만 같다. 내 선택은 언제나 전정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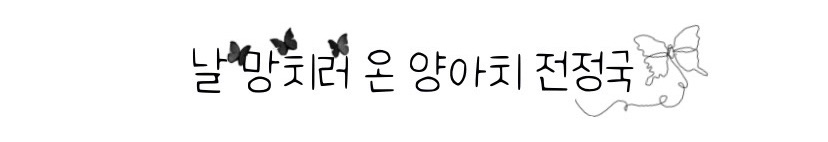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쳤다. 근처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곳이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정국은 나를 앉혀두고 금세 편의점을 한 바퀴 돌더니 이것저것 집어 계산한 뒤, 내게 건넸다.
“마셔, 바람 엄청 차더라.“
“고마워…“
따뜻한 병에 담긴 유자차였다. 나는 전정국의 이런 점을 좋아한다. 본인은 정작 물 한 병을 까 마시면서 내게는 유자차를 건네는 그런 자상함을. 전정국은 내 옆에 앉아 가만히 밖을 쳐다봤고, 나는 전정국이 사온 것들을 찬찬히 둘러봤다. 아몬드 사탕, 쿠키앤크림 초콜릿, 콘 수프 맛 과자.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다 내가 좋아하는 거네?“
“뭐, 어쩌다 보니… 애초에 난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전정국이 벌게진 본인의 귀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부끄러운 듯 얘기했다. 좀 의외였다. 전정국이 내 앞에서 부끄럼도 타는 사람이었던가? 오글거리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던 애가… 전정국도 이런 면이 있구나 싶었다. 귀여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베시시 웃어버리고 만다.
“뭘 웃어, 바보야.“
“그냥, 좋아서.”
“진짜 바보네, 김여주. 이게 뭐야, 울다가 웃다가.“
“치… 그럼 계속 울기만 하라고?”
“아니, 웃기만 하라고.“
쭉 정면만 보던 전정국이 나를 빤히 쳐다본다. 나는 그 말에 곧장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나는 앞으로도 눈물을 쏟을 날이 아주 많을 것 같았으니.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어젯밤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한다.
억지로 올렸던 입꼬리 마저 쳐지고 있다는 걸 미처 몰랐다. 전정국이 본인의 손가락을 뻗어 내 볼을 쿡 찌르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차 싶었던 나는 전정국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입꼬리를 올렸지만 이미 시끄러워진 머릿속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넌 뭐가 그렇게 다 힘드냐.“
“어, 어…?”

“행복해지려는 너를, 대체 누가 자꾸 막는 건데?”
생각에 푹 잠긴다. 전정국 말대로 나는 행복해지려는 중이었다. 그래서 반항도 하고, 일탈도 하고, 사랑도 해보는 중인데 대체 뭐가 이렇게 내 목을 꽉 쥐고 있는 걸까? 답은 딱 하나 뿐이었다. 엄마. 나는 여전히 그녀가 무섭고, 두렵다.
“글쎄… 우리 엄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엄마라는 걸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순간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했다. 분명 내게 힘이 되어야 할 존재인데… 우리는 대체 왜 이런 형태인 건지. 결국 내 입가에 쓴 웃음이 자리잡고야 만다.
“있잖아, 나는 엄마가 무서워.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엄마 앞에 서있으면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아, 그렇다고 나를 때리는 건 아닌데… 그냥 좀……“
”……“
”그 사람한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엄마, 아빠 인생이 너무 잘나서 더 그렇게 느껴져.“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 여주야. 당장 내가 널 필요로 하잖아. 안 그래?“
내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조그마한 위로를 전하려는 전정국이다. 전정국의 작은 위로는 너무나 따뜻해서, 움츠려든 나의 어깨를 점차 펼 수 있게 만든다. 하마터면 또 눈물을 흘릴 뻔했다.
조금씩 눈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걸 인지한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일부러 더 활짝 웃어보였다. 하지만 부모를 향한 내 마음 속 응어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기에 눈물을 꾹 참아보며 또 한 번 입을 열었다.
”알아, 아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일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
억지로 웃고 있던 입꼬리가 떨려오더니 결국 그 옆으로 눈물이 한 방울 스쳐 지나갔다. 분명 나는 웃고 있는데 눈은 그렇지 않나 보다. 어느새 내 얼굴은 전정국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나는 부모 잃은 어린애 마냥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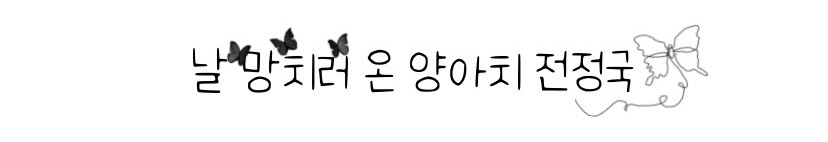
전정국은 내 울음이 그친 뒤에도 쭉 나를 안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등을 토닥이던 그의 손길에 전정국 나름의 서툰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미안, 너 옷 다 젖었다.“
“됐어, 이깟게 뭐 중요하다고.“
“전정국 오늘은 좀 멋있네.”
“오늘은? 내가 오늘만 멋있는 게 아닐 텐데…”
전정국의 능청스런 말에 툭 웃음이 터졌다. 아무래도 전정국 앞에서는 평소에는 꺼내지도 못하던 말들도 술술 나오고, 눈물도 웃음도 터지는 게, 내가 전정국을 정말 많이 의지하긴 하나 보다.
나는 활짝 웃으며 전정국을 바라봤고, 전정국은 입을 다물며 한참 생각하다 입 열기를 주저하는 듯 하더니 이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김여주. 그 사람들이 너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뿐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않겠어?“
“……”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정국이 전하는 말을 하나하나 새겨 들으며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심장에 피어나고 있을 때, 전정국이 하던 말을 잠시 멈추고 내게 가까이 훅 다가왔다. 그 다음, 내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마지막 한 마디를 속삭인다.

“확 엎어버려.“
아마 전정국은 몰랐을 거다. 본인이 속삭인 그 한 마디로 인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분명한 건, 나와 앞으로의 내 인생을 제대로 바꿔놨다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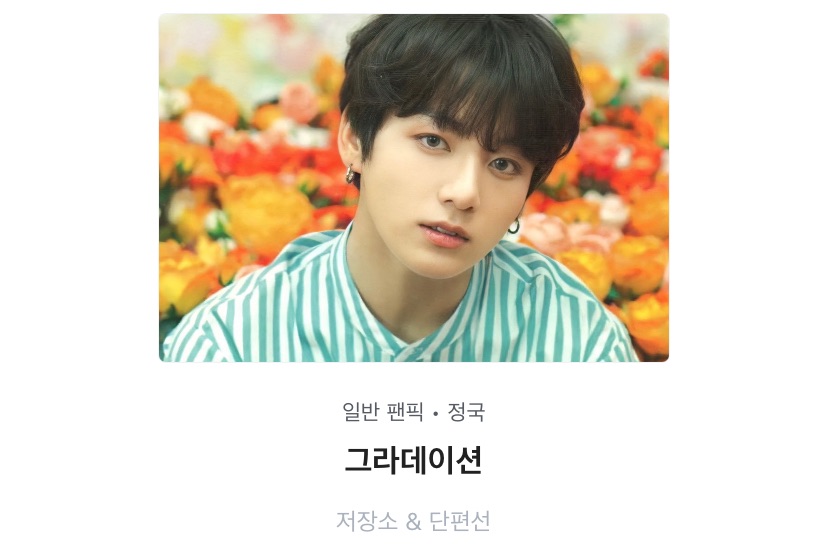

어제 쓴 따끈따끈한 단편 한 번 구경하러 와주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