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주 살리기 프로젝트 1.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엄마가 죽었다.

"뭐야 엄마, 오늘 일 안 나갔어?"
엄마는 끝까지 나만 생각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한 상 가득 차리고서는, 안방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엄마. 엄마? 엄마! 대답이 없네, 다시 일하러 간 건가."
내가 안방으로 들어서 엄마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편안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잠귀가 밝았다. 내가 조금만 뒤척여도 잠에서 깨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다.
그런 엄마가 내 말소리도 듣지 못하고 깊게 잠들었다는 생각에 다시 조용히 방에서 나가 허기진 배를 채우려 밥을 두 공기나 비우며 엄마가 만든 소불고기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트롤짓 작작해라, 야야 나 힐 좀."
그리고 나서는 바보같이 엄마가 아직까지도 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친구와 게임을 한 시간이나 했다. 엄마가 아직 자고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굳이 엄마를 깨우고 싶진 않았기에 엄마 생각이 나도 그저 그렇게 넘길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을 땐,
"엄마, 아직도 자?"
엄마가 아직 자고 있었다. 아까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 봤을 때와 전혀 달라진 점 없이, 조금이라도 뒤척인 흔적 없이. 곤히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 일어나 봐~ 이렇게 자면 이따가 잠 안 와."
물론 당연하게도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엄마! 내 말 안 들려? 무슨 잠을 이렇게 깊게 자~"
"······."
"엄마~"
"······."
"엄마! 엄마 내 말 안 들려? 엄마~!"
"······."
"··· 엄마. 엄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심장이 두근거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근거림은 쿵쿵거림으로 바뀌었고, 곧 숨이 가빠질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엄마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불러봐도 엄마는 전과 같은 온화하고도 편안한 표정으로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있을 뿐이었다. 요즈음 일이 바빠서 과로가 온 걸 거야. 잠시 쓰러진 걸 수도 있으니 어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왜, 왜······.
"엄, 마······."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쉴 새 없이 뚝뚝 흘러내리고, '엄마'라는 단어만 되뇌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닌데, 우리 엄마 그냥 쓰러진 걸 텐데. 예전에도 이런 일 있었잖아. 몇 시간 정도 쓰러져있다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안아줬잖아.

"왜.. 왜 숨을 안 쉬어··· 엄마 그러지 마··· 엄마···!"
119를 부를 용기가 없었다. 구급차가 오면 구급 대원들이 엄마의 생사를 확인할 거고,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며 하얀 천으로 얼굴을 덮을 순간을 절대 보기가 싫었다.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냥 쓰러진 거잖아, 곧 있으면 깨어날 거잖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볼을 쓰다듬었다. ··· 차가워. 얼음 같아.
"왜 나 혼자 두고 가!!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이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데!!!"
엄마가 죽도록 원망스러웠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방긋 웃으며 학교 잘 다녀오라면서 손을 흔들더니.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쉴 것이지 왜 항상 나밖에 모르고 나만 보면서 살아. 왜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죽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앞으로 속도 안 썩히고 말도 잘 들을게.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엄마 제발···."
그다음의 원망 대상은 바로 나였다. 엄마가 진즉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염치없이 밥을 먹고, 게임이나 했다. 엄마는 끝까지 혼자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는데, 아들이란 작자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엄마를 보내버렸다.
아까 먹은 소불고기를 토해내고 싶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차려준 밥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싹 다 먹어버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먹지 말고 보관해둘걸.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아무리 헤집었지만 애석하게도 구역질만 계속해 올라올 뿐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렇게 엄마는 죽었다.
고작 37살의 젊은 나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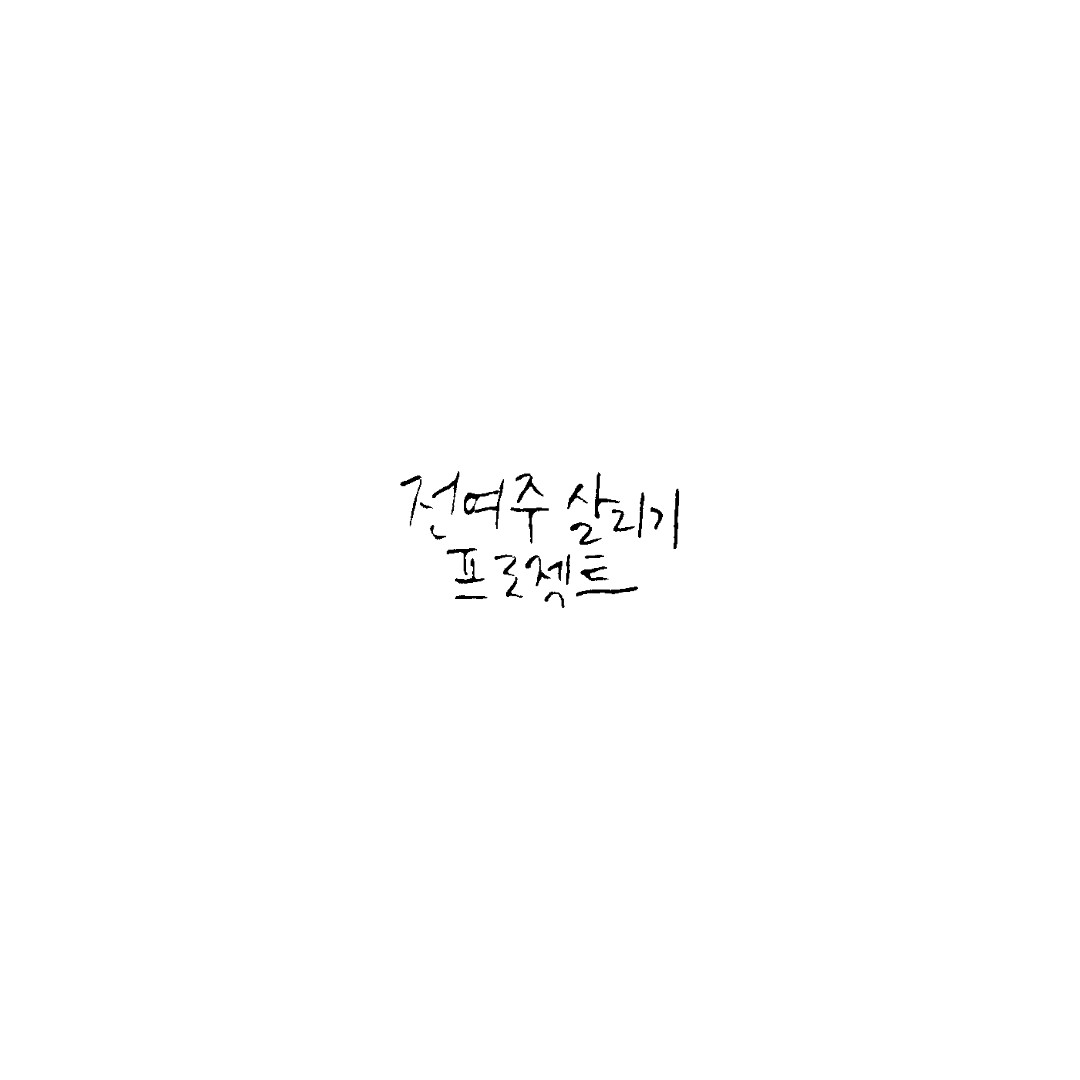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마땅히 가족이라고 할 사촌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방을 구할 때 가장 값이 싼 곳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했던 걱정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애꿎은 향초만 계속해 갈고 있던 때,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자 영정사진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가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예뻐, 우리 엄만.
"발인은 언제쯤으로 하실 건가요?"

"··· 내일, 가장 이른 시간으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떠나고, 나 말고는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방 안의 적막함이 계속되었다. 어떻게 엄마는 친구도 없어, 슬퍼할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또다시 투둑, 하고 떨어지는 눈물을 손으로 벅벅 닦아냈다.
"저기."
"······."
"저기요."
"······."
"저기요!"
잠깐 눈 좀 붙이자 하고 눈을 감고선 벽에 머리를 기대앉아있던 찰나 누군가 온 것 같았다. 화들짝 놀라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절을 했다.

"······."
그런데···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엄마랑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내 물음에 남자는 그저 입꼬리를 말아올려 웃을 뿐이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자, 남자가 손을 내밀어왔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 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살리고 싶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남자는 이상한 말을 해왔다. 내가 주춤하고 물러나도 아랑곳 않고서는 그 방긋 웃는 얼굴로, 큰 손을 내밀고, 소중한 사람을 살리고 싶냐 되물었다.
"이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무언가 몽롱한 기분이 들었다. 술에 취하면 이런 기분일까? 수면제를 먹은 듯한 느낌이 몸을 덮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남자가 다시 물었다.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몸이 말을 안 들었다.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져 생각이 없어지고,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남자의 물음에 답했다.
"······ 네."
털썩.
대답을 함과 동시에 남자의 손을 잡자,
눈이 위로 뒤집힘과 동시에 쓰러져버렸고,
남자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반가와용... 💓💓
팬플 접으려고 했는데 쓰다 만 글이 생각나서 올렸습니다
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