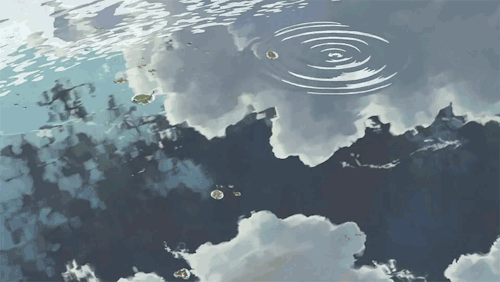“좋다. 이렇게 학교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까"
"...뭐, 그러게"
“어제부터 궁금했었는데, 손에 들고있는 그 수첩은 뭐야?”
“어?이거?아무 것도 아니야"
“에이,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나랑 대화 할 때 마다 항상 그거 보고 대화하잖아"
“별 거 아니라고"
"...왜 그렇게 정색해. 찔리는 게 없다면 정색 할 것도 없었잖아"
"...아, 미안"
“사귄지 하루 채 안됐지만 직설적으로 말할게. 네가 의심 된 건 한 두 번이 아니야. 뭐로 의심 되는 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심장을 바치고 있던 어떠한 받침이 그대로 무너진 기분이었다.
결국 이렇게 결말을 맞게 될 줄은 알았다.
근데 그 엔딩이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멍하니 서있는 내 손에 쥐어진 수첩을 정국은 뺏어갔다.

"...이거 뭐야?”
"...정국아"
“이거 뭐냐고 물었잖아"
“정국아, 그게"
“소름끼쳐. 징그러워"
아아, 벌써 끝이 나버렸구나.
그 짧은 시간동안의 내 노력은,
내 행복은,
내 기적은 모두 한낯 기체 따위에 불과했구나.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내가 말 좀 하면 안될까?”
“더이상 해명할 게 뭐 있어. 네 사정이 어떻든, 소름끼치고 무서워"
항상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로부터, 미래의 나로부터만 받던 그런 비수는 처음으로 상대방에게로부터 날아왔다.
"...그 짧은 시간동안 네가 미치게 좋았었어. 그런데 그 쌓인 정이 하루 아침에 다 떨어지네"
“…”
“어쩌면 내가 널 사랑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어"
거짓말.
거짓말이잖아.
"...정국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여주야, 난 이 말들로 네가 상처 받았으면 좋겠어"
“야"
“상처를 크게 받아서 그냥 나와 관련된 메모는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너 왜 그래"
“나 죄책감 들어. 매일 너를 힘들게 하는 기분이야"
그렇게 정국은 내 기억속에서 아득히 멀어졌다.
멀리,
더 멀리,
저 끝자락에서 더욱 멀리.
/
아침이 됐다.
여름은 겨울이 되었다.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젠 분명히2018년년7월5일이었다.
엄마는 내게 약을 건냈다.
형식적이었다.
무섭게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배갯잎은 왠지 모르겠지만 다 젖어있었다.
“약 먹고 분홍색 수첩을 확인하렴"
나지막히 내게 말한 엄마는 나갔다.
날짜는2020년년.
수첩에는 이틀의 공백이 있었다.
뭐였을까.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