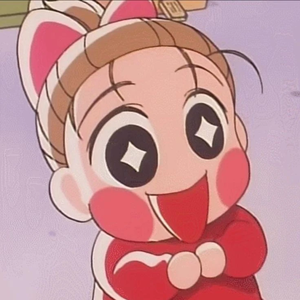W 르셸
정국이 골치 아픈 듯 이마를 짚었다.
아주 이상한 하루다. 애초에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 간만에 꾼 꿈이라는 것이 하필 악몽이었다.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씻고 나오는 찰나에 지난 밤의 악몽이 다시금 떠올랐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인적 드문 숲. 그 꿈 속에서 정국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돌고 또 돌고, 지쳐서 잠들었다 깨면 또 같은 숲 속에 버려져 있었다.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로 옷을 주워 들었다.
"하아···."
커튼이 벌어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빛을 보아하니 날씨가 꽤 무르익은 듯 보였다. 잠시 넋 놓고 그 광경을 보는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 선배님 저 민석입니다. 휴일에 연락 드려서 죄송합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
"- ···선배님?"

"어, 미안. 말 해."
"- 아, 예. 알아봐 달라고 하셨던 이여주 님이요. 그게-,"
"됐어. ···이제 그만 찾으라고 했잖아."
벌써 5년이다. 이 정도면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정국은 그렇게 생각했다. 부디 살아만 있어주면 좋을텐데.
"- ...죄송합니다. 사실 그러려고 했는데 뭘 좀 듣는 바람에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를."
"음. XX동 XX빌라에서 거주하다가 2주 전 쯤인가? 급하게 이사를 갔다더라구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그 쯤에 결혼···을 했던데요."
"···. 잠깐, 뭘 해?"
"- 결혼이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결혼이에요. 사귀던 흔적도, 소문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헛웃음이 나왔다. 결혼? 몇 년을 찾아 헤맸는데 처음 들려온 소식이 고작 결혼이라니. 허무했다. 허무한 걸 넘어서 이건···. 비참했다. 아아. 그랬나? 이여주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한 줄도 모르고 여태 그 자리를 지켰던 자신이 우스웠고 아팠다.
아니, 전정국. 정신차려.
살아만 있어주길. 그렇게 바랐잖아.
"-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민석아.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수고했어."
"- 네? 선배님 잠시만-"
이런 소식이라면 안 듣는 게 더, 내겐 좋았을텐데.
"이여주. 어쩌면...아주 어쩌면, 차라리 네가······."
죽어버린 편이 나았을지도 몰라.
목 끝까지 차오른 말을 끝내 삼켰다. 흐르는 눈물도, 애써 전하지 못한 많은 말들도 전부 담아 삼켰다.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을 그 이름.
이여주. 이여주, 이여주ㅡ.
이번 생에서는 이대로 보지말자. 부디.
집착
W. 르셸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하얗고 까마득하게 높은 천장은 정말이지 작은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게 너무 무서웠다.
이 방에 있는 거라곤 넓은 침대 하나와 물이 담긴 컵, 석진이 두고 간 꽃 몇 송이. 그게 전부였다.
여주의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심장은 멈췄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생리적 욕구도 별 볼 일 없었다. 죽을 수 없어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문득 문득 생각나는 형체가 있다. 제게 남은 모든 걸 지우고 비워냈지만 단 하나.
차마 지울 수 없었던 이름.
그래. 아마 10년 후에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반드시-, 그 아이를 위함이다.
가장 예쁘게 핀 꽃을 들었다. 천천히 쓰다듬다가 손 끝에 걸리는 꽃잎 하나를 뽑았다.

나를 찾는다.
찾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찾는다.
찾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찾는다.
···찾지 않을 것이다.
나를ㅡ,
"···. 찾지마, 정국아."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을테니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