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까지만 번듯하게 살아달라고, 제발.
그 뒤로는 안 건드릴 테니까.

개망나니 남주
개과천선 시키기 대작전
00
흐어엉. 크흥. 아, 그만 좀 울었으면. 안 그래도 책상 한편에 쌓여있는 무식하게 두꺼운 문제집 여러 권을 안 풀고 잠자리에 들어서 그런 지 괜히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만 같은데, 이제는 눈앞의 여자애가 문제집과 합세하여 내 머리를 터트리려 하는 것만 같았다. 두통약이 다 떨어졌는데 안 사러 간 내 탓이지. 그래. 머리야, 미안하다.

“ ··· ··· 저기, 그만 좀 울어주면 안 돼? ”
하도 들어서 환청까지 들릴 거 같거든. 시간이 지나면 어련히 알아서 울음을 그칠 거라는 내 생각은 말도 안 됐던 걸까. 엄마에게서 어렸을 적부터 귀에 딱지가 얹힐 정도로 들은 공부 하라는 소리보다 이제는 여자애의 울음소리가 훨씬 지겨워질 정도였다.
“ ··· 흑, 흐어엉. 크흥. ”
“ ··· 저기, 친구야. 내 말 안 들려? 저기요? ”
진짜 안 들려? 아니면 씹는 거야? 친구야? 내가 너무 조용히 말했나 싶어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말도 걸어보고 소리도 질러보았지만, 처음 그 상태 그대로 여자애는 도통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해 조심히 여자애에게로 다가가 그 애의 어깨를 두 어번 두드렸다. 그러자 여자애는 화들짝 놀라 몸을 휙 틀어 나를 바라보았다.
“ ··· ··· 히끅. ”

“ 그, 친구야. 놀랬으면 미안한데, 일단 그만 좀 울어줄래? ”
“ ··· 시, 신 님! 네. 그, 그만 울게요···! ”
신. 신? 설마 얘 나보고 신이라고 하는 건가? 에이, 아니겠지. 뭐. 신이라 칭해진 사람이 누군가, 설마 나인가 싶을 때 즈음, 눈가가 빨개진 여자애가 멍하니 나를 빤히 바라보다 속사포처럼 제 바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그러니까요. 신 님. 제가 신 님께 기도를 한 건 다름이 아니라, 그.

“ 연준이랑 관련된 건데요··· ···. ”
“ ··· 설마 최연준? ”
네네, 최연준이요. 신 님이 아시는 최연준.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여자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다. 그에 나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연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무언가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 최연준, 걔 남주 아니었나. 소설 가을의 봄날 남주.
“ ··· 딱히 내가 도울 건 없을 거 같은데? 최연준 착하잖아. ”
“ 그게, 갑자기 연준이가 변해버렸어요···. ”

“ 그, 사람은 원래 다 조금씩 변해. ”
“ 조금이 아니에요···! 연준이가···. ”
다시금 여자애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갔다. 여자애는 아까 전 내 말을 기억한다는 듯이 손등으로 눈가를 벅벅 비벼댔다. 괜히 미안하네. 내 말 때문에 그러는 건가. 눈물을 닦는 여자애의 얼굴을 빤히 보고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시선을 내리니 여자애가 입고 있는 검회색 교복 조끼에 눈길이 향했다. 조끼에 달려있는 개나리색 명찰에는 연가을이라고 석 자가 적혀있었다.
“ ··· 가을이었구나. 연가을. 잘 안 우는 앤데, 얘. ”
연가을. 소설 가을의 봄날 여주. 그제서야 여자애의 얼굴을 찬찬히 보니 주먹만 한 얼굴과 웨이브 진 긴 머리 , 그리고 동글동글 귀여운 이목구비. 정말 가을의 봄날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여자애, 아니 연가을이었다. 그럼 내가 신이 어찌 보면 맞는 건가. 내 손가락 끝에서 탄생한 세계 안의 애니까. 그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을의 봄날 줄거리를 되새기고 있을 즈음에 연가을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나왔다.
“ ··· ··· 개망나니가 됐어요. ”
“ ··· 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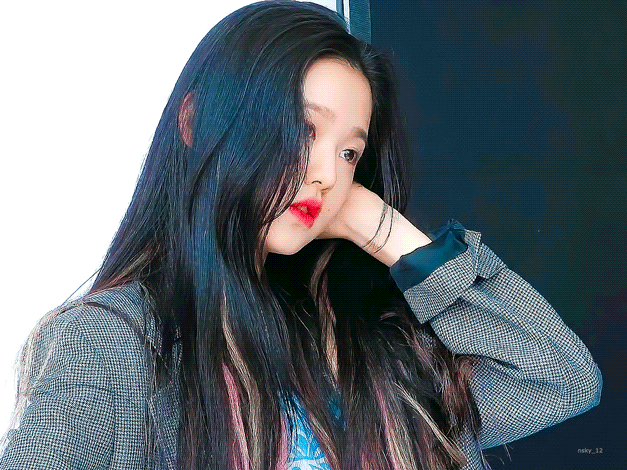
“ 연준이가, 개망나니가 돼버렸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