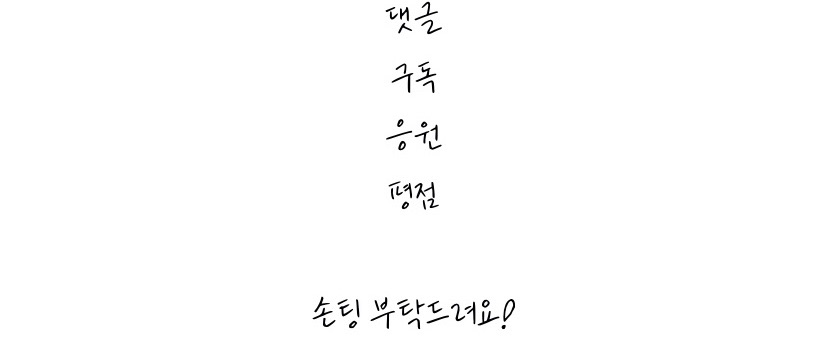우리의 이별 유예 기간은
불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 순간에 화르륵 타올랐다가 또 어느 순간 쉽게 꺼지는 그런 사랑을 말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런 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한 번에 달아올랐다 식을 수 있다는 건지… 솔직히 좀 어이없을 정도였다.
내 인생에 한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니, 등장하고 나서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와 그런 사랑을 하고 난 후에야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불 같아도 한 번 오고 간 마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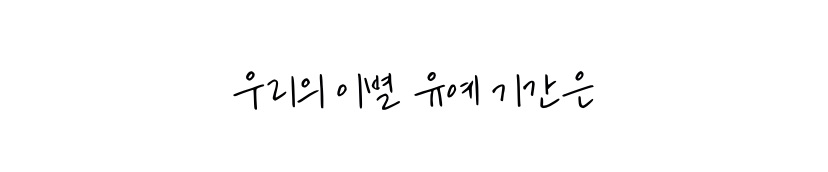
첫 만남은 단순했다.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 때만 밖을 돌아다니던 나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도 잘 알지 못했다. 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살았는데도 내게는 여전히 어려운 서울이었으니. 그날 역시 버스 정류장을 찾아 길을 헤매고 있었다.
“여기가 대체 어디야…“
그날따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길을 찾기 힘들었다. 아무리 길치여도 이 정도 헤맸으면 길을 찾았었는데… 뭐라도 있을 것처럼 같은 곳을 뱅뱅 돌기만 했다.
결국 스스로 길을 찾는 건 포기했다. 근처 골목 벽에 등을 기대어 쭈그려 앉은 뒤,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내가 점점 지쳐가던 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였다.

“저… 무슨 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 사는 듯 회색 후드티에 추리닝 바지, 슬리퍼를 찍찍 끌던 첫 만남이었다.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들어올렸고,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게 손을 뻗었다.
“일어나요, 옷 지저분해질라.“
“…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 보는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아 그의 힘을 빌려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를 일으켜 준 그의 손은 무척 따뜻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을 주어 그의 손을 꽉 잡았고, 그 남자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 제 손 좀……“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그도 나도 서로 놀라며 잡고 있던 손을 놨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손을 놓는데 이렇게 아쉬운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놀라운 일이었고 말이다.
나는 얼굴을 붉혔고, 그는 부끄러워하며 뒷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런 간지러운 분위기도 잠시, 내 폰에서 약속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알람이 울리며 깨졌다. 나는 다급하게 알람을 끔과 동시에 그에게 길을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어요?“
“저쪽으로 쭉 가면 있는데, 같이 가요!“
“같이 가달라고 하기엔 너무 죄송해서…”
“에이, 바로 앞인데요, 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음에도 나는 그 남자와 함께 가길 택했다. 여기서 가깝다는 버스 정류장 하나 찾기 위해서 한참을 돌았는데,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기에. 그 남자는 예쁜 눈웃음을 보이며 앞장 섰고, 나는 그를 따랐다.
“근처 사세요?”
“네, 저쪽 주택 단지에 살아요. 그쪽은요?“
“저는 00 아파트 살아요!“
“되게 가깝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는 도중, 우리는 서로가 가까운 곳에 사는 걸 알게 됐고, 함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안녕!“
”잠깐… 그…… 혹시 번호 줄 수 있어요…?“
그의 귀가 새빨갛게 물든 걸 본 이상 번호를 안 줄 수 없었다. 뭐, 사실 나도 조금은 그가 마음에 들었던 걸지도. 긴장이라도 되는 듯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번호를 묻는 그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나를 향해 핸드폰을 내민 그의 손이 무안하지 않게 폰을 받아들고선 피식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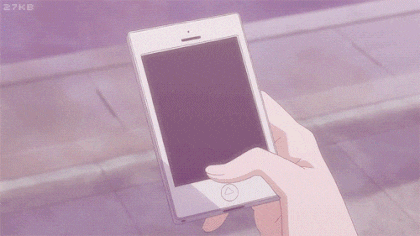
“번호 드렸으니까 꼭 연락해야 돼요?“
“… 할게요, 꼭.”
“아, 맞다. 이름은 뭐예요? 번호도 교환했는데 정작 이름은 모르네.“
“박지민.”
“저는 김여주! 연락해요, 지민 씨!“
그의 이름은 박지민. 순간 타오르는 사랑을 믿지 않던 나를 그렇게 믿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에게 번호를 주고 난 뒤, 버스에 올라탄 나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 서있는 박지민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다.
많은 자리 중, 일부러 박지민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어떤 마음이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괜스레 온몸이 간지러웠다. 박지민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나 또한 그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민… 박지민…… 으, 간질거려.”

“또 만나면 좋겠다… 여주 씨.“
어쩌면 우리는 그날 알았을 지도 모른다. 서로를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나는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박지민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우리의 입에는 서로의 이름이 맴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