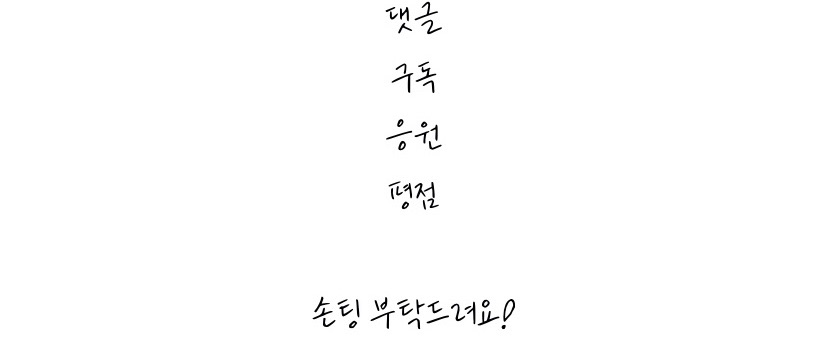우리의 이별 유예 기간은
무척이나 간질거렸던 첫 만남을 시작으로 박지민과 나는 자주 부딪혔다. 정말 이상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스친 적 없던 우리가 그날 이후, 집 근처 골목, 마트, 공원, 카페 등 갖가지 장소에서 박지민을 마주쳤다. 서로의 새끼 손가락에 새빨간 실이 묶인 것 마냥.
“이 정도면… 운명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가?“
나는 평소 운명이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았다. 살기도 각박한 세상에 운명 따위를 믿고, 그 운명을 기다리기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박지민을 몇 번씩이나 마주치고 난 뒤에는 말이다.
박지민은 내게 그런 존재로 다가왔다.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나는 그가 내 운명이었으면 싶었다.

“지민 씨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긴 부끄러운 얼굴로 베개를 꼭 끌어안았다. 수줍은 듯 꼭 다문 입과, 베베 꼬이는 몸, 그리고 붉어진 두 뺨까지.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내 모습이 어색했지만 싫진 않았다. 왠지 그 역시 나와 같은 상황일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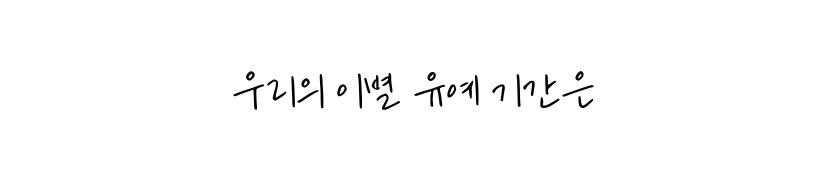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박지민과 나는 점점 가까워졌다. 만나는 횟수도, 연락이 오가는 횟수도 늘어났지만 관계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그저 서로의 나이를 알고,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말을 편하게 하는 정도. 딱 그 정도였다.
애매한 관계가 지속된지 한 달쯤, 성격 급한 내가 박지민을 떠보기로 했다. 눈치가 없지 않던 나였기에 박지민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이는 시점이었고, 박지민은 분명 나와 같은 상태였다. 좋아 죽겠는데 막상 고백하긴 무서운.
”지민아, 나 고민 있어.“
”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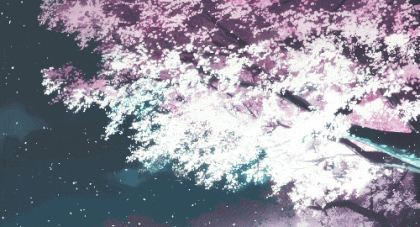
봄의 마지막, 하늘에서 벚꽃이 쏟아졌고, 벚꽃잎보다 더한 핑크빛을 띠는 우리가 있었다. 우수수 떨어지는 벚꽃 사이를 걷던 내 발걸음이 멈췄고, 발을 멈춘 나를 뒤로 한 채 앞서가던 박지민의 발걸음 역시 멈췄다.
“…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조금씩 새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넘기며, 박지민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 이런 걸 보면 나는 사실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내 말에 먼저 가던 몸이 우뚝 서버린 박지민이었고, 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답했다.
“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
”……“
”일단 되게 귀여운데, 멋있어. 그리고 잘생겼어!“
“… 그렇구나.”
“나보다 어린데 성숙하고, 엄청 다정하고, 또… 더 말해줄까?“
이 정도면 거의 다 알려준 셈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박지민 너라고. 하지만 눈치가 쥐뿔도 없는 박지민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여전히 나를 등지고 있는 걸 보니.
“아니, 하지 마.“
본인에 대한 설명인 줄도 모르고, 더이상 본인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홱 몸을 돌린 박지민이다. 표정은 잔뜩 굳은 것도 모자라 금방이라도 눈물을 톡 떨어뜨릴 것 같았다.
당황스러웠다. 우리 사이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고, 잠깐 놀리려던 것 뿐이었다. 절대 박지민을 울릴 마음은 없었는데… 박지민은 긴 다리로 성큼 내게 다가왔다. 내 앞에 선 박지민은 새빨개진 눈가를 한 번 보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곤 내 옷깃을 살짝 잡아당겼다.
“나도 좀 봐줘요, 누나.“
“어…?“
”아마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좋아할 걸.“
박지민은 모를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아낸 나를. 혹시나 내가 본인을 두고 가버릴까 내 옷소매를 붙잡은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하지 말라고……“
귀여운 투정으로만 들렸다. 옷깃을 꾹 잡은 손이며, 푹 숙인 고개며, 조금씩 떨리는 목소리며. 그 사람이 아닌 본인을 좋아해 달라는 박지민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저 귀여울 뿐이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웃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참지 못한 채 웃음을 터뜨린 나였다.
“풉… 푸흡…!”
내가 웃음을 터뜨리자 박지민은 푹 숙였던 고개를 들어올렸고, 내가 웃는 걸 보자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진심을 얘기했던 본인의 말을 장난으로 넘기는 거라고 생각했겠지.
입술은 튀어나왔지만 여전히 내 옷 소매는 놓지 않는 박지민에 한껏 웃어보인 뒤, 웃으라 맺힌 눈물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 다음, 소매를 잡고 있던 박지민의 손을 잡아 두 눈을 맞췄다.
“박지민, 너 되게 귀여운 거 알지?”
“안 귀여워요.“
”네가 날 매번 웃게 만드는 건?“
”어?“
”너잖아, 바보야.”
마주보고 있던 박지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나는 또 한 번 그를 보고 피식 웃었고, 박지민의 눈가가 점점 붉어지는 듯 싶었다. 나는 그런 박지민의 얼굴에 내 양손을 갖다 대었고, 박지민은 내 손 위에 본인의 손을 얹어 그대로 꼭 잡았다.
“좋아해. 나랑 사귀자, 지민아.“
활짝 웃으며 전한 내 고백에 그대로 나를 품에 안아버린 박지민이다. 박지민은 한동안 자신의 품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았고, 약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마저 좋아 입꼬리를 늘였다.
봄날의 마지막 벚꽃잎이 휘날리던 날, 우리는 금세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 사랑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