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이 지났다. 고작 한 달 안에 많은 업적을 쌓은 세아에 아주 큰 호평이 쏟아져 내렸다.
물론 아직까지도 불만을 가지는 귀족들이 있었다. 단지 세아가 여성이라서. 마녀라서 반대를 끝까지 했지.
하지만 세아는 반대하는 귀족들이 아니어도 가주가 될 생각은 없었다. 세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원하는 것이 가주는 아니었으니까.

"정말 단지 네가 가주 자리를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오라버니."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이 자리는 오라버니 거라는 걸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난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걸 너도 알 텐데."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그건...!"
가주의 자리. 누가 이 자리를 욕심내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도 자격이 주어진 자가 아니면 주제를 넘볼 자리가 아니다.
높고도 무거운 자리. 이 자리에 아무나 앉았다가는 제국은 평화로운 나날들을 지내지 못했을 거다. 어쩌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여졌을지도 모르지.
귀족 모두가 현명한 것이 아니지만, 단 한 명이라도 더 현명한 자가 높은 지위에 서있어야 제국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세아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더욱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 이 자리에 앉는 게 싫은 건 아니겠지만, 감당을 할 자신은 없는 것이다.
애초에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세아는 굳이 자신의 오라버니의 자리까지 빼앗고 싶지는 않았다.
"전 오라버니를 믿어요. 오라버니가 가문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괜히 내가 억지로 시키려는 거 같구나."
"아니에요... 그저···"
"너의 뜻은 알겠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맞는 거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하도록 해."
"응ㅎ"
"갑자기 막 혼인할 남자가 있다고 데려오지만 않으면 이 오라비는 다 너의 뜻에 따를 거야."
"무슨ㅋㅋㅋㅋ"
남준은 세아의 투박하고도 가녀린 손을 잡고서는 말했다. 너만큼은 지켜줄 테니까 또 어딘가로 사라지지 말라고. 아프지도 말고 그냥 곁에만 잘 있어 달라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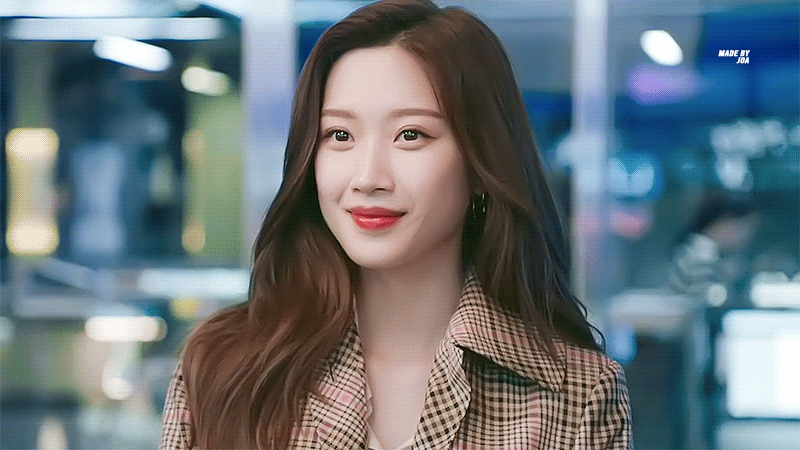
"당연하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이제 이들의 앞에는 불행이 아닌 행복이 있어야 될 텐데···

하루하루가 바쁘다. 남준 오라버니는 정식으로 카르나 가문의 가주가 되었고, 태형 오라버니는 황궁에서 잘 나오지 않아 자주 볼 수는 없었다.
전쟁 이후로 기사 단장이 되었고, 그 때문에 황궁에서 나오는 건 워낙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오라버니는 저를 보겠다며 몰래 빠져 나오곤 했다. 문제는 곧장 붙잡혀 끌려 가곤 했지만...ㅋㅋ
"아가씨?"
"아, 유모 왔구나?"
"어디 나가십니까?"
유모는 이른 아침부터 채비를 하고 있는 세아에 당황했다. 이제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을 터인데...
"응, 가 볼 곳이 있어."
"설마 혼자 나가시겠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당연히 혼자 나가지."
"어유, 아가씨!!"
"혼자 조용히 다녀오고 싶어. 그리고 기사들 데리고 나가 봤자, 내가 기사들 지키는 거 밖에 더 돼?"
맞는 말이다. 제국에서는 그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세아를 헤치겠는가.
"휴... 조심해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들어오시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알겠어, 알겠어. 나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제 눈엔 평생 아기씨인 거 잊지 마셔요!"
세아는 재밌다 듯이 큭큭 웃어 보였다.
"나 다녀올게, 유모."
.
.
.
.
저벅저벅
마력으로 순식간에 장소를 이동했다. 이른 시간이다 보니 약간 쌀쌀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서는 아침의 산뜻하면서도 차가운 냄새를 맡으며 걸었다.
주위에서 기저귀는 새소리는 아름다웠다. 평온하기만 이곳.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왔어요."
세아는 꽃다발을 내려 놓았다. 아버지, 정국이, 호석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너무 늦었죠? 제가 너무 바빴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당연한 거지만, 마음은 아리듯이 아파왔다. 세상은 잔혹한 걸 알면서도, 이곳이 아무리 환상 같은 책 속이라는 이유로 망상을 했다.
설마 이들이 죽기라도 하겠어?
참 한심한 착각이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인간인데. 난 왜 누구에게나 있는 죽음을 잊고 살았을까. 나에 대한 죽음은 늘 기다려 왔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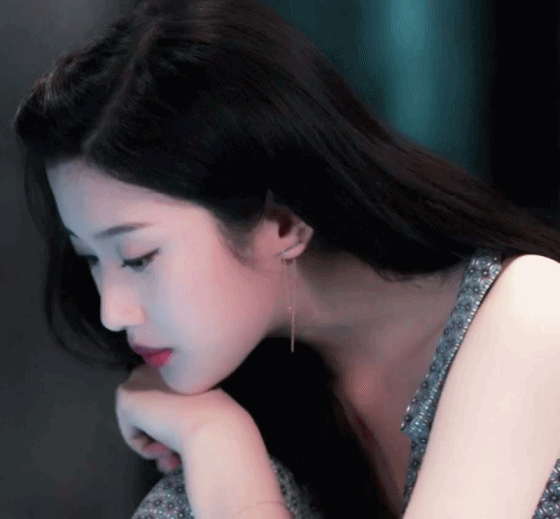
"보고 싶어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내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딱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작별 인사도 못했잖아..."
울고 싶지 않아서 애써 흐르려는 눈물을 꾹 참았다.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 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기로 했으면서...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다.
이 애석한 아이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별이라는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을까.
"찾았다."
움찔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걸까. 또 자객일 수도 있으니 자세를 잡는 세아는 표정이 굳어졌다.
"나야, 우리의 마녀야."
"...!"
갑자기 나타난 존재. 그 존재는 세아와 같은 존재였다. 꿈에서 만난 마녀!
"넌..."
"때가 됐어."
"무슨 소리야...?"
"구원을 내려줘. 대마녀."
____
시험 좀 누가 없애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