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것은 허구이며 어떠한 것과도 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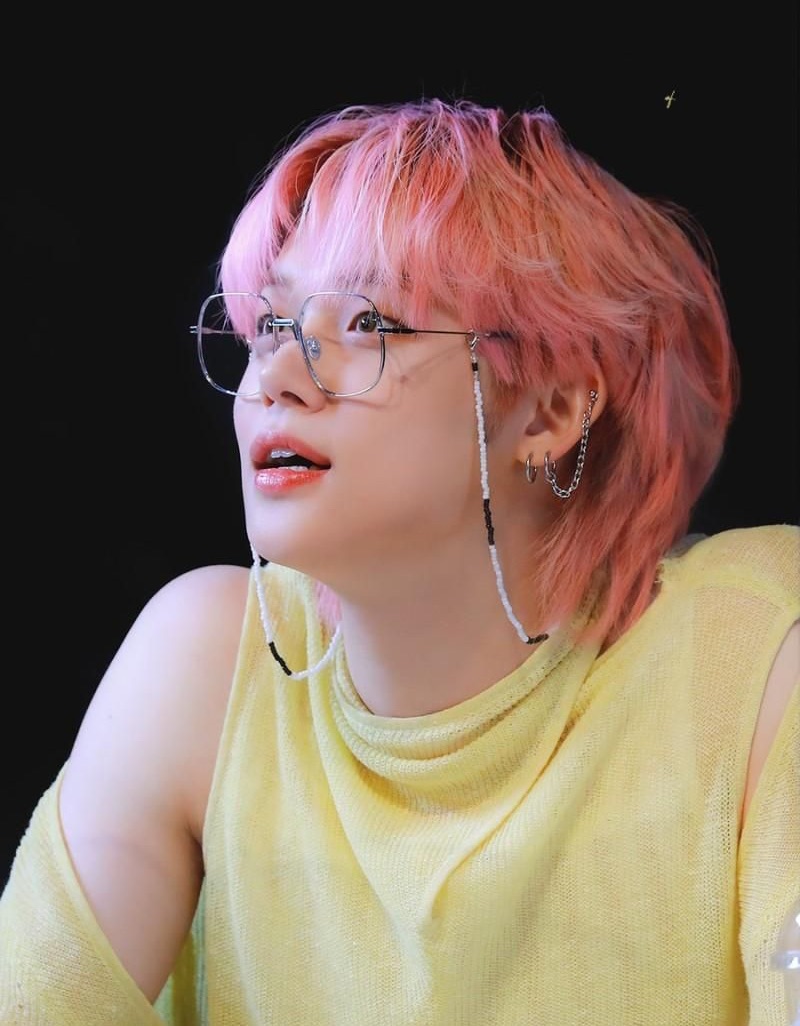
“음.. 여주야“
“응?”
“내가 널 우주라고 불러도 될까…?”
”ㅁ..뭐…..?“
”음.. 우선 네 이름에서 여를 빼면 우주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우주같은 존재였거든“
”음…. 좀 갑작스러운 것 같고 당황스럽긴한데.. 네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냥 평소에는 여주라고 부르고 가끔 우주라고 부를게“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부르고 싶어졌는데?“
”음 뭔가 특이한 걸 하고 싶었거든“
”갑자기?“
”응 그래야 너가 날 잘 기억하지“
”이런거 안해도 잘 기억할 것 같긴한데“
”그냥 내가.. 아니야 그냥 그저 그냥..“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그런거라니까“
“음.. 우선 알겠어”
그렇게 이 일은 서서히 잊혀갈 때쯤 초록빛으로 물든 여름이 다가왔다.
“여주야, 여름이다”
“그러네”
“우리 초록 나무 보러가자”
“음.. 귀찮은데..”
“..우리 같이 보러가기로 했잖아…..🥺”
“휴.. 그래그래, 가자“
”오~ 좋아!!!“
“와.. 진짜 상쾌하다”
“그치? 나오길 잘했지??”
“응, 그러네”
“이제 우리 여름 초록 나무도 봤으니까 다음엔 가을 단풍 보자! 어때???”
”오 여주 네가 왠일이래?!“
”이제 알았어 자연을 본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라는 걸”
“다행이다”
“여주야 우리 여행도 가자”
“오 좋은데? 바다 가고 싶어”
“그래!!!”
어느날, 연준은 어딘가를 다녀와 여주에게 찾아왔다.
“여주야”
“응?”
“이거봐”
연준의 손에는 은하수와 같은 동그란 유리의 물체 2개가 들려있었다.
“우리 우주♡”
“오~“
그 둘은 그 작은 우주를 각자의 방법으로 소중하게 보관했다. 마치 서로를 대하듯이.
여름이 된 후 연준과 한 뼘 더 가까워질 때쯤. 여주가 연준의 우주라는 부름에 익숙해질 때쯤.
여주와 연준은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와… 너무 기분 좋다”
“우주야”
“왱”
“행복해?”
“응”
“얼마나?”
“너랑 구경할 단풍을 볼 때가 기대될만큼?”
“오오오~”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았다.
어느새 연준은 자연스레 여주의 손을 잡았다.
여주는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 둘은 숙소로 들어갔다.
“연준아”
“응?”
“내가..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말해, 기다려줄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같아“
"..“
”내가 평생 살면서.. 사랑을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인지라 잘 모르겠지만, 이거 사랑인 것 같아“
”….“
”너는 나를 살아가게 했고 살면서 몰랐던 여러가지를 느끼게 해줬어“
”…“
“너랑 함께하고 싶어”
“… ….”
”이런 나라도 좋다면 우리 한 번 만나볼래..?“
여주의 말을 끊지 않고 늘어지더라도 집중해 들어주던 연준은 이내 입을 떼어 여주에게 말했다.
“..음.. 여주야..”
“응?”
“대답은 내일 해도 될까..?”
“..응….. 좋은 쪽이었으면 좋겠다..”
여주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다.
내일이면 연준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렘도 안고 있었다.
그날밤, 연준은 여주를 위해 손에 펜과 종이를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