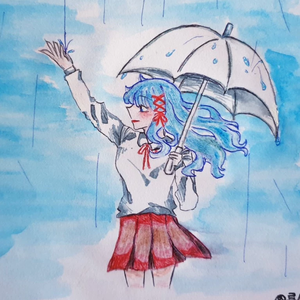“여주 말 들을거면 우리한테 대체 왜 물어본거야”
승관이 오빠의 말 내용과는 달리 그의 억양은 매우 평온했다. 아무런 불만이 없는 듯, 오히려 만족하는 듯 웃어보였다.
“예의상 물어본거야”
지훈이 오빠가 딱딱하게 대답한다. 옆에서 순영이 오빠가 툴툴댄다.
“그럴 거면 물어보지나 말던가…”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건 서민의 음식이었다. 바로 ‘칼국수’. 하지만 내가 이 곳에 오기 전에 나는 서민도 아니었기에 내겐 특별한 음식이었다. 젓가락을 괜히 만지작거린다. 예나 언니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원래 이런 거 좋아했어?”
민규 오빠가 내게 묻는다. 오늘 컨셉을 뭐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의 성격과 아예 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독 잘 어울렸으니까.
“애들끼리 엄청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
아, 물론 고아원 애들끼리.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거야”
“그랬구나. 맛있었어?”
“응, 엄청 맛있었어. 예나 언니라고 있었는데,
그 언니 고등학교 졸업식 날 돈 모아서 왔었어.”
지금 존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런 일에는 욕을 쓰고 싶지 않았다.
“맛있는 가게였나봐.”
한솔이 오빠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하나로 높게 묶은 검은색 머리가 내 목을 살짝씩 친다. 그날도 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는데…”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NO였다. 하지만 그래서 힘드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역시 NO였다. 완전히 괜찮아진 일이었다. 얼굴과 이름밖에 모르는 그 언니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딱히 친했던 언니는 아니었다.
하지만 멤버들이 날 걱정할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건 그저 내가 극복한 조금 불운한 과거일 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했다.
“응, 계속 말해도 돼.”
정한이 오빠였다. 나를 그 지옥에서 꺼내준 사람, 나를 끝없이 생각해주는 어떤 형용사로도 형용할 수 없는 착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 내 친구들은 몰랐는데…
고등학교 졸업은 성인이라는 의미였고,
더이상 언니를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울었어.
그냥… 펑펑 울었어.”
“속상했겠다… 그 누나랑 많이 친했어?”
찬이가 물었다. 친구지만 친구 이전에 내 사람이었고, 그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친구의 관점에서 걱정해주었다
“아니, 딱히 친하진 않았지만… 좋아는 했지.
유일한 고등학생 언니였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유일했는지 알겠지만”
집단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그녀는 버텼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낼 수 있었을까. 아마 평생 대답하지 못할 대답이었다. 나로선 불가능한 일이니까.
“어딜 갔길래 그렇게 맛있었어?”
역시 정한이 오빠다.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멤버들이 날 걱정하는 게 싫다는 것을 눈치챘다. 난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동정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디 갔는데?”
이어서 슈아 오빠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더 돌린다. 난 고마움의 의미로 웃어보이곤 말한다.
“여기.”
“오, 그럼 여기 엄청 맛있겠네.”
찬이가 침을 삼켰다. 연예인이라 이런 거 안 먹을 줄 알았는데 편견일 뿐이었다. 멤버들 중 찬이는 진짜 특히 더 좋아했다.
“응, 그래서 여기 오자고 한 거야.
길이 복잡한대도 불구하고…”
“기대해도 되겠다. 장여주가 맛있다고 한 집이면…”
“음… 얜 그냥 다 맛있다고 하던데?”
승관이 오빠와 한솔이 오빠의 말이다. 나는 쿡쿡 웃었다. 내 입맛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날 데리고 간 곳은 맛있기로 소문난 맛집이었으니 다 맛있을 수밖에.
주문한 14그릇의 칼국수가 나오고 우리들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가 맛있어보였다. 나는 이미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눈물 젖은 칼국수가 아니라 너무 반가워요. 조금 더 나다워진 이 순간이 음식과 관계없이 행복하네요.
“응, 여주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알았지? 안 뺏어먹으니까 천천히 먹어요”
“네~!”
오늘의 계산자인 승철이 오빠가 말한다. 난 그저 그에게 고마울 뿐이었다.
“형 나는~”
지훈이 오빠가 장난치며 묻는다. 승철이 오빠는 단호하다.
“안 돼.”
“그래”
“ㅇ,왜 이렇게 쿨해. 원하면 사주려고 했는데.”
“내 돈으로 사먹으면 되지.
아마 형보다 내가 더 돈 많을걸”
속으로 인정하면서 칼국수를 흡입하는 민규 오빠에게 말을 걸었다.
“민규, 맛이 어때?”
속으로는 오빠라고 지칭하는데 말은 오빠라는 말이 쉽게 나가지 않았다.
“아주 반말이 익숙하구만? 내가 오빤데”
“세븐틴도 그러는 분위기더만. 신경 쓰여?”
“응, 신경 쓰여.
내가 다른 애들한테도 형 호칭 생략당하는데
너라도 불러주면 안 돼?”
“오빠…는 오빠라기보단 친구 느낌이 강해서.
속으로 생각할 때는 오빠라고 하긴 하는데…”
그를 생각하면 든든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라, 오빠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현실은 친구의 느낌이 강했고, 덕분에 민규 오빠라는 호칭보다 민규라는 호칭이 더 좋았다. 민규 오빠가 오빠인 것도 좋지만, 친구인 것도 좋았다.
“연하, 동갑, 연상 중에 뭐가 제일 좋아?”
갑자기 훅 들어온 이상형 질문. 몇 달 전만 해도 고아였고 미래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런 나에게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는 사람까지 생겼다. 그리고 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상형을 물어보는 사람들 덕에.
“연하 빼곤… 약간 누나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끝에 살짝 웃는다. 멤버들 중에 연하가 없어서 누나라는 소리를 안 들어서 좋았다. 내가 누나라는 호칭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렸을 적 이야기로 올라간다. 내 밑으론 다 남동생이었고, 따라서 내가 돌봐야했던 사람들이 날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결정적으로 나는 아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왜인지는 알 수 없다. 아기들 때문에 내 삶이 사라져서일거라고 예상만 할 뿐.
“츤데레는 어떤데?”
원우 오빠가 물었다. 본인이 츤데레라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
“다정한 사람이 좋긴 해. 표현 잘 해주는 사람이 좋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싫어…한다는 말인가”
원우 오빠는 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 걱정은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오는 걱정인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말을 끝맺을 지 몰라 그냥 말끝을 흐리는데 슈아 오빠가 도와주었다.
“저번에 교복 사러 가던 날, 녹음도 했잖아”
“응, 그 때 노래 잘 부른다는 것도 알았지.”
원우 오빠가 대답한다. 이어 지훈이 오빠가 대화를 이어간다.
“그 때 내가 여주 편 좀 들어줬는데, 설렌다더라”
아무렇지 않게 설렌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지훈이 오빠가 나와 달라보였다. 나는 설렌다는 표현을 진짜 설렐 때만 쓰는 거였는데.
“음… 그랬지. 그랬는데, 내 이상형 얘기 왜 하는 거야?”
민규 오빠가 날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왜인지 그의 마음의 목소리가 들렸다. 눈치 더럽게 없다고. 물론 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냥 눈치로 알아챈 거지.
“그냥 하는 말 아닐까?
너도 대학 가고 그러면 남친도 사귈 거 아니야?”
“글쎄… 내가 남친 사귈 수 있을까?”
말 끝에 오빠들 때문에,를 삼켰다. 가족이 없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그 전에 남친을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 친오빠 같았고, 내 부모님 같았다. 따라서 반대할 사람이 13명이나 되었다.
사랑 받는다는 생각에 행복하긴 했지만 준휘 오빠의 말에 걱정되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남친 사귈 수 있을까. 그 남친은 괜찮을까.
“100% 사귈 거 같은데?”
왜 승관이 오빠가 저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예쁘다거나, 매력적이라거나 하는 거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래?”
“어, 나도 사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전에 오빠들이 내 남친을 허용해줘야할 거 같은데”
한솔이 오빠의 말에 반박했다. 그러자 승철이 오빠는 푸하하 웃었다.
“네 남친이 괜찮은 새끼면 받아주지.”
나는 남은 칼국수를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어떤 사람이든 싫어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