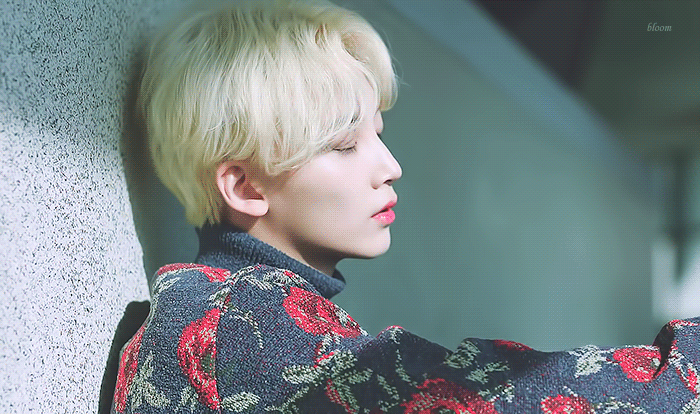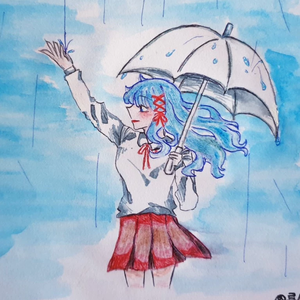하지만 여전히 석우 오빠의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석우 오빠가 하는 말은 이성적인 감정이 아닐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있다는 대답, 좋아한다는 고백에 좋아해주겠다는 달달한 말. 결국 심란한 마음에 그에게 물었다.
“오빠 여자친구 있어?”
“아니? 일한다고 여친 사귈 시간이 없네요.
담당 가수님이 너무 워커홀릭이시라~”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좋아하는 사람은 있다며?”
“아, 그거. 그런 부탁 받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

“그 말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될까?”
“…아직은?”

하지만 그라면 아주 티끌만큼의 가능성이래도 여지를 남겨줬으면 했다.
그런 와중 아직이라는 말 앞의 침묵이라니.
사랑에 빠진 소녀에게 그 작은 침묵은 참 많은 여지를 남기고도 남았다.
“오빠 이상형은 뭐야?
연하가 좋아, 친구가 좋아, 연상이 좋아?”
아직 어려 여자로 보지 않더라도 나이가 조금만 더 들어 그를 설레게 해주고 싶어서.
“음, 연하가 좋긴 하던데.
근데 그건 갑자기 왜?”

“귀여운 게 좋아, 예쁜 게 좋아, 섹시한 게 좋아?”
“저,마음아…?”

“미안. 근데 대답 잘 해주더라?”
“네가 궁금해하니까. 못 말해줄 것도 아니고.”
“진짜 다정해, 엄청 착하고…”
“나 그렇게 다정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그래주잖아”
그런데 왜일까. 그의 미소에 가식을 느끼고, 괴리감이 검은 물감이 물에 퍼지듯 빠르게 퍼져나가는 이유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너무 직감을 믿는 건가’
이성으로 직감을 잠재우고 싶었다. 그래서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잔뜩 달아오른 감정과 직감을 식혔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원래 하던 일련의 행위를 생략한 채 샤워 부스로 들어갔다.
‘…직감이 틀린 적은 없었어.
하지만 이번이 틀린 최초의 경우가 될 수 있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
사실 지금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고민보다 더 심각한 고민 하나가 더 있었다.
‘너 피부 엄청 상했어.
이대로면 너 카메라에 안 좋게 나와.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우선 좀 자라고.’
카메라에 안 좋게 나오는 걸 제외해도 이러다간 쓰러질지도 몰랐다. 무리해서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심각한 수준인 건지 PD님께 문자는 몇 번이나 왔다. 제발 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줄이자고. 스텝들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는 걱정이 묻어나는 협박성 문자도 왔었다.
세븐틴 오빠들은 일 얘기는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 다른 말은 없는데,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건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자제해야할까.”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아 미안해! 너 있는 줄 몰랐어!”

아예 알몸을 본 것도 아니고 샤워부스 안에 있어서 살구색만 희미하게 보였을 텐데 귀까지 터질 듯 붉어진 그의 모습에 계속 웃음이 새어나왔다.
당황했을 정한이 오빠를 생각해 급히 샤워를 마무리하고 옷까지 전부 갖춰 입은 후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카톡!’
누구에서 온 건지 카톡 알림 소리가 울렸고,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석우 오빠였다.
‘잘 들어갔어?
오늘 촬영 일찍 끝났으니까 오늘은 쉬어.
내일은 내가 일부러 촬영 빼놨으니까 내일도 쉬고.
연습할 생각하면 쳐들어간다!!!’

느낌표를 세 개나 붙인 석우 오빠의 톡에서 나를 향한 그의 애정이 느껴졌다. 연습도 생각 말고 우선 몸부터 쉬라고. 피식 웃으며 그에게 답장을 남겼다.
‘너무 고마워 오빠. 오빠도 들어가서 좀 쉬어.’
답장을 남기고 혹시 석우 오빠에게 톡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갔다.

“ㅁ, 마음아 미안!”

“불의의 사고였어. 사과할 필요 없어. 아예 알ㅁ…”
“말 하지 마! 말 잇지 마!”
“…그걸 본 건 아니잖아”
“됐고, 너 오늘 빨리 들어왔네.
촬영 일찍 끝났어?”

“응. 연기가 점점 늘고 있어.
그리고 내일은 없대.
석우 오빠가 나 쉬라고 스케줄 비워놨댕~”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렇게 행복해하는지의 여부조차 모르는데, 그녀는 꼭 썸남이나 짝남 얘기를 하는 듯 행복해보였으니까.
그래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겨우 입꼬리로 올리며 웃었다.
“되게 행복해보인다, 그 사람 얘기할 때.
너도 알아?”

“아, 그래…?”
“그 사람 좋아해?”
우리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행복하길. 특히 내 이야기를 하며 환히 웃길.
“…응, 잘생겼잖아”
잘생긴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보다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과연 그녀의 기준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일까, 그는.
“성격은 어떤데? 잘 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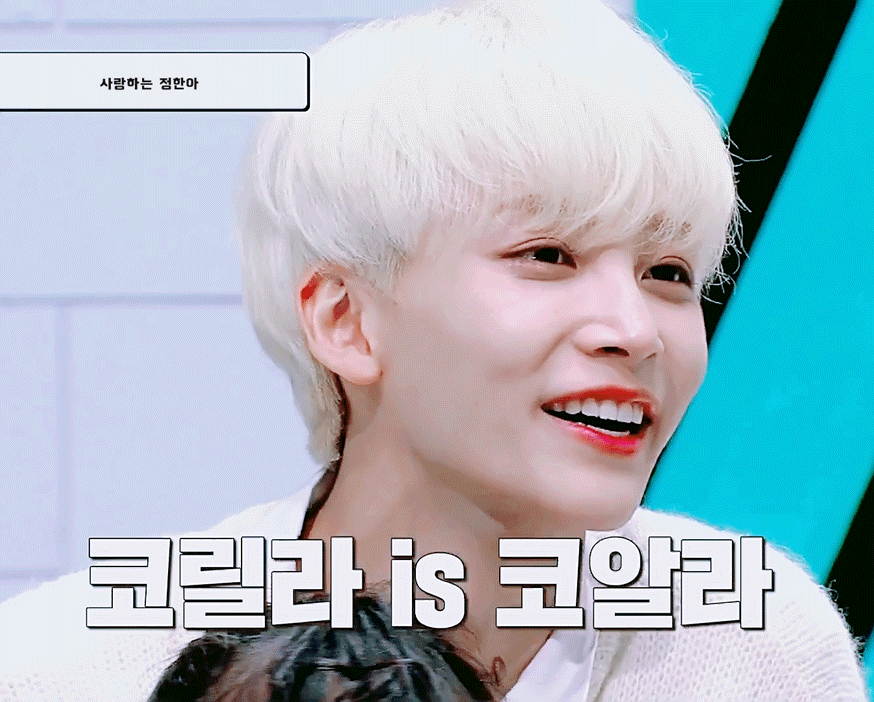
“응. 다정한 말도 해주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예를 물어봐도 될까…?”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랐다. 티끌만큼 남아있던 가능성조차 앗아가는 기분이라.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딨을까.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너의 행복이니까. 내가 네 곁에 남자로 서고 싶은 것도 너를 지키고 너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거니까. 더 이상 과분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만 행복하다면.
“강의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매번 간식도 사주고, 스케줄 하고 오면
수고했다는 말도 해주고, 좀 쉬라는 말도 해주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인 너의 시점으로 봐서는 그저 너를 좋아하기에 나오는 행동이라 여기는 거구나. 그래서 썸이라고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다.
“특히 잘생겼고. 그지?”

물론 그의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의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네가 그 곁에서 웃을 수만 있다면.
“오빠, 질투하는 거 아니지…?”
“질투는 무슨. 네가 큰만큼 우리도 성장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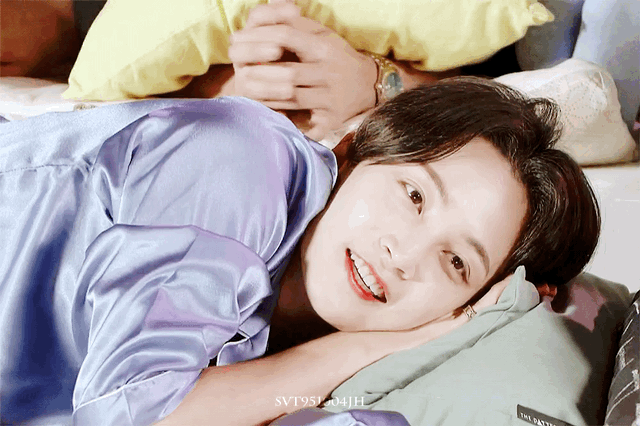
“아니, 오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컴백 준비 때문에 그런가?
우리도 5월 컴백이 목표거든”
“…알았어. 오빠 아프면 바로 말해. 알았지?”
“그게 누가 해야할 말일까요?
지금 쓰러지는 거에
더 가까운 건 너에요, 장마음”

“그래서 나도 스케줄 줄일까 생각하고 있어.”
“잘 생각했어. 올해만 날이 아니니까.”
그 미소가 내게 향했던 것도 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웃을 수 있어 다행이다.
“누구야?”

“누구일 것 같은데?”
“김석우 씨?”
‘넌 날 봐주지도 않는구나.
썸도 아니고 바로 그냥 너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