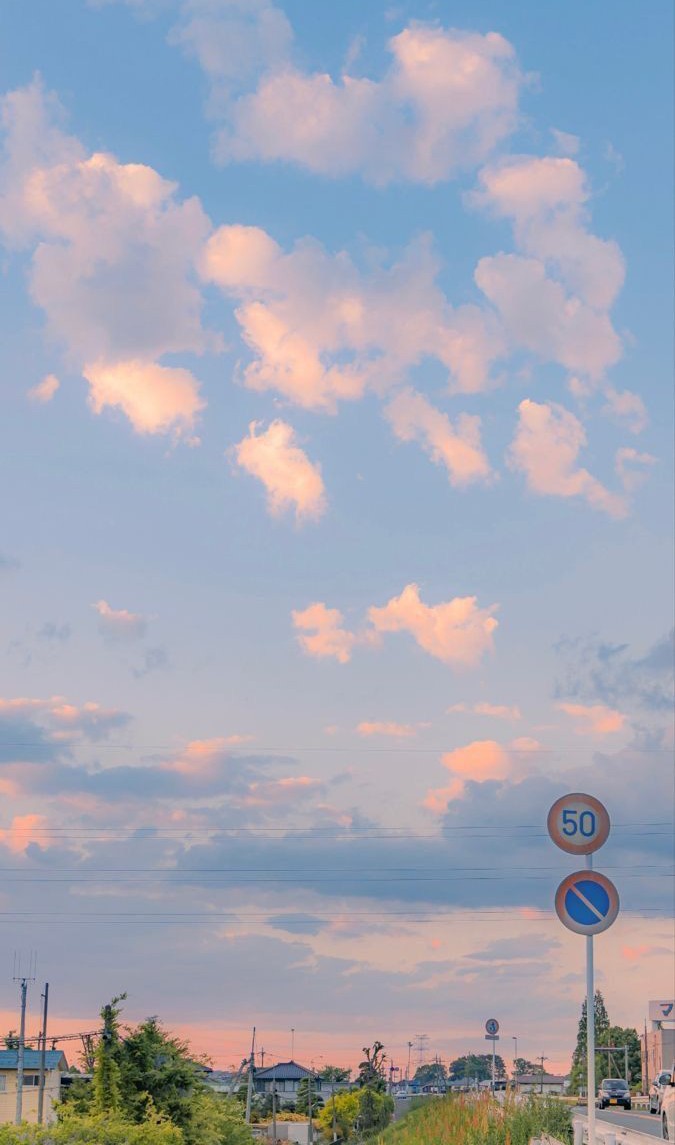
_
나는 말이야, 가끔씩 생각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게 맞을까, 이게 과연 사랑일까,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랑 속에 나는 남아있지 않은걸까.
나는 우스겟소리로 이런 농담을 주로 하곤 하지.
나의 첫사랑은 아직이라고.
근데, 누구는 알까. 나의 첫사랑은 이미 몇 년 전에 쫑나버렸고,
계절이 바뀔수록, 짝사랑하는 상대도 매번 변하던 나는,
내게만 친절하지 않은 그대들에 휩쓸려 항상 시달리는 중이라는걸.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걸까.
실은, 그저 그 순간의 설렘을 못 잊어 마치 중독처럼 또 다시 누군가를,
누군가를 마음에 품어야지만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겪고 있는걸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또 마음에 묻고,
그랬던 기억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넘쳐나는데, 그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사랑이였던걸까. 그렇다면, 나의 사랑은.
내가 그간 겪었던 설레임과, 사소한 것 하나에도 부서지던 자존감은.
내 낯을 붉게 꽃피우던 작열감과, 물감이 번지듯 퍼지던 웃음.
언제나 '언젠가' 라는 말머리를 달아야 했던 문장들과,
어쩌다 내게 머무르는 순간의 그 수평선과, 결국 닿지 않을 진심은.
도대체 어디에 머무르는 걸까.
그래, 이렇게 잃어버릴 사랑이라면. 결국엔 그 이름조차 잊혀져갈 운명이라면. 나 하나쯤은 그 감정의 존폐를 다루고 싶었어. 서툰 글으로나마 써내려가 언젠가 내가 너를 회상할 때 쓸모없는 기억으로 남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은 결국 자학이라는걸. 자기 가슴만 문드러지고 뭉개지다 결국 찰나의 기억으로 나부낀다는걸. 나의 질투는 언젠가 내게 부끄러운 감정의 이면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내 감정을 표현했다가는 두고두고 회자되어 내 밤잠을 후려칠것이라고.
그러니 이 글으로나마 너를 기약할게. 언제 쓰여진지도 모르게,
언제 지워진지도 모르게. 언제 잊혀진지조차 모르게.
있잖아, 나는 네가 정말 미웠어. 때로는 너의 눈치 없음을 원망했고,
자주 너를 생각하며 욕을 짖씹었어. 사실, 미안해. 미워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괜히 나 혼자 너를 물어뜯었어. 내 감정이 그랬어.
너의 세상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것같아서. 가끔씩은 서글펐어.
길을 가다 우연히 너를 볼 수 있을까 마음을 졸이며. 풍경을 보는 척, 너의 옷자락을 찾았어. 괜시리 느긋해지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미련은 결국 버리지 못했었어. 너는 내 생각조차 없을텐데.
네겐 내 안중조차 없을텐데. 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했어. 내가.
그리고 그 날, 이제 그런 미련따위 버리고 그냥 내 길을 걷고자 다짐했은 때. 너는 정말 눈치도 없지. 너는 정말정말 나는 생각해주지도 않지. 어째서 왜, 왜 그날 내 앞을 스쳐지나가. 왜 그간 보이지도 않았던 코빼기가 왜 그날 보여. 그리고 나는 어째서 왜 너를 무시하지 못해.
스스럼없이 너를 따라잡으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쪽팔림과 자괴감을 아는 내 머리는 내 발목을 붙잡는데. 너는 내가 네 뒤에서 걷고 있다는걸 알까. 아니,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자주 지켜봐왔다는걸. 너는 알기나 할까. 결국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상처받는다는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왜 이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는걸까.
이 사랑은 어차피 내가 그만두면 그렇게 아무도 모를 텐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결국에는 나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랑일텐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