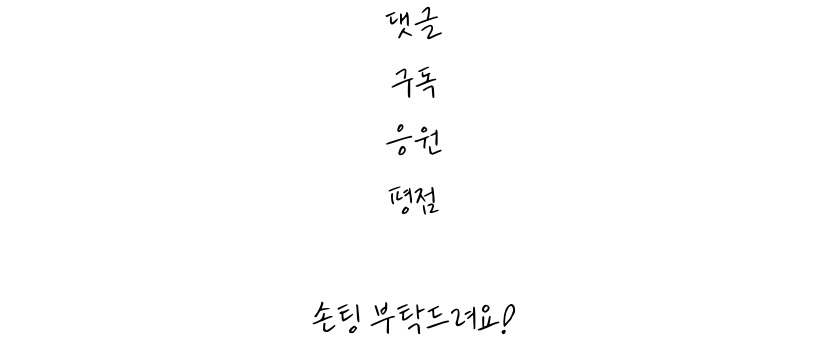기억을 걷는 시간
알바를 그만두고 일주일 쯤, 개학이 다가왔다. 개학 하루 전날 나는 옷장에 박혀있던 교복을 꺼내고, 책부터 공책, 필기구 갖가지를 가방에 넣었다. 학교에 갈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 생각했을 때,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또 왜…!”
학교는 더이상 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준이 있을 때나 그런 공간이었지, 이준이 사라진 학교는 숨만 막힐 뿐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제작년 겨울 11월, 사진부에서 이준의 마지막으로 이준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날 이후 이준을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한 지금까지. 가끔 학교에 가려고 할 때마다 손이 떨린다. 마치 학교라는 공간이 내게 트라우마가 된 것 마냥.
또, 이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
“준아… 나는 아직도 네 시간에 살고 있나 봐……”
침대 머리맡 서랍에는 유일한 이준의 사진이 자리해 있었다. 벌써 계절은 몇 번이나 지났는데… 너와 나만 여전히 그 겨울에 멈춰있는 듯 했다.

분명 알람을 맞춰둔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울리지 않았다.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 생각한 나는 민윤기의 전화로 겨우 일어나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집 앞에는 하복을 입은 민윤기가 폰을 만지작 대고 있었다.
“늦었다.”
“미안, 개학 첫날부터 지각하게 생겼네.”
“일찍 잠이나 자지 어제 뭘 한 거야.”
“그냥…”
어젯밤 이준의 사진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걸 민윤기가 알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이라는 단어 하나로 말을 흐렸다. 하지만 민윤기는 괜히 오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나 보다.
“울었냐?”
“아닌데…?”
민윤기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 나는 민윤기와 눈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눈알을 이리저리 굴렸다.

“맞네, 맞아. 안 울긴 무슨.”
“티 많이 나?”
“어.”
가벼운 딱밤과 함께 날아오는 한숨 섞인 말들이었다. 나는 무심한 민윤기의 말투가 걱정이라는 걸 잘 알았기에 베시시 웃어보였다. 물론 민윤기는 뭘 잘했다고 웃냐며 되려 뭐라 하긴 했지만…
어차피 지각 확정인 거, 굳이 땀 나게 달리기 않기로 했다. 민윤기와 나는 원래 효율적이지 못한 일에는 힘을 쏟지 않으니. 학교까지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저절로 어제 울었던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됐고. 아, 그냥 뛰자고 할 걸 그랬나. 후회가 쏟아졌다.
“설마 또 걔야?”
“… 갑자기 손이 떨리더라고. 어쩔 수 없었어.”
민윤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진다. 걔가 이준이라는 건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던 나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됐다. 뭐라고 안 할게. 나중에 병원이나 가.”
“응!”
이준과 관련된 나의 일에 민윤기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의 일이다. 두눈이 동그랗게 커진 나는 이내 활짝 웃었다.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학교에 어떤 혼란한 일이 생겼는지 알지도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