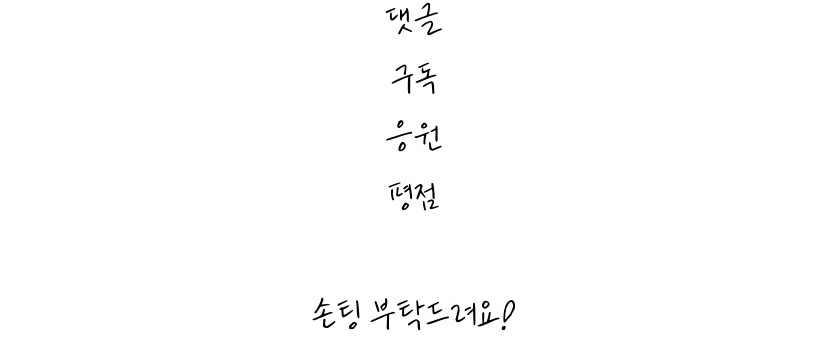기억을 걷는 시간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발이 제자리에 묶인 것처럼 꼼짝 못하던 나 대신 소리친 건 바로 민윤기였다. 민윤기는 그들에게 꽤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다가가 위협적이게 굴었다.
“너 내가 입 닥치라고 했지.”
“내, 내가 뭘! 나, 난 그냥 전정국이 궁금해 하길래 알려준 것 뿐이야!”

“한 번만 더 나불대면 그때는 경고로 안 끝날 거야. 적어도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지. 안 그래?”
민윤기가 매서운 눈으로 경고하자 나불대던 애와, 근처에 있던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물론 전정국도 그랬다. 여기서 전정국은 잘못이 없다. 전정국은 오늘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을 뿐이고, 학생들 반 이상이 이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장기가 뒤틀리는 듯 배가 아파왔고, 질끈 감은 눈 앞에 펼쳐지는 그날의 장면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괜찮아진 줄 알았다. 아니, 사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결국 나는 정신을 잃고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온통 하얀색이었던 배경이 어느 순간 형태를 갖추어 만들어졌다. 놀라 커진 눈으로 찬찬히 주위를 둘러봤다. 여긴… 학교였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나를 제외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창 밖은 어둠이 자리잡고 있었다.
“뭐야… 여긴 대체 어디야……”
혼란이 가득해진 머릿속을 정리하기 바쁜 지금, 교실 안에 위치해있는 달력이 보였다. 나는 복도에 멈춰있던 발을 교실로 옮겨 달력 앞에 섰다. 이 달력 역시 어딘가 이상했다. 분명 지금은 2022년 8월 말 쯤인데… 혹시 꿈인가?
“2020년 11월 18일…”
2020년 11월 18일.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짜였다. 2020년의 11월 겨울은 나에게 너무 차갑고 외로운 계절이었으니. 11월 18일, 바로 이준의 생일이자 기일이었다.
이제야 이 곳이 어디인지 알 것만 같았다. 이 곳은 학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20년 11월 18일, 이준이 죽었던 바로 그날의 학교다. 나는 뒤를 돌아 교실 뒤에 붙어있는 시계의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9시 46분. 내가 죽은 이준을 발견하기 15분 전의 시간이었다.
“어쩌면… 어쩌면 내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에겐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죽은 이준을 발견한 장소는 사진부실, 그리고 시간은 15분 뒤다. 15분 전으로 와 꿈을 꾸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꿈에서라도 내게 이준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걸 수도 있다.
마음 속에 희망이 피어났다. 나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눈물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사진부실로 달렸다. 숨이 넘어갈 듯 거칠었지만 호흡과 함께 사진부실 문을 벌컥 열었다.
“이준…”
사진부실을 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사진부실의 문을 열자 한 손에 흰색 약통을 들고 선 이준이 보였다. 내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이름을 부르자 이준은 옅은 미소를 보이며 내 이름을 불렀다.
“김여주, 나 오늘 생일이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축하해. 태어나줘서, 이렇게 내 앞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 생일을 네가 알아주네. 고맙게.”
“앞으로도 내가 알아줄게, 내가… 내가 널 잡을게. 그러니까, 나가자. 나랑 같이 밖으로 도망가자, 준아. 제발……”
눈물이 얼굴을 뒤덮고, 사진부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너무나 많이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내 앞에 서있는 이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불 꺼진 사진부실, 울고 있는 나. 너는 분명 웃고 있었다. 잘 보이지 않아도 올라간 이준의 입꼬리만은 분명히 보였다.
“… 그거 알아? 내가 너 웃는 모습을 제일 좋아했다는 거.”
“……”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처럼 슬프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로울 때, 널 보면 괜찮았어.”
이준의 모든 말들이 나를 울렸다.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너를 다 꿰고 있었다. 네가 나의 웃는 모습을 좋아했다는 것도, 너의 삶이 버거웠던 이유도. 지금의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났다. 이준이 내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인 것만 같아서, 그날의 나를 걱정하는 네가 이제서야 찾아와 준 게 아닐까 싶어서.

“딱 한 번만 더 웃어주라, 여주야. 날 위해서.”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던 나는 울음을 꾹 참으려고 애를 쓰다 결국 포기하고서 양쪽 입꼬리를 올렸다.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잔뜩 흐르고 있었고, 이준의 부탁으로 올려보인 입꼬리는 덜덜 떨렸다.
팔로 눈가를 비벼 눈물을 닦아냈다. 이준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보고 싶었다. 눈가를 벅벅 닦아낸 내 앞에 보이는 이준은 나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에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떨리는 그의 손을 잡으려 한 발자국 다가갔을 때, 모든 게 깨지며 사라졌다. 얼마 가지 않아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귀를 파고 들었고, 그렇게 나는 눈을 떴다. 죽어도 깨고 싶지 않던 꿈에서 결국 깨어나고 만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