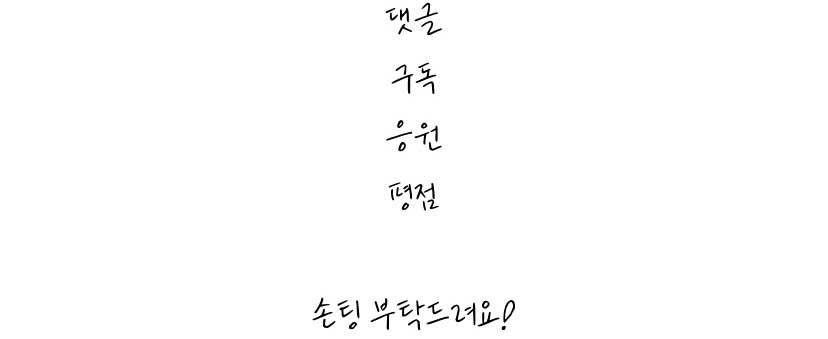기억을 걷는 시간
현실에서도 나는 울고 있었다. 내가 눈을 뜬 건, 학교 보건실이었고, 온통 흰색인 이 공간에서 아까의 꿈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스쳐간다. 보건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나는 눈물이 왈칵 터졌다.
“여주야, 왜 울어.”
나를 꿈에서 깨운 목소리와 동일한 목소리였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옆을 바라보자,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전정국이 보였다. 하필 있어도 전정국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방금 꿈에서 만난 이준과 달리,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전정국이었기에.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했다.
“나쁜 꿈이라도 꾼 거야?”
“……”
“울지 마, 웃는 게 더 예쁘다고 했잖아. 뚝!”
분명 전정국은 내게 울지 말라고 했다. 웃는 게 더 예쁘니 뚝 하라고. 나를 달래려고 한 말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리는지. 이준이 처음으로 내 꿈에 나와 직접 전한 말 때문이었을까? 눈물샘이 고장인 것처럼 멈추질 않는다.
“흡… 흐윽, 흐어엉-.”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마냥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겨우 잊었던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던 그날의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 그날 내가 너에게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너의 가족들이 너에게 무심하지 않았더라면. 선생들이 너에게 마음의 짐을 얹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실된 친구가 있었더라면. 너는 살아있었을까?
네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전부 나인 것만 같았다. 나는 너에게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고, 너의 개인사정 또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결국… 나는…… 너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짐만 됐을 뿐이라는 거다.
숨이 넘어갈 듯 싶었다. 너무 울어대서 온몸이 새빨갛게 변하고, 호흡은 너무나 불안정했다. 오죽하면 어찌 할지 몰라 눈알을 굴리던 전정국이 그대로 나를 품에 안았을까.
“여주야.”
“흐읍… 끅, 흐……”

“여주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의 품은 따뜻했다. 심적으로 불안정한 내가 온전히 기대어 울어도 괜찮다 느낄 만큼. 또, 너를 이준이라 착각할 만큼.
“미안해… 미안해, 준아……”
“……”
“내가 너를… 내가…… 미안해.”
전정국의 품에 안겨 이준의 이름을 불렀다. 우느라 정신이 없던 나는 이름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그 품에서 몇 분동안 울음을 토해냈다.

겨우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나를 안고 있던 전정국에 놀란 것도 잠시. 전정국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좀 어때?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 응.”
“다행이다.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이런 거 가지고, 뭘. 조금 더 쉬었다가 와. 난 교실에 먼저 들어가 있을게.”
매너가 몸에 배어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꼈다.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신의 앞에서 죽을 듯 운다? 그 이유를 궁금해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전정국은 아니었다. 궁금해하긴 커녕 나를 걱정한 뒤, 태연하게 보건실을 나가려 했다. 처음 보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에 전정국을 붙잡아 세웠다.
“왜 울었는지 안 궁금해…?”
“궁금해, 아주 많이.”
“근데 왜…”
“널 또 울게 만들 것 같아서.”
정답이었다. 전정국이 내게 이유를 물었다면 나는 또 이준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을 거다. 은은한 미소를 보이며 말하는 전정국에 나는 어떠한 모션도 취할 수 없었다.
“난 네가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 여주야. 놀이공원에서 만났던 그날도, 오늘도 같은 마음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전정국은 보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전정국이 나가고 다시 침대에 몸을 눕힌 나였고, 이불을 턱끝까지 올려 덮은 뒤, 몸을 웅크렸다. 마음이 복잡했다. 누군가에게 복잡해진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다.
민윤기가 떠올랐다. 민윤기는 나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다. 아까 민윤기와도 다툼이 있었으니, 민윤기 역시 나에게 화가 난 상태일 거다. 그러니 여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겠지. 입술이 삐죽 튀어나왔다. 쫌생이…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
“너무해.”
“뭐가.”
조용히 중얼거린 말에 대답이 들려올 줄 몰랐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존재, 민윤기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깜짝 놀라 몸을 흠칫 떤 나는 이불을 살짝 내려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했다.
“민윤기…!”

“잘못했어, 안 했어.”
“…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용서해 줘.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항상 이런 식이다. 내가 본인에게 뭔가를 잘못해도 민윤기는 매번 먼저 나를 찾아왔다. 본인이 진정되고, 내가 진정이 되는 듯 싶으면 그때마다 나를 찾아와 똑같이 물었다. 그럼 나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민윤기는 못 이기는 척 받아줬다.
한결같은 우리의 화해 방식이었다. 오늘 역시 먼저 찾아온 네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민윤기는 내게 가까이 와 의자를 꺼내 앉았다. 그리고 누워있는 내 이마에 아프지 않은 꿀밤을 때렸다.
“건강 챙기라고 몇 번을 말하냐.”
“치… 너 방금 되게 세게 때린 건 알아? 혹 나면 어쩌려고!”
“아양만 늘어서는…”
민윤기와 눈이 마주친 나는 금새 웃음을 터뜨렸다. 민윤기 역시 나를 따라 피식 웃음을 보였다. 나는 우리의 화해 방식이 마음에 든다.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끝은 웃음으로 끝났으니. 이유는 아마 매번 민윤기가 져준 탓이겠지만 말이다.
많이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헤실거리며 웃었다. 순간, 앞으로도 쭉 민윤기와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붉어진 민윤기의 귀를 눈치채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