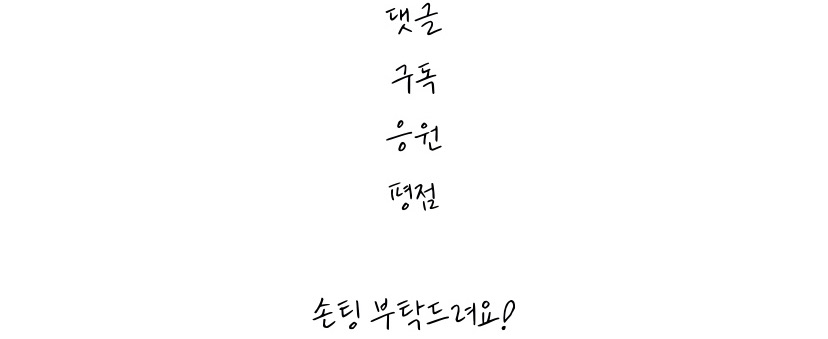기억을 걷는 시간
역시 학교는 안 좋은 일들이 가득한 곳이다. 개학하고 며칠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좀 많았다. 특히 개학 첫날부터 들려오는 이준의 이름과 전정국의 이름이 가장 힘들었다. 나 역시 전정국한테서 이준을 보고 있는 게 맞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했다.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좋다. 나는 내가 좋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편이니까. 또,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전정국을 보며 이준이 아닌 이준의 사건을 떠올렸다. 떠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이제는 부풀려 떠들기 바빴다.
“민윤기, 나 전정국한테 너무 미안해.”
“이제 와서?”
“… 응, 걔는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 티는 안 내도 엄청 불편할 것 같아.”
개학 초반에는 이준의 사건이 내게 너무 아파서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좀 잠잠해진 이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모른 채, 남들의 입에 계속 오르는 전정국이 보였다. 다른 애들도 그렇지만 전정국에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전정국은 내가 울고 있을 때마다 옆에 있어줬는데…
“미안하면 어쩌게.”
“어?”
“뭐, 네가 직접 이유를 알려주기라도 할 거야?”
말문이 막혔다. 누군가 전정국에게 학교가 뒤숭숭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전정국은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다 또 입 가벼운 애들이 말을 옮기기라도 한다면… 그것 또한 싫었다.

“김여주, 지금의 넌 전정국한테 도움이 될 수 없어. 오히려 짐만 되겠지.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걔한테 이유를 알려주던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던가. 둘 중 하나라고.”
또 시작됐다. 민윤기의 솔직하고 차가운 말들. 나를 걱정하기에 차가워 진다는 걸 알아서 큰 타격은 없었다. 민윤기의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전정국한테 미안하고, 다른 애들의 말이 전정국 귀로 들어가는 게 싫다면, 내 선택지는 하나라는 걸.
내가 직접 전정국한테 털어놓는 것. 나는 이준의 얘기를 꺼내는 게 힘들어도 전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했다.
“나는… 전정국이 힘든 건 싫어.”
반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췄다. 그날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지금, 나는 전정국이랑도 교류가 생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현재 전정국과 나는 친구가 되버렸고, 내 추한 모습은 전정국이 다 봤고. 혹시나 전정국이 이 상황을 못 버텨 떠나버린다면 이번에는 정말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야, 너 설ㅁ,”
“쌤한테 얘기 좀 잘 해줘! 부탁할게!!”
나의 유일한 선택지를 향해 가보려고 한다. 나는 그대로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고, 전정국을 찾기 시작했다. 학교 곳곳을 뒤지고, 전정국 봤다는 애들의 말 끝에 내가 향하려는 곳은 옥상이었다.

복도 맨 끝쪽 계단을 몇 번이고 올라 학교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에 도착했다. 나는 숨을 몇 번 크게 고르고, 크고 단단한 회색 철문을 열었다.
“전정ㄱ,”
문을 열며 전정국의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내 눈 앞에 보이는 건 옥상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전정국이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한 걸음씩 전정국에게 다가갔다.
“너, 너 지금 거기서 뭐해, 전정국…”
“어? 여주다.”
전정국은 내 목소리에 난간 위에 서 예쁘게 웃었고, 나는 점점 표정이 굳었다.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그날이 떠올랐다. 옥상 난간에 서있는 전정국과 사진부실에서 약통을 들고 서있던 이준이 겹쳐보였다.
심장이 꽉 막혀오는 듯 저려왔다. 이준이 아닌 또 다른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건 정말 끔찍했다.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진 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너까지 잃기 싫단 말이야…”
나는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고개를 숙이자마자 그대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었고, 옥상 바닥 위로는 그대로 나의 눈물 자국이 남았다.
눈물이 몇 방울 쯤 자국을 남겼을까, 내 앞으로 그림자가 깔렸다. 그건 분명 전정국의 그림자임을 알기도 전에 나는 전정국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왜냐, 양손으로 내 뺨을 감싸 그대로 들어올린 전정국 때문이었다.
눈물을 주렁주렁 매달고서 전정국과 눈이 마주치자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버린 나였다. 전정국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피식 한 번 웃고는 그대로 나를 품에 안았다.

“매번 나는 너 우는 것만 보는 것 같네.”
전정국의 품에 안긴 나는 쪽팔림도 모르고 울어버렸다. 이상하게 전정국 앞에서는 감정이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끝내 어린아이 마냥 울음을 터뜨린다.
“울지 마, 여주야. 우리 지금 이렇게 안고 있잖아.”
꽤나 다정한 목소리였다. 아니, 이제는 다정함을 넘어 달달하기까지 한 전정국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의 품에 더 파고 들었다. 내가 본인의 가슴팍에 얼굴을 부비적 거리며 두 팔로는 허리를 감싸 안자 내 등을 토닥이던 전정국의 손길이 아주 잠시 멈췄다.
“… 너무 꽉 안은 거 아닌가.”
“응? 방금 뭐라고 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고개를 들어 전정국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묻자 대답을 피하는 전정국이었다. 나는 울음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정국의 품이 따뜻해 한참을 더 안겨 있었다. 전정국 역시 나를 떼어내거나 하진 않았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봤다. 전정국의 토닥임이 멈췄을 때, 슬쩍 올려다 본 전정국의 귀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