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뭐야 여주 진짜 왔어?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미안. 나도 나오고 싶었는데
최근 너무 바빴다."
"야 됐어 됐어 이제 봤는데
뭘. 빨리 앉아."

"와 이 정나미 없는 것들. 정작
얘 데려온 나는 안 반겨주고."
야 김석진 삐졌다 얼른 달래줘라~ 그렇게 다음 날 내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니자 석진이는 나 때문에 잠깐 미뤘던 친구들의 술자리에 날 데리고 갔다. 그동안 일이 바빴던 탓도 있고 윤기 씨와 시간을 보내며 현생에서의 길을 뚝 끊었다 보니 이런 자리가 살짝 어색했다.
다행히 날 반기는 친구들 태도에 마음이 놓였다. 그래도 나한테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내 말에 석진이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아마 내가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근데 여주. 남친 있어?
바빠서 못 만났으려나."
"어?"
"아니 왜, 너 인기 많았었잖아.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있나 싶어서."

"··· 에이 야 넌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냐. 얘 모솔인 거 알잖아."
내가 놀란 눈으로 석진이를 쳐다보자 석진이는 친구들 모르게 윙크를 했다. 뭐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설마 정국 씨가 말해줬나. 그건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석진이로 인해 친구들의 관심은 짜게 식었다. 대신 왠지 모르게 남자애들 몇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여기 자리 비었으니까
앉아도 되지?"
"어? 응."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

"······."
"좋아하는 스타일···.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전에 윤기 씨를 봤었던 석진이는 말없이 날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도 고민 좀 해보라고 웃는 남자애에 생각에 잠겼다. 석진이 말처럼 난 윤기 씨를 만나기 전까진 모솔은 아니었다. 바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지만 그리 서로를 좋아하진 않았고, 진짜 사랑을 시작한 건 윤기 씨였다. 짝사랑을 해 보았던 상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 일단 눈매는 살짝
찢어졌으면 좋겠어."
"어, 나 고양이상인데."
"피부도 하얬으면 좋겠고···
성격은 괜찮으면 좋고."
"그거 딱 난데···. 사실 여주야
나 너 번호 받고 싶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경 엄청
써줬으면 좋겠어. 피부도 그냥
하얀 게 아니라 창백할 정도로.
거기다 선지만 먹고 요리도 잘 하고 또,"
그때 깨달았다. 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건 윤기 씨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 머리가 띵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못 잊은 걸 보니 나도 진짜 미친 것 같았다.
그 남자 애도 친구들도 그리고 석진이도 날 보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이 윤기 씨로 가득 차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둘러댄 뒤 술집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
그리고 그 상황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정국은 상황이 재밌게 돌아간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다. 뭐야, 이젠 김여주까지 민윤기랑 똑같이 흘러가네. 그렇게 정국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여주의 뒤를 따라나갔다.
김여주는 뱀파이어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윤기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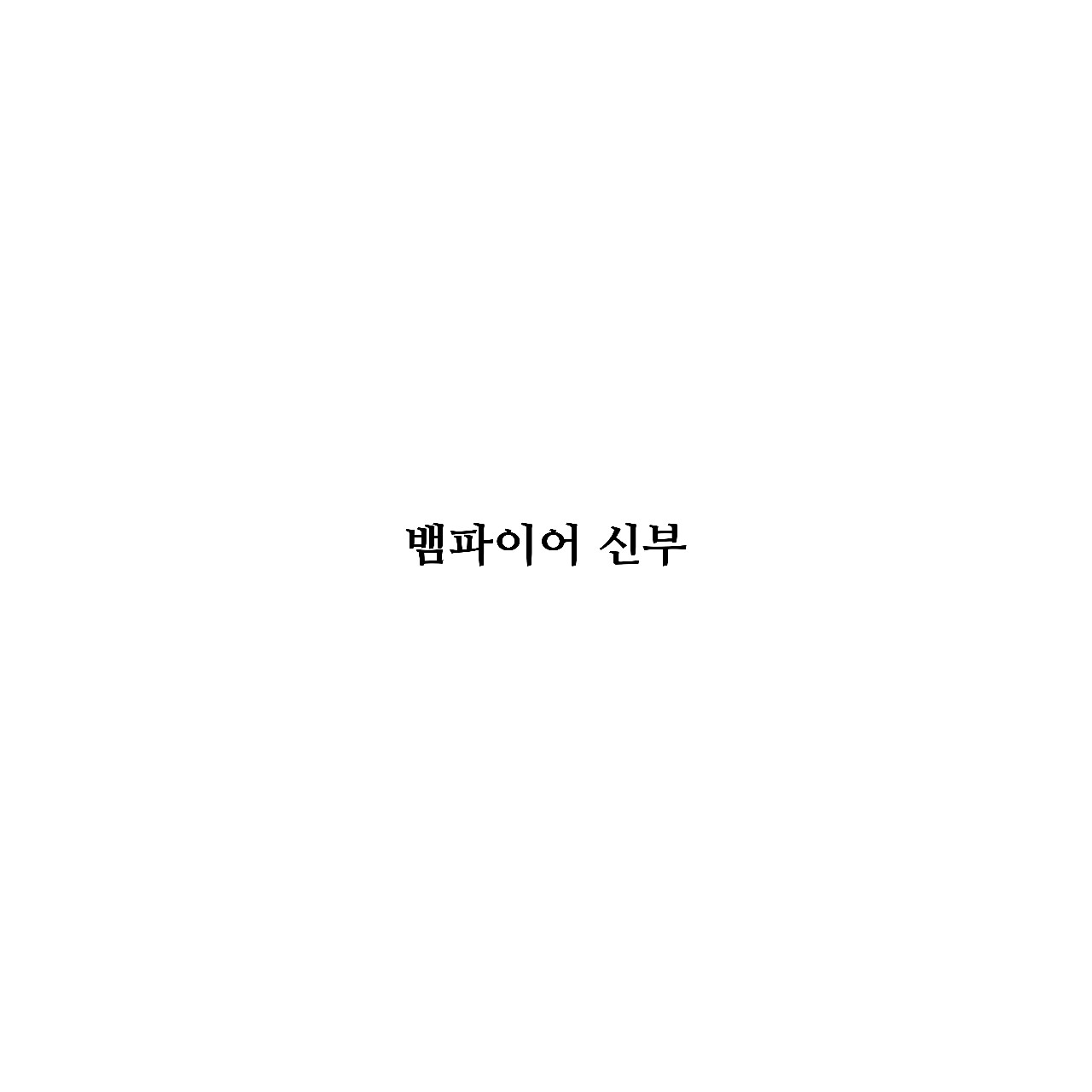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몸에 맞닿았다. 그래도 아직 저녁에는 좀 쌀쌀한가 보다. 생각에 잠겨 있어 올라오지 못한 술기운이 마음이 좀 평온해지자 그제서야 훅 올라오기 시작했다. 금방 목과 얼굴이 빨개졌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
탁.

"위험합니다."
그때 정국 씨가 나타나 내 손목을 붙잡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눈앞에 가로등이 있었다.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니 정국 씨는 내 손목을 놓아줬다.
여긴 어떻게 왔냐는 물음에 정국 씨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게 다였다. 나도 별로 캐묻고 싶은 기분은 아니라 그러고 말았다. 정국 씨는 밤길이 위험하니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괜찮아요.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요, 뭘···."

"그러니까 데려다준다는
겁니다. 8시나 됐으니까요."
"······."
"가죠."
더 괜찮다고 하면 욕이라도 할 것 같은 표정에 못 이기고 알겠다고 답했다. 그 뒤로 정국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비틀거릴 때마다 팔을 잡아주는 게 다였다. 그런 정국 씨와 달리 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다. 예를 들어··· 윤기 씨라든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윤기 씨는 어떻게 지내냐 물었다. 그것도 찌질하게 대답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고 얼버무렸다. 말을 마치고 나니 생각보다 더 많이 쪽팔렸다. 아··· 그냥 입 닫고 갈걸.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잘 지냅니다."
"······ 아."
"생각보다는요."
"네?"
"술에 찌들어서 헛소리를 조금
하는 것 빼곤 괜찮습니다."
윤기 씨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았다. 걱정이 되어 더 아픈 덴 없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 볼까 봐 관뒀다. 사실 그러는 게 맞았다. 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못 잊어서 날 칼로 베려고 했던 윤기 씨를 걱정한다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두 때문에 까진 발뒤꿈치가 쓰라렸다. 안 그래도 비틀거렸는데 이젠 절뚝이기까지 하니 정국 씨는 내가 아프다는 걸 눈치챘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그렇게 정국 씨는 날 길거리에 있는 벤치에 앉혀두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몇 분 정도 정국 씨를 잠자코 기다리자 무언가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왔다. 달려서 온 건지 숨이 가빠 보였다.
"신어요."
"이거 사려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냥 마트가 좀 멀었던 겁니다."
쇼핑백 안에 든 건 삼선 슬리퍼였다. 벙찐 얼굴로 가만히 있자 정국 씨가 쭈그려 앉아 친히 구두를 벗겨 슬리퍼를 신겨주었다. 슬리퍼를 신으니 발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져만 갔다. 곧바로 참고 있던 눈물이 똑, 하고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정국 씨."
"······."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말할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석진이한테도 말하기 어려워서
그냥 혼자 꾹꾹 참아왔었어요."
"······."
그냥, 그냥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다였는데. 진짜 그게 단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였다. 정국 씨는 그런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이며 살며시 날 안아주었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김여주 씨
운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
"··· 지금은 날 탑 관리자 말고 그냥
아는 오빠라고 생각하십시오."
"······."
"난 네 마음 다 이해하니까.
알겠지 여주야."
정국 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난 더 펑펑 울었다. 멈추고 싶어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다. 그렇게 하니 진짜 정국 씨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게 해 주었다. 내가 힘들 때, 유일하게 옆에 남아 주었던 그 오빠.
'지금 무슨 심정인지 알아. 그러니까
울어, 여주야. 이럴 땐 울어도 돼.'
정국 씨가 꼭 그 오빠 같았다. 지금은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흐릿하지만 하는 행동이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 그 오빠가 아직도 내 곁에 있었다면 난 정국 씨가 아니라 오빠에게 의존했을까.

"조금은 울어도 괜찮아. 널 알아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 있잖아."
그랬다면, 아마 그 오빠도 정국 씨와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서브파들 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