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들어가십시오."
"정국 씨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다. 정국 씨는 들어가라는 말을 마치고 뒤를 돌았다. 너무 고마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뭐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옮기는 정국 씨의 손을 무작정 잡아버렸다.
"어.. 저, 그게···."
"······."
".. 감사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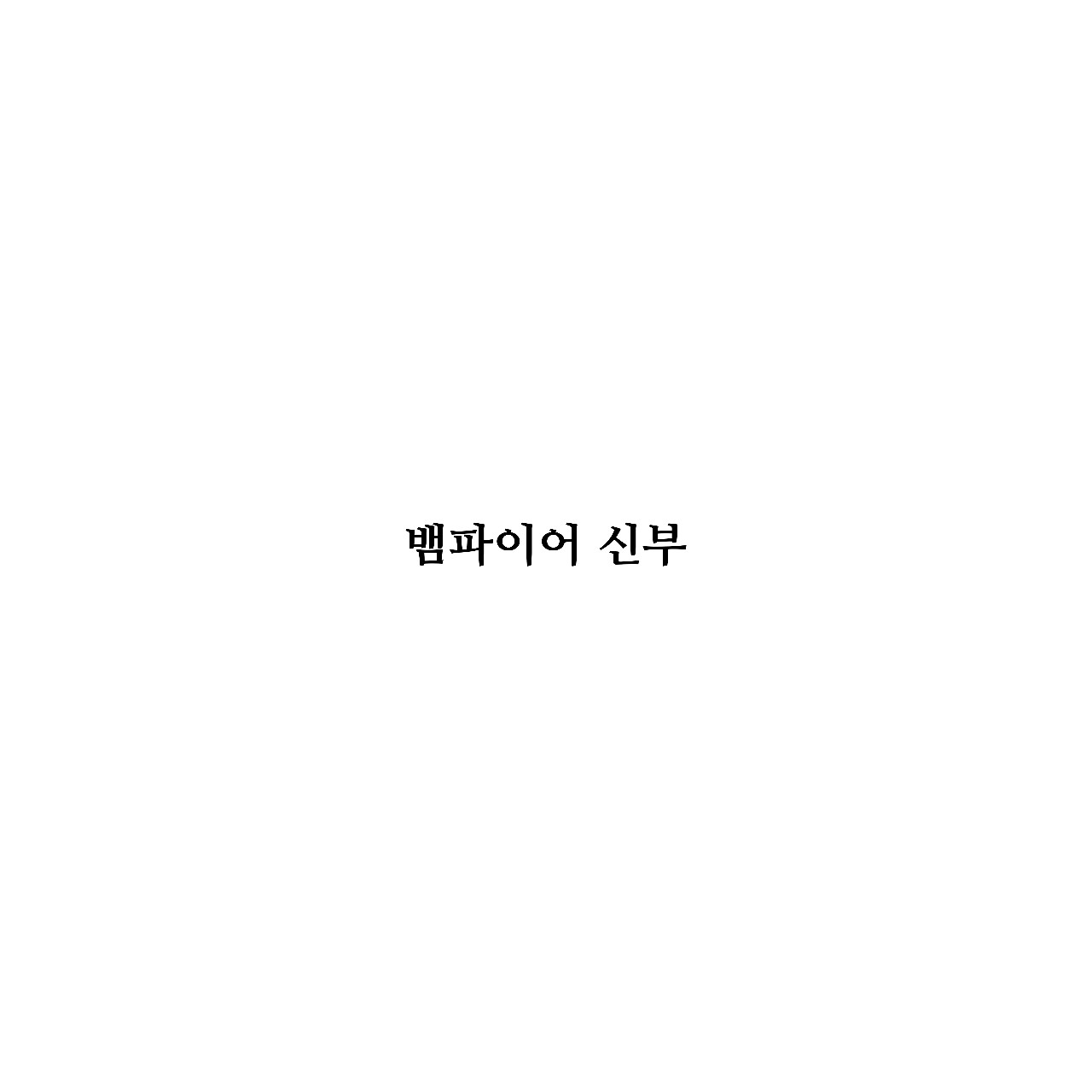
"저기."

"······."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7년 전, 열아홉 살. 한창 공부밖에 모를 나이에 그 아이가 나타났다. '김여주'. 쌍꺼풀이 없는데도 큼지막한 눈에, 오뚝한 코, 얇지만 예쁜 입술.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 눈코입이 잘 들어가 있는 예쁜 애였다.
여주는 항상 인기가 많았다.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그 사이에 내가 낄 자리는 없었다.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봤다. 다가가기엔 여주가 너무 빛났고, 난 네모난 뿔테안경에다 친구도 없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 애였으니까.
"여, 여주야···."
"······."

"너.. 울어···?"
어느 날은 늦은 밤중 깜깜한 독서실에 혼자 울고 있는 여주를 발견했었다. 날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고 밝게 웃으며 아니라고 가방을 챙겨 나가는 여주에 걱정이 되어 용기를 내 같은 방향이면 함께 가자고 물었다. 여주는 잠깐 고민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감히 너한테 해도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
"힘들면 울어도 돼. 너 운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 감사해요."
여주는 많이 힘들고 지쳐 보였다. 서로 길이 엇갈려 헤어질 때 즈음, 여주가 먼저 번호를 물어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려 전화번호를 잘 입력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여주의 눈빛이 슬플 뿐이었다.
하지만 이후로 연락은 오고 가지 않았다. 그저 번호를 주고받은 날 잘 들어갔냐는 안부 메시지 하나 빼고는. 그래도 뭐가 돼도 좋았다. 존재감은 없어도 여주의 세상에 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여주가 모르기를 바랐다. 이리도 모자란 내가, 저를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것을.
- 서, 선배.. 저 지금, 공원 앞인데···.

"······."
- 지금 와주시면, 안 돼요···?
뚝.
"··· 여주야. 여주야?"
무려 한 달 만의 연락이었다. 그런데 여주가 또 울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추운 날씨에 겉옷도 챙기지 않고 밖으로 나와 공원 쪽으로 달렸다.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니 여주가 힘겹게 벤치에 앉아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내가 곁으로 다가가 무슨 일이냐 물으니 그제야 안심해 쓰러지듯 내 어깨에 상체를 기대었다.
"선배···. 저 너무 힘들어요···."

"······."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들 비위 맞춰주는 것도 그만하고 싶고, 외면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 인연도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죄책감이 들어 여주를 마주할 수가 없었다. 나 또한 여주의 외면만 보고 좋아했던 거니까. 그런 내가 여주의 속마음을 다 알아도 되는 건가 싶었다.
말없이 여주의 등을 토닥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대었다. 좋아하고 떨려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해서. 여주는 하염없이 울었다. 내 손을 동그랗게 말아 쥐어 꼭 잡고 놔주지 않았다. 미안해서라도 여주의 곁에 있으면 안 됐다. 손을 빼내려 하자 여주가 날 와락 끌어안았다.
"··· 오빠."

"······."
"정국 오빠."
"······."
"오빠도 없으면 저···."
죽어요. 여주의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내리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생각하는 '여주를 위하는 행동'이 아닌 진짜 '여주를 위하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어 여주보다 더 세게 꽉 껴안아 말했다.
"어디 안 갈게."
"······."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난 꼭 네 곁에 남을게."
"··· 흐흡."
"걱정 마, 여주야."
살짝 걷어진 소매 안 여주의 손목에 칼로 그은 듯한 꽤 깊게 팬 상처가 있었지만 모른 체했다. 여주가 나에게 너무 많이 의지해버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여주의 감정 쓰레기통만 되었으면 했다. 편히 기대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엔 내가 너무 미안했다.
"··· 뭐라고요···?"
"전학 갔다고. 듣기론 지도상에도
안 나오는 시골로 내려갔다는데."
그렇게 다음 날, 전화를 받지 않는 여주에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니 아무도 모르는 시골촌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앞에 있었잖아. 고작 7시간 전까지도 나랑 연락했었잖아···. 당장 학교를 빠져나와 여주의 집으로 향했지만, '임대문의'가 적혀있는 종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주야··· 여주야··· 여주야······."
"민영아 미안한데 우리."
"······."
"헤어지자."
여주와의 기억은 학창 시절 중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이후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예쁜 여자를 봐도, 아무리 심성이 고운 여자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귀다 상대가 상처를 받는 일이 대다수였다.
"오빤 진짜 최악이야."
"······."
"꼭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이 당해봐."
나도 알아, 나 최악인 거.
자리를 뜨는 상대방에 아무 말 없이 빈 술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다 성에 안 차 병째로 들어 목 안으로 넘겼다. 썼다. 여주처럼. 달달했다. 여주처럼. 쓰지만 달달해서 미워할 수 없는, 그런.

"··· 좆 같네, 씨발."
첫사랑이라기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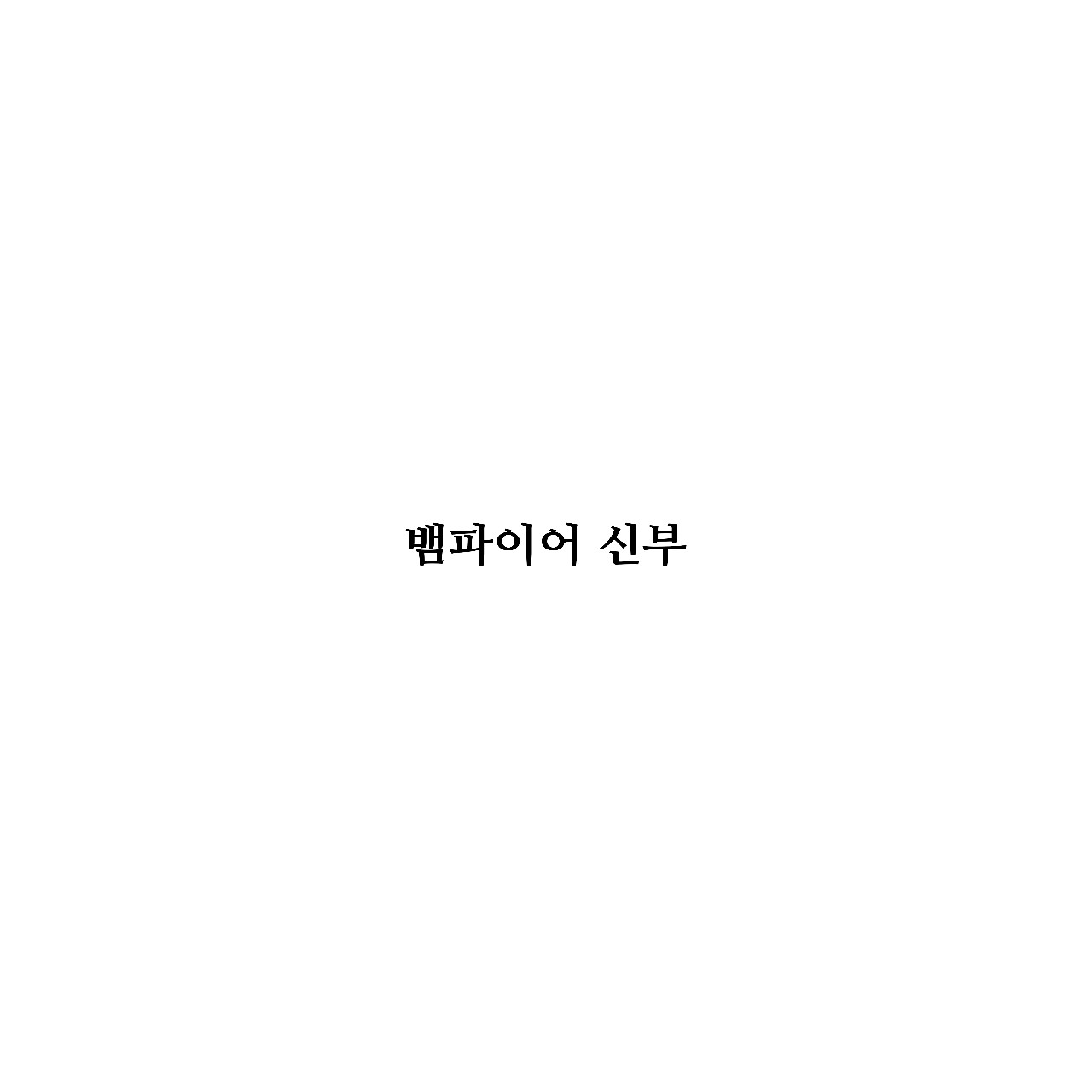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김여주 씨
운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힘들면 울어도 돼. 너 운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분명 그 둘은 닮아 있었다. 정국 씨가 저를 오빠처럼 생각하고 기대라 했을 때, 분명 7년 전 그때의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때 그 오빠는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그런 것치고는 그 오빠의 행동 하나하나가 생생히 기억난단 말이지.
"안경···,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빠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순간, 석진이가 집으로 돌아와 언제 들어왔냐고 한참을 찾아다녔다며 잔소리를 했다. 얼른 씻고 쉬라는 말을 끝으로 석진이가 나가 씻을 준비를 하려 웃옷을 벗으니, 손목에 있는 긴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 쓰이는 상처였다.
웅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