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오빠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진심이었다. 단 하루도 거짓인 적이 없었다. 그에 비해 나는 오빠가 다가올 때마다 거리를 두었고 오빠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다. 적응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한 오빠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 그런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나 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져만 갔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늦게 집에 돌아온 오빠. 오빠는 어제까지만 해도 날 보면 금세 표정이 풀렸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저 말없이 안겨 내 등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 여주야."
"오늘도 힘들었죠. 이제
얼른 씻고 가서 자요."
"응 힘들었어. 못 버티겠다 싶을
때마다 널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이젠 그게 안 돼."
"네?"
"날 보는 네 눈에 너무 감정이 없어서···
이젠 널 생각해도 힘이 안 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상태로 굳어있자 오빠는 내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춰왔다. 일부러 그런 오빠의 시선을 피했다. 짐작이라도 한 듯이 한숨을 푹 내쉬는 오빠는 나 봐.라며 분위기를 꽤 무겁게 잡았다.

"나도 이제 좀 힘들어."
"······."
"나 안 싫어한다며···,
너 진짜 나 안 싫어한다며."
"······."
"근데 왜 아직 아니야···?"
오빠는 다시 날 꽉 껴안았다. 좋아해···, 좋아해···, 진짜 좋아해···. 오빠는 좋아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내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윤기 씨를 어떻게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못 여는 이유가 윤기 씨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윤기 씨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어느새 난 오빠의 심리를 다 알아버릴 지경에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빠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다. 아직은 너무 일러서. 오빠를 마음속에 들이기엔, 윤기 씨가 그 안을 너무 꽉꽉 채우고 있어서. 얼굴을 가까이하는 오빠를 또 밀어냈다. 오빠는 이번엔 내 의사를 따르지 않고 목덜미를 잡고서 입을 맞춰왔다. 가슴팍을 몇 번이나 쳐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빠···, 이러지 마요."

"증명해."
"네···?"
"나 진짜 사랑한다는 거, 오늘 여기서 증명해 봐."
눈을 떠 보니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안방 침대에 앉아있었고, 오빠는 그런 내 양쪽으로 팔을 지탱하고 있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또다시 입술이 닿을 거리였다. 오빠는 자리에 일어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이어 셔츠의 단추를 풀어헤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달뜬 숨을 내뱉으며 날 눕히고는 눈, 코, 입을 따라서 천천히 입술을 부딪혔다.
몸이 덜덜 떨려왔다.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내 팔을 단단히 잡고 있는 탓에 움직일 수도 없었다. 오빠가 무서웠다. 툭 치면 바로 괴물로 변해버릴 것만 같았다. 오빠의 심정이 이해가 가서 더 슬펐다.
"··· 오빠···."

"······."
한동안 고여있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침대 시트가 약간 젖어 자국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제는 나도 윤기 씨를 좀 잊을 필요가 있는 건가 싶었다. 날 떠난 사람을 나 혼자 계속 붙잡아두고 있기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오빠의 힘이 조금 풀린 틈에 손을 뻗어 오빠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래도 오빠는 내 행동에 완전히 힘을 풀어 부드럽게 머리칼을 쓸어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뚜르르르, 뚜르르르.
내가 잠시 번화를 받겠다고 몸을 일으키자 오빠 또한 순순히 물러나주었다. 발신자 표시에 '석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석진이가··· 왜? 그것도 이 밤에? 무슨 일 있는 건가 싶어 전화를 받았다.
"여주야."
"응, 석진아."
"······."
"석진아? 여보세요, 김석진?"

"··· 돌아왔어."
"··· 뭐가?"
"그 사람, 외국으로 떠났었어. 너
위하겠다고 떠난 거였는데···, 생각이
바뀌었나 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
석진이의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윤기, 민윤기 다시 돌아왔어 여주야. 석진이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통화를 끊어버렸다. 정국 오빠를 뒤로하고 방에서 나가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결국 오빠에게 붙잡혀 멈춰 서고 말았다.
"··· 놔요. 나 윤기 씨한테 가야 돼요."
"··· 너 진짜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오빠 사랑한다고 했어요?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난."

"김여주."
"나는 오빠 이성적으로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알면서 왜 이래요. 내가 윤기 씨 못 잊는 거 다 알면서 왜···.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오빠는 그냥 나한테 좋은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매정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오빠에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윤기 씨가 더 중요했기에 오빠의 손을 뿌리치고 오피스텔 밖으로 향했다.
와락.
"······."
"··· 여주야···."
그 순간 오빠가 날 뒤에서 와락 껴안았다. 아까의 상황과는 대립되게 오빠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서럽게 울었다. 아까는 오빠가 갑이고 내가 을이었다면, 이번엔 내가 갑이고 오빠가 을인. 이 관계를 손으로 쥐락펴락하는 건 나였다.

"나 너 없이 못 살아···."
"······."
"나 너 없으면 안 돼···.
다시는 너 못 보내, 나···."
오빠 때문에 되려 나까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뒤를 돌아 오빠와 눈을 맞췄다. 왜 굳이 나 같은 걸 좋아해서···. 오빠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었다. 7년 전과 똑같이 나는 여전히 부족했다.
"나 오빠 가지고 논 거 맞아요.
나 나쁜 년인 거 알잖아요."
"······."
"그러니까 마지막도 나쁜 년으로
끝낼게요. 나··· 윤기 씨 절대 못 잊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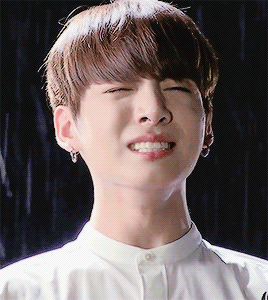
"······."
"오빠도 꼭 저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까와는 다르게 오빠의 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발길을 옮겨도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소리 내어 우는 음성밖에 들리지 않았다.
정구기 무슨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