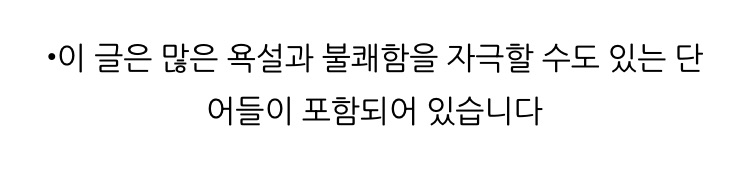

“내가 민여주 좋아하니까.”
지민의 말이 잠시 석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펴졌다. 그리곤 이내 고개를 사선으로 돌리며 지민에게 말했다.
“그래서.”
“뭐?”
“니가 민여주 좋아하는 거랑, 내가 민여주한테 사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하물며 너도 가해자면서 존나 뻔뻔하네.”
석진의 말에 지민의 말문이 막혔다. 짜증나긴 했어도 사실이니까. 지민도 여주를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았어도 괴롭힘 당하는 걸 방관한 똑같은 가해자니깐.
“거봐, 할 말 없잖아 너도. 남 말 할 거 없이 너랑 나랑 걔한테 상처 준 건 똑같은데 너만 아닌 척하는 거 존나 역겨워.”
“…”
“넌 이기지도 못 할 거 왜 찾아와서 사람 성질 긁어놓냐. 너 때문에 내 얼굴만 개아프네.”
“…그래도 넌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간다. 사랑에 눈 멀어서 니가 한 짓 다 없어진 줄 착각하지 마, 박지민.”
너도 그저 가해자일 뿐이니까.
석진이 말을 끝으로 지민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힘 없이 석진에게 밀린 지민은 그 자리에서 몇 분 동안이나 멍하게 서 있었다.

“씨발, 미쳤네. 박지민.”
민여주가 좀 잘해줬다고 용서한 줄 착각하고 있었네.
존나 역겹게.

{소시오패스가 악녀로 빙의했을때}
17. 가해자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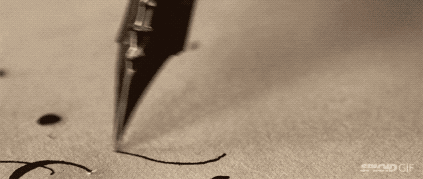
“…”
점심시간, 아무도 없는 교실 안에서 혼자 앉아 만년필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여주였다.
마침 사람이 많은 도서관 대신 반에서 공부하기 위해 반으로 올라온 남준과 만나기 좋은 상황이였다.
가만히 앉아 늘 늘어뜨리고 있던 긴 생머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끝만 살짝 묶어놓은 그녀는 분위기만으로도 아름다웠다.
그런 그녀를 몇 초 간 홀린 듯 쳐다보던 남준은 열심히 쓰던 여주의 손이 멈추고 여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입 모양으로 말할 때가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반으로 들어갔다.
“그만 좀 쳐다보지? 내 얼굴 뚫리겠다.“
“…아.”
…

“혹시 뭐 쓰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
여주를 보곤 말하다가 본인도 양심이 찔렸는지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남준이였다.
그런 남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글씨에만 몰두하며 말하는 여주였다.
“아니.”
“아··· 응.”
여주의 거절에 머쓱한 듯 눈알만 도로록 굴린 채 볼에 바람을 넣었다 빼는 남준을 보며 여주가 한숨을 쉬곤 말했다.
“… 얼마 뒤 있을 우리 회사 파티 초대장. 외국 기업에도 보내야 해서 쓰고 있어.”
“아… 그래?”
의외네… 중얼거린 남준의 말에 여주는 만년필 끝을 손수건으로 감싸 흘러나온 잉크를 닦은 후 뚜껑을 닫으며 남준에게 말했다.
“그치, 의외지. 너가 존나게 무시하던 년이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니까.”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여도.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건 맞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여주의 말에 속이 상한 남준이 대답하자 여주가 비웃으며 말했다.
“허-, 그럼 내가 나 괴롭힌 새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하니?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좆같은데.”
“아니, 나는 그냥…”
“됐어, 아무 말도 하지마. 그것대로 기분 더러울 것 같으니까.”
남준의 말을 끊고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반을 나가버리는 여주의 남준은 가만히 앉아 여주가 떠난 자리만을 한참 응시하고 있었다.
35

“…시발, 비 오네.”
어느 새 하교시간이 되고 그 날 하루종일 자신을 피해다닌 지민에 혼자 하교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밥을 먹다 흘렸다는 핑계로 6살이였던 저를 비 오는 날 집 밖으로 쫓아내 방치한 아버지 덕에 트라우마가 있는 여주였다.
그래서 비오는 날이면 학교도 빠졌던 건데…
그걸 내가 알 턱이 있나.
여주의 몸이 빙의한 제희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등교했으나 비가 오자 미세하게 떨리는 손과 가빠오는 숨에 대충 눈치 챈 제희였다.
한 마디로 지금 상황은 좆됐다는 뜻이지.
어떡할까 고민하던 중 학교 뒷문에 세워두었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여주의 오빠, 민윤기가 보였다.
일단은 비를 맞아도 집에 가는 것이 우선이였기 때문에 떨리는 몸으로 할 수 없이 민윤기에게 달려갔다.
…

“뭐야, 시발.”
다짜고짜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헬멧을 쓰곤 뒷자석이 당당하게 타는 여주에 인상을 찌푸리며 욕을 뱉는 윤기였다.
“당장 내려. 니가 뭔데 여기 타?”
“오..늘 하,루만 태워줘.. 빨리.”
비를 맞을 수록 점점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날에 기억에 온몸에 열감이 느껴지며 쓰러질 것 같았다.
“지랄하지 말고 내려.”
어느 새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로 여주를 내려다 보며 말하는 윤기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는 여주였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였기 때문에 윤기는 눈치채지 못한 채 여주의 헬멧 쓴 머리를 오른손으로 내리쳤다.
쿵-!
생각보다 쉽게 넘어진 여주에 당황한 것도 잠시, 아스팔트에 부딪혀 깨져버린 헬멧과 바닥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채 숨만 헐떡헐떡 쉬고 있는 여주를 보곤 놀란 윤기였다.

“뭐야, 시발. 왜 그래.”
“ㄴ..나 좀 살,려줘..”
자꾸만 짧아지는 호흡과 무거워지는 공기에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가슴 부근의 옷을 꽉 쥔 채 점점 몸을 웅크리며 말하는 여주에 윤기는 당황했다.
뭐야..? 야..! 정신차려! 민여주!!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민윤기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버린 여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