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디서 봤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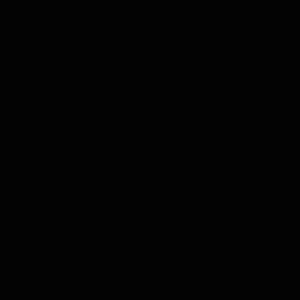
공백
2023.04.17조회수 40
난생처음 사회의 쓴맛을 맛본 갓스물 한여주.
대학은 사치라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겠다며 스무 살은
맞이한지 어언 네 달이 지났다.
아직도 부모님 등골 빨아먹을 거냐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중이다.
" 나도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고 싶다구.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알아... "
아직은 이른 점심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불평불만이 품긴 발길질을 해댔다.
벤치에 앉아 턱을 괴어 어딘가를 빤히 쳐다보다
일어나는 여주.
그럼 그렇지.
단골 카페에 들어가 카페라테를 시켜 진동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딸랑, 딸랑.
뭐야, 이 시간에 카페를 와?
왠지 전세 낸 듯한 단골 카페를 누군가 들어왔다.
그는 샷 추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는 연신 옷 주머니를 뒤졌다.
오호, 지갑을 안 들고 오셨구먼.
귀가 빨개지며 안절부절못하는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나뿐. 내 피 같은 용돈을 그에게 쓸 예정이다.
고마워하세요.
" 같이 계산해 주세요. 지금 제 것 나왔네요. "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쳐다봤다.
물론 나도 그렇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