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내가 처음 사건 맡은 날 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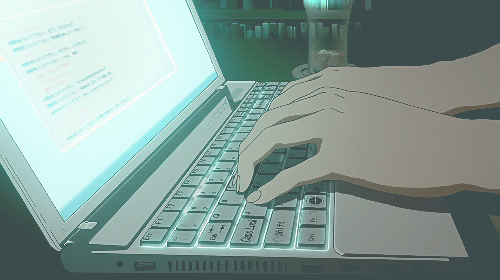
그 순간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가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내 손은 이미 재생버튼을 클릭하고 있었다.
치직-
"ㅅ..살려주세요......"

"........"
미간이 찌푸려졌다. Y가 새겨진 볼펜.
역시나 싸이코 다운 이유였다.
"제발...ㅇ..무...말..ㅇ..살려..ㅈ..."
"꺄아아악ㅡ"
"푹 -"

나를 며칠밤동안 잠 설치게 했던
그 날의 장면들이 내 눈앞을 가렸다.

"하아......"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맨 위 파일을 열었다.
'2010년 6월 13일'

"........."
10년전, 하나뿐인 동생을 잃은 날.
당장 노트북을 덮어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형사이자 그녀의 가족이었고, 맡은 바를 다 해야했다.
"ㄴ....누구..세요....."
"오..오빠가..... 오기로 했ㄴ...."
ㆍ
ㆍ
"꺄아아아아악!!!"

"정국..오빠.....미안..ㅁ..안ㅎ...."
너무 오랜만이었다.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생생한 그 목소리.
정말 한번만이라도 더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몸이 뜨거워졌다. 키보드를 집어 던졌지만 쉬이 가시지 않았다.
툭 -
투둑 -

"흐으..윽....끕.. 미안해.... 미안..흐.."
이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정말 더이상은 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그 새끼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