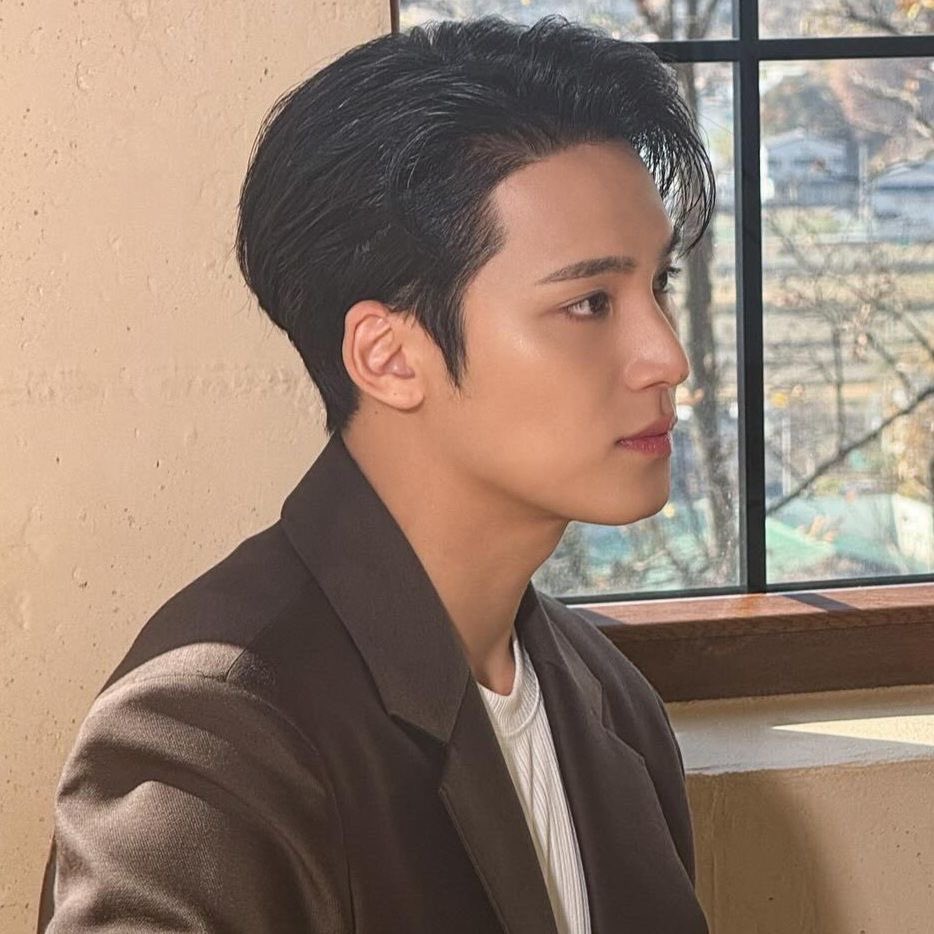같은 공간, 같은 거리.
소파에 앉은 채,
그날 팔이 닿았던 그 짧은 순간이 계속 생각났다.
이상하게 아무 일도 아닌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자꾸 무슨 사건처럼 커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민규는 어제랑 똑같이 내 옆을 지났고,
밥을 같이 먹었고,
말도 몇 마디 더 했고.
별거 아닌 일들인데, 자꾸 ‘우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거 좀 열어봐."
"왜. 손 아파?"
"아니, 그냥… 네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별 이유 없는 부탁에도
민규는 말은 투덜거리면서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열어줬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그 애에게 말을 걸고 싶어졌다.
이유 없이.
"이런 건 어때?"
그가 내 쪽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사진.
둘이 먹은 밥상.
라면, 김치찌개, 반쯤 엎어진 김.
"왜 찍었어?"
"그냥. 너랑 같이 밥 먹은 건 처음이니까."
“…처음 아닌데.”
“아, 맞다.
근데 그땐 내가 좀 삐딱했잖아.
이건 기념해야지.”
나는 피식 웃었다.
"우리, 좀 이상한 관계야."
"응.
한 집 사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거,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지?"
그는 가만히 생각하다 말했다.
“‘같이 살다가,
같이 살아버린 사람’이라고 할래.”
내 웃음소리가 터졌다.
“…말 진짜… 드럽게 잘한다.”
"그런가?"
민규는 웃지 않았다.
근데, 나만 웃은 것도 아니었다.
그 웃지 않은 얼굴 안에,
분명 뭔가 따뜻한 게 있었다.

밤.
불 꺼진 방.
책상 위엔 민규가 놔두고 간 캔커피가 있었다.
뚜껑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그걸 괜히 오래 쳐다봤다.
그 애가 준 거,
그 애가 말한 거,
그 애가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행동들—
다 지금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건 좋아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