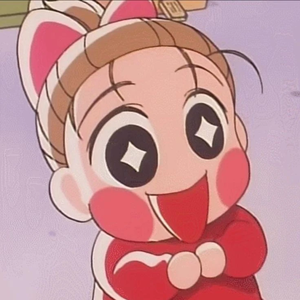W 르셸

7월. 눈이 아릿하게 내리쬐는 태양보다도 빛나는 아이가 지금 내 눈 앞에 있었다.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도로 위로 차들이 매섭게 달리고 인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자란 나무들. 바람에 맞춰 잔잔하게 흔들리는 이파리, 그 사이로 쨍한 햇빛이 우리를 훔쳐 보고 있었다.
따듯하고, 말랑하고, 미끈거리는 촉감에 온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소름끼치는가? 그건 아니었다. 그렇다기보단 조금 더 몽글 거리는 느낌에 가깝고 깊은 어딘가가 쿡쿡 쑤셨다. 심장이 쉴 새 없이 두근 거리느라 가슴이 괴로웠다.
내 손가락을 집요하게 훑었다 떨어질 때마다 얼핏 보이는 붉은 덩어리에 머리가 아득해져왔다.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가 녹았을 뿐인데. 찐득거림은 커녕 타액으로 축축했다.
"그, 그만‧‧‧."
"‧‧‧혹시 싫었어?"
"‧‧‧싫은 게 아니라, 간지러워서‧‧‧."
"미안.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길래."
부드러운 호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입꼬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저렇게 웃어버리면 나는 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걸 이 아이도 잘 아는 듯했다. 분명히.
"덥다. 그치? 다시 사올까."
무릎을 살짝 굽혀 눈 높이를 맞추고는 땀에 젖은 내 앞머리를 정리 해주었다. 나는 그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였다. 이런 순간이 좋다. 나만을 담아내는 맑은 눈동자나 조금 투박하지만 정성을 쏟아내는 손길 같은 게.
다시 사오기는 뭘 다시 사와. 본인도 땀을 이렇게나 흘리면서.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스크림은 이제 됐어. 집에 갈까?"
"응. 데려다줄게."
"‧‧‧. 잠깐 들릴래?"
나의 손을 잡고 걷던 정국이 문득 걸음을 멈춰섰다. 멍한 얼굴로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점점 이상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현아."
"‧‧‧‧‧‧."
"이 현."
"응."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세 가지가 뭐라고 했지?"
"...담배랑 마약."
"하나 덜 말한 거 같은데."
"그랬나."
"내가 원했던 하나만 빠졌는데. 어째 아주 의도적으로 보인다?"
마지막 하나는 전정국. 본인이었다. 남자도 위험해, 남자친구인 본인 마저 위험하다고 하면 날 더러 어쩌라고? 약간의 심술이 나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꽁한 채로 입을 꾹 다문 나를 보며 눈썹을 씰룩 거렸다. 이 남자. 벌써 사귄 지 5년이나 됐는데 손 잡기, 포옹, 뽀뽀 말고는 손도 안 대. 기가 막힌다. 슬슬 이건 보호 수준을 넘어서 다른 쪽의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졌다. 그것도 어엿한 스물 셋, 성인이 말이야.
"‧‧‧. 치. 아니, 아까는 길거리에서 막 내 손가락도 빨아놓고."

"쉿-. 까분다, 진짜."
"그래서. 안 가?"
"응. 안 가. 절대 안 돼. 꿈도 꾸지마라, 애송이."
"이씨, 너 오지마. 따라오기만 해! 혼자 갈 거야!"
"어쩌지. 그것도 안 되겠는데."
아아-. 진짜 짜증이 난다. 환하게 웃어주지나 말지. 나만 안달난 꼴이다.
/
작년 7월쯤이었던가.
그와 함께 걸었던 길에 다시금 발을 붙였다. 여전히 나는 그 곳에 살지만 헤어진 뒤로는 다른 길을 찾았었다. 그러니 아주 오랜만에 보는 길이다.
예상은 했지만 전부 낯설었다.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던 곳과 동일한 장소가 맞는지 의심이 갔다. 모든 것이 변했다. 뜨거웠던 여름이 아닌 겨울이 찾아왔고 길게 줄을 서 있던 나무들도 이제는 밑동만 남았다. 제일 큰 변화는 이제 혼자 걷는 길이 되었다는 점.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걸어갈 모든 길이 이제는 혼자였다.
헤어짐의 이유? 사실은 조금도 모르겠다. 5년하고도 3개월쯤 지난 연애가 막을 내렸다. 그래도 우린 꽤 괜찮은 모습의 연인이지 않았나. 순전히 나만의 착각인 건가. 물론 그로부터 수 개월이나 흘렀으니 더는 아무래도 상관 없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이따금 코 끝이 찡해지는 이유는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소식도 전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일 거다. 학창 시절을 걸쳐 스무살 초반까지 만난 사람이다. 그것이 완벽히 괜찮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울지말자. 원하지 않는 이별이긴 했지만 딱히 안 좋게 끝맺은 것도 아니고 나의 눈물은 정국도 원치 않을 것이니.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괜히 이 길로 와서 추억팔이가 웬말이야.
/
띡ㅡ
"58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벌어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어릴 적 철 없이 꾸었던 꿈들은 현실을 마주한 뒤, 다시 꾸기 힘들어졌다. 그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무용을 그만 두고 할 일을 찾아 헤매다 정착한 곳은 알바. 나는 지금 집 근처 편의점의 편순이가 되었다. 완전한 정착은 아니고, 다른 일을 찾을 때까지 수입이 없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지다.
딸랑ㅡ
"어서오세요."
일이 힘들지는 않았다. 다만 어쩌다 아는 사람을 손님으로 마주할 땐 꽤나 곤란한 게 문제지.
그리고 그게 오전 내내 나의 머릿속을 사로잡았던 전남친.

"저기요‧‧‧?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전정국.
게다가 기억을 잃은, 전정국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