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0으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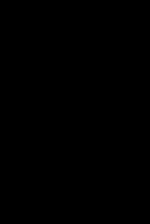
인생의 시작은 누가 정하는가, 인생의 끝은 누가 정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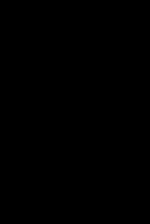
저의 의지 없이 태어나 각기 다른 이유로 끝을 맞이하는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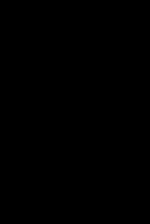
시작은 저 꼭대기였지만 끝은 저 바닥이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코를 찔러오는 눅눅한 냄새,

방음이 되지 않아 옆집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싸움 소리,

누런 천장 벽지 구석구석에 피어있는 곰팡이,

끼익 소리가 나는 창문과 문.

날 때부터 지독하게도 익숙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자리잡은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나의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어느 노부인,

나의 할머니.

부스스하게 일어난 머리를 빗어내듯이 쓰담아오는 그 부드러운 손길이,

안부를 묻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부모의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나를 버린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다고 찾아.

나한테 득 될 거라고는 하나 없는 그들이 원망스러운 것도 한 때였다.

이젠 원망이라는 감정이 지나서 낳은 허탈뿐이 맴돌았다.

할머니
“여주야, 혹여 이 할미가 없어도 네가 잘 살 수 있지?”

남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의아하겠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별 의미는 없고 언제 떠날 지 모르는 할머니의 되새김이라고나 할 수 있다.

낡은 문을 열고 나가니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들과 폐가들이 듬성듬성 있었다.

남들은 살기 어렵다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불평하기도 늦었다.

붉은 낙엽들이 지붕에 앉은 것은 조화롭지도 않은 풍경이었지만 나름 괜찮았다.

얇게 입고 간 탓에 빨갛게 변한 두 손을 입으로 호호 부니 하얀 입김이 공중에 떠다녔다.

진여주
“… 서울은 어떨까. 촌마을이랑은 아무래도 다르겠지.”

아무리 이 촌마을이 익숙하다고 해도 서울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건 아니었다.

매일이 서울에 가고싶다는 바램으로 가득 찼다.

서울_오후 6시 30분

퇴근길에 차들은 검은 도로를 빼곡히 메웠다.

인도에는 틈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다.

고층의 건물들은 마치 하늘에 곧 닿을 것처럼 높았다.

그 많은 건물들 중 가장 높은 듯한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아랠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으니,


민윤기
“…”

고독하다고 할 수 있을 만치 넓고 텅 빈 방에는 한 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은 노크 소리가 울렸다.

직원
“대표님, 말씀하신 서류 드리겠습니다.”


민윤기
“놓고 바로 퇴근해.”

직원
“안녕히계십시오.”

고층 건물에는 더이상 빛이 없었다.

마치 반딧불이의 불처럼 아주 작은,

미세한 불만이 남았다.

어쩌면 그 불도 매우 밝은 건 아니었다.


민윤기
“… 어쩌면 이 빌어먹을 개미지옥보다 차라리 촌이 낫지 않을까.”

인간은 한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 ‘인간’이라는 종류에는 돈, 권력, 위치 따위는 하나의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

어쩌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든 욕심은 끝이 없었다.

남자가 들고있던 와인잔은 그대로 조각조각 깨져 바닥에 나뒹굴렀다.

인생이란 한 번 놓아버린다면 결국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