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공식
W. 망개찐떡
나는 또 일상을 살아갔다.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씻고. 어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날이였다. 네가 내 시선에 있는 것만 빼면. 너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일하고, 밥 먹고, 선배들과 얘기하고. 그런데 미묘하게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마… 너와 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기류 때문일까.
“여주씨, 어디 몸 안 좋아요?.”
여주씨?, 다시 한 번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나 또 정신을 놓고 있었나봐… 멍 때리느라 놓고있었던 마우스를 다시 손에 쥐어들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애써 옅게 웃으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면, 건너편에 앉아있던 너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닌데… 여주씨 안색 되게 안 좋아요.”
“… …”
“어디 아픈거 같은데?.”
이마에 올라오는 차가운 손길에 눈을 끔뻑였다. ‘어머, 열 나는것 같은데?.’ 옆자리 도현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아… 그러고보니 아침부터 몸이 조금 으슬으슬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요 며칠간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런지, 내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안되겠다. 여주씨 반차 써요.”
“아, 아뇨. 아직 일도 다 안 끝나나서…”
모니터에는 여러개의 창이 띄어져있었고, 작성해야할 기획서와 서류도 많았다. 며칠간 정신을 놓은 탓이였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 차리고 꼭 다 하고 갈 생각이였는데. 또, 반차를 써버리면…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이 일이 늘어날 터였다.
“기획안은 천천히 올려도 되잖아요. 그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아 그렇긴 한데…”
일을 당최 미루지 않는 성격이여서 그런지, 한 번 밀리니 속에서 조급함이 몰려와서 였다. 도현의 말대로 기간은 한참 남아서 괜찮긴 했으나, 이미 한 번 일이 밀려버려서 인지 쉽사리 손을 놓고 쉬러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쉬어야지.”
눈을 동그랗게 뜨였다. 그날 뒤로 며칠동안 교류가 없던 정국이 입을 열어서였다. 당황스러운 눈동자로 도현을 한 번, 정국을 한 번 번갈아 돌아보니 도현이 맞는 말이라며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감기 독하던데-.’ …넌 괜찮은걸까. 홀로 두고 간건 나 였으면서, 이와중에 네가 상처받은 것을 걱정했다.
“가서 쉬세요. 기획서랑 서류는 제가 정리할테니.”
“…아, 아니에ㅇ,”
“선배님이 사수긴 해도, 저도 경력자라 잘해요.”
내가 말하고자 했던건 그게 아닌데… 적어도 너에겐 일을 떠넘기고는 싶지 않았다. 지금도 충분히 내가 나쁜 년이라는 걸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일 까지 떠넘기게 되면… 이젠 진짜로 부정할 수가 없게되잖아. 됐다며, 다시 한 번 거절하려던 찰나. 거대한 몸집이 다가와 서류 뭉텅이를 들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저, 전정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체 왜 이러는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뒤늦게 이름을 부른 것을 망각하고 주변의 눈치를 봤다. 잠시 시선이 몰리는 듯 했으나, 다른 사람들도 바쁜지 금세 흩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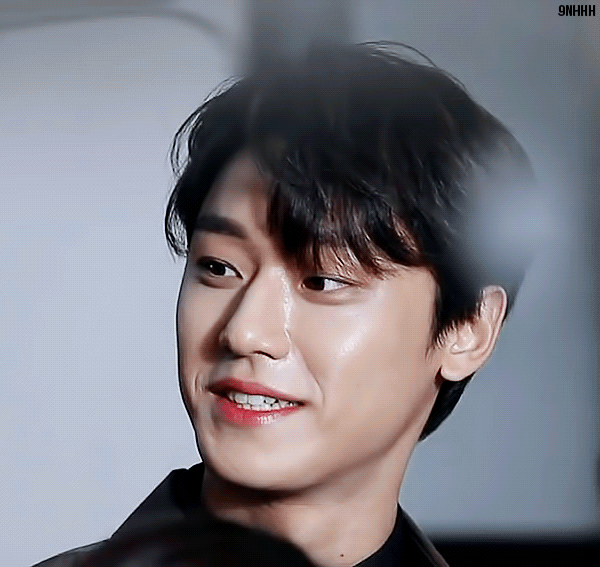
“그럼 제가 정국씨 도울게요. 그럼 괜찮죠?.”
하지만… 도현은 내 핸드백에 핸드폰과 지갑을 넣어주며 손수 짐까지 싸주기 시작했다. 이젠 정말로 괜찮다고 사양할 수 없었다. 도현의 손길에 어깨에 핸드백 끈을 거의 강제로 걸다싶이 하고 등 뒤로 떠밀린 손에 의하여 출구로 향했다.
“걱정하지말고, 오늘은 푹 쉬어요. 일은 우리가 다할테니까.”
“…그래도,”
“팀장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출구로 향하던 내내 나는 뒤를 돌아 네가 앉아있는 책상을 향해 눈동자를 움직였다. 내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오직 서류를 향하고 있던 너였으나 난 알 수 있었다. 주변의 눈을 신경쓰고 있는 나를 배려하는 것임을.
.
.
.
.
[약 먹고 푹 쉬어. 미련하게 앓지말고]
-전정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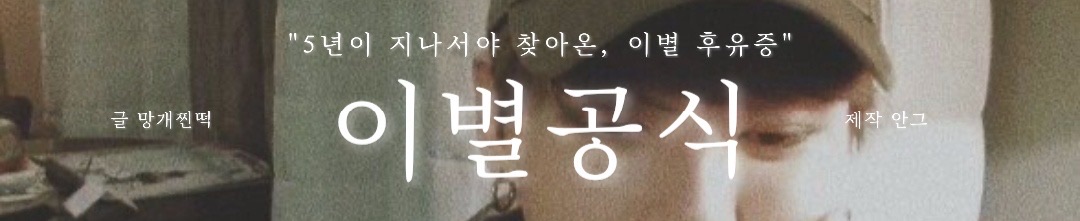
여주가 남기고 간 일과, 오늘의 분량인 일을 모두 끝내고 나니 긴 바늘이 어느덧 오후 8시를 가르키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도 벌써 퇴근하고 집에 간 시간. 나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의자에 등을 기댈 수 있었다.
“… …”
집에서 잘 쉬고 있겠지. 핸드폰을 손에 무의식 적으로 쥐어들었다. 아까 톡을 남겨두긴 했는데… 봤으려나. 톡 어플에 들어가 확인을 하니 1이 사라져 있었다. 읽씹인가… 답장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였지만, 막상 답장이 없으니 섭섭하긴 했다.
회사의 불을 끄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도현과 일을 함께 했으면 2시간은 일찍 끝났을테지만, 나는 도와준다는 그의 말을 거절하며 모든 일을 홀로 끝냈다. 말은 고맙긴 했지만… 순전히 내 욕심이였다. 그 아이, 그러니까 차여주의 일을 오로지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삼성동 YK 오피스텔이요.”
약국에서 몸살 감기에 좋다는 약을 모두 사들여 택시를 타 집으로 향했다. 차여주가 걱정되었다. 아픈 것도 아픈거지만, 분명 그 녀석이라면 병원도 안 가고 끙끙되고 있을 터였다. 이유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랬다.
“잘 쉬고있다면 다행인데…”
힐끔- 택시 창 밖으로 지나가는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연인들, 가족과 함께 외식하러 나온 부부. 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잘나진 않았어도, 우리가 그냥 ‘평범’ 했더라면 이렇게까진 되진 않았을텐데…
같이 술을 먹고, 돈 걱정 없는 저녁 식사, 소소한 선물.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였다. 해주고픈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닿는 것 조차도 어렵고… 닿고 나서도 서로의 눈치를 보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예전에는 너한테로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무거운 돌을 실었다.
띵, —
“… …”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쯤. 시야에는 반갑고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서 있었다.
“정국아.”
“… …”
차여주. 넌 내게 그런 존재였다.
“미안해. 지금까지 못 알아줘서.”
알 수 없었다. 붉어진 눈가가 아파서 그런건지, 아니면… 울어서 그런건지. 천천히 좁혀오는 발걸음에 나는 물러날 수 없었다. 그리고, 다가갈 수도 없었다. 이게 꿈인가… 싶으면서도 꿈이 아니길 빌었다. 그리고 늘 내가 내밀던 손길에, 이번엔 네가 먼저 내 뺨에 따뜻한 손길이 다가왔다.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찐떡의 사담]
여주가 갑자기 왜 그럴까요?. ~.~
그건 다음 편에 : )
댓 20개 업.
